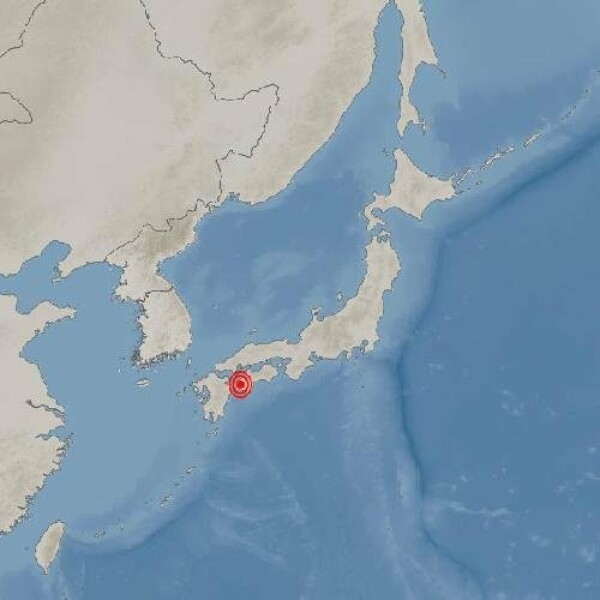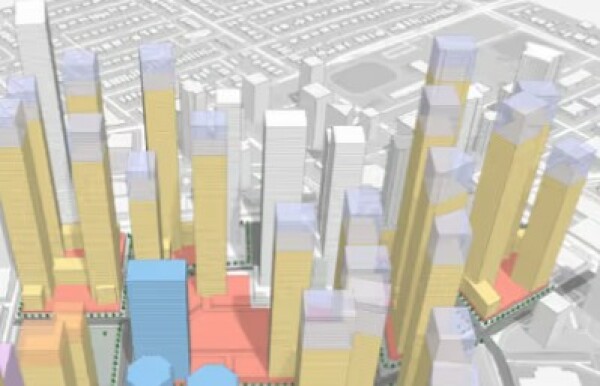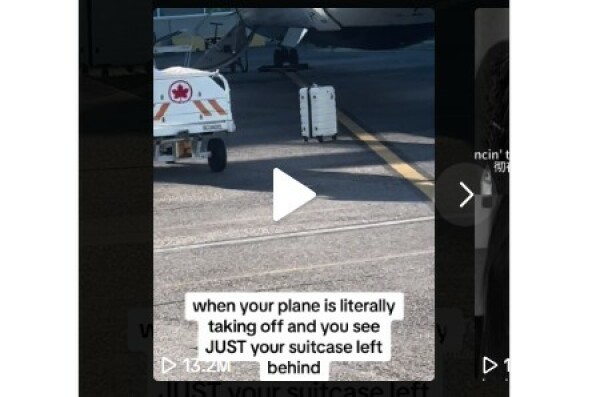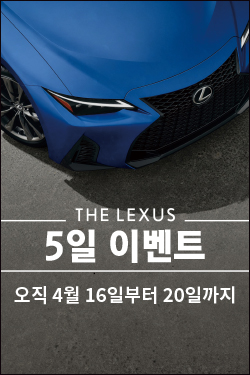건강 | '한국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다' … 50년 만에 이룬 의료 선진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온라인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29 08:55 조회3,15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선진국의 의료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시절이 있었다.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선망으로 돈이 있다면 해외에 나가 진료받는 것이 당연시되기도 했다. 실제 의료수준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뒤처져 있었다. 태국의 의료관광산업 성공사례도 먼 나라 얘기였다. 하지만 국내 의료는 해방 후 5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첨단 치료법이 개발됐고, 중증질환 치료율은 높아졌다. 한국을 찾기 시작한 외국인은 연 30만 명을 바라본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의술을 배우러 한국을 찾는 외국 의료진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는다. 한국 의료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세계 무대에 우뚝 선 한국 의료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지표로 살펴보자. 20년 전 우리나라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정확하게 41.4%였다. 5년 생존율은 의료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의학적으로 암 환자가 5년간 재발 없이 생존하면 완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64.1%였다. 우리보다 20% 이상 높았다.
폐암·간암 치료 성적 미국 앞서
현재 이 격차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대반전이 이뤄졌다. 중앙암등록본부의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암 5년 생존율은 68.1%. 미국(66.1%), 일본(58.6%)보다 높다. 암 종류별로 살펴보면 우리 의료진의 실력은 더 두드러진다. 위암과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각각 71.5%, 74.8%에 이른다. 위암의 경우 미국(28.3%)과 캐나다(25%)의 2.5배가 넘고, 대장암(미국 64.7%, 캐나다 64%)도 우리의 생존율이 앞섰다.
완치가 어려운 암으로 알려진 폐암과 간암의 치료성적도 미국을 웃돈다. 미국은 폐암과 간암 생존율이 각각 16.8%, 16.6%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보다 높은 21.9%, 30.1%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 미국보다 생존율이 낮은 것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암인 전립선암뿐이다.
국가별로 통계를 산출한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암 치료수준이 결코 미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적어도 위암·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 등 주요 암 생존율은 우리나라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치료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미국 하버드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위암에 걸린 자신의 어머니를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도록 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여러 과의 협진으로 진행하는 장기이식은 의료수준을 보여주는 종합판이다. 우리나라 간이식 성공률은 96%. 미국 등 선진국의 평균 성공률(85%)을 앞선다.
평균수명 OECD 평균치 웃돌아
무엇보다 국내 의료의 질 향상은 국민건강의 각종 지표로 나타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00년만 해도 여성 79.6세, 남성 72.3세로 모두 OECD 평균(80.2세, 74.0세)보다 낮았다. 하지만 2015년에는 여성 85.1세, 남성 78.5세로 높아져 OECD 평균을 웃돈다. 한국인의 건강수명도 2002년 68세에서 70.7세로 증가했다.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이뿐 아니라 영아사망률, 조기사망 등도 OECD 평균보다 낮아져 건강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임상시험 수준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임상시험 수준은 국가의 의료 인프라를 가늠하는 잣대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임상전문가들은 국내 병원과 의료진, 그리고 임상시험 조건과 환경을 부러워할 정도다.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우리나라를 임상시험 시장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꼽으면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년 전 세계 국가 임상시험 순위 10위권에 올라섰다. 정부와 의료기관이 꾸준히 한국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해 온 덕분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임상시험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임상시험산업본부는 5년 안에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의료 질이 높아졌지만 사실 국내 의료기관은 국내 환자를 진료하는 데 급급했다. 2009년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면서 전환기를 맞기 전까지는 그랬다.
정부가 외국인 환자의 유치·알선 행위를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가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당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연 6만여 명에 불과했다. 이후 해외환자는 매년 평균 34.7%씩 늘어 지난해엔 26만6501명에 달했다.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세계에서 보기 힘든 성장세다. 한국 의료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암 환자 5년 생존율 68.1%
20년 만에 미·일 제쳐
임상시험 5년 뒤엔 세계 5위권
외국인 환자 방문 연 30만
외국인 환자 연 평균 34.7% 증가
환자 수가 늘면서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은 10배 이상(5569억원) 늘었다. 외국인 환자 일인당 208만원꼴이다. 정부는 2020년 외국인 환자 1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성형·미용에만 집중된 것도 아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집계에 따르면, 내과 진료가 22.3%로 가장 많다. 환자 수 2, 3위인 성형외과(10.2%), 검진센터(10.1%)의 2배가 넘는다. 그 다음으로 피부과(8.4%), 정형외과(5.4%), 산부인과(5.4%), 안과(4.1%), 외과(3.5%), 이비인후과(3.3%), 치과(3.3%), 한방(3.3%), 신경외과(2.9%), 비뇨기과(2.7%)가 고루 분포돼 있다. 성형·미용에 국한하지 않고 수준 높은 진료를 위해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는다. 성형 한류가 아닌 의료 한류인 셈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도 활발하다. 의료 수출은 걸림돌이 많아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와 다른 법·제도와 외국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 문화의 차이 탓이다. 그럼에도 국내 의료기관의 진출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 스탠퍼드대병원, 독일 훔볼트대 샤리테병원 등 세계 최고 병원과의 경쟁에서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UAE) 왕립병원 운영권을 따낸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해외 진출 의료기관 지난해 125곳
의료기관 해외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2010년에는 성과가 미미했다. 해외 진출 의료기관이 58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이듬해 79곳으로 늘었고, 2012년 91곳, 2013년 111곳, 2014년 125곳으로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 42곳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곳은 미국이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은 35곳에 달한다. 아시아나 의료 후진국에만 집중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의원급 위주였던 해외 진출이 전문병원, 중대형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고, 난임·안과·이비인후과·혈액내과 등 신규 진출과목이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해외로 나가는 의료기관이 200곳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눈부신 성장을 했다. 향후에도 해당지역의 각종 규제, 인허가 등 전문 정보 인프라와 연관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더해지면 한국 의료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