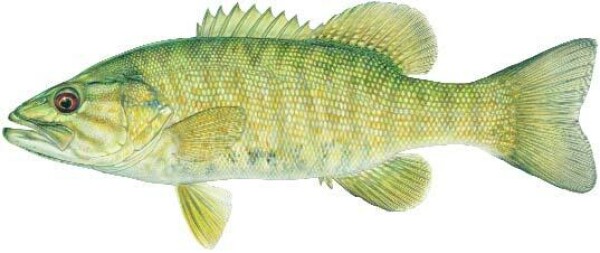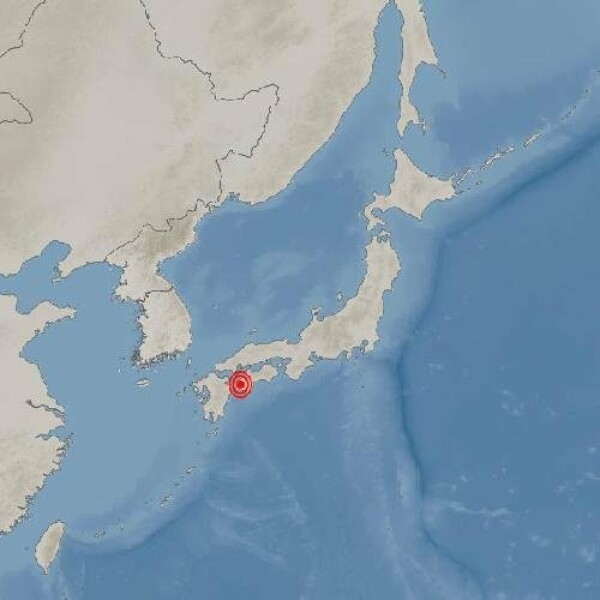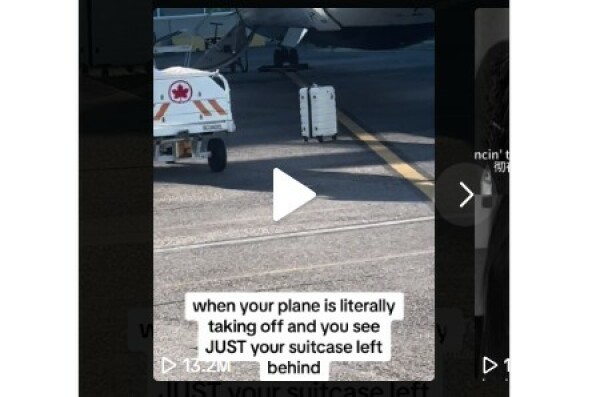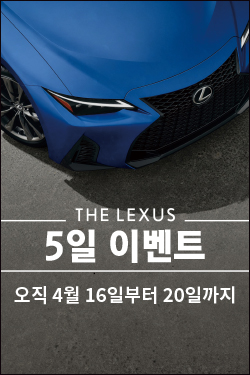밴쿠버 |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명품족도 잘 모르는 명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레이스 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13 15:34 조회2,43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나는 명품족이 아니다. 고로 명품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이 별로 없다. 젊을 는 아무 것이나 입어도 젊음 그 자체로 빛이 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하고 다니면 젊어 보인다기 보다는 주책스럽게 보인다고나 할까? 그래서 중년이 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고급스럽게 가꾸려고 명품을 찾는 지도 모른다. 내가 십여년 전 어머니날에 아들 둘이 돈을 모아서 루이비통 핸드백을 선물로 주었다. 큰 애는 돈을 벌고 작은 애는 직업을 찾을 여서 형한테 돈을 빌려서 선물을 샀는데 아직도 그 돈을 갚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된 선물인 그 가방을 정확히 오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것만 들고 다녔다. 정말 캐쥬얼이나 정장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로 들고 다녔다. 그러면서 유행을 타지 않고 아무데나 어울리기 때문에 명품을 찾는구나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손잡이에 때가 타고 내가 나이가 들면서 그 백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는 가벼운 소재의 천으로 만든 가방을 들기 시작하면서 그 백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명품백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파리에 갔을때 그 모노그램 무늬 말고 다른 무늬나 디자인이 있나하고 샹젤리제거리의 루이비통 매장을 가 보니 중국사람들만 바글바글하고 갑자기 유로로 바뀐 가격표때문에 감을 못잡고 있는데 웬 중국아줌마가 오더니 나 보고 백을 한개만 사달라며 밖에서 돈을 주겠다고.
그러지 않아도 긴 줄에 섰다가 가까스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구경하는데 말이다.
물론 거절은 했지만 그들의 막무가내식 쇼핑에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내가 그 당시에 사고 싶었던 가방은 지금이야 한국에서 흔한 이태리 제품인 '보테가 베네타', 한 조각의 가죽끈을 끊지 않고 이어서 한 개의 백을 만들어 내는 장인의 백이라고 광고하는 그 수수하고 단순한 디자인의 가벼운 백을 사고 싶었다. 내가 그 브랜드가 명품인지도 모르던 십년 전에는 이태리에 가면 700유로면 살 수 있었는데......
그 후에는 미국에서 애플 매장 보다 더 수익이 좋다는 '베라 브래들리'백 같은 저렴한 패브릭제품이 시장가방으로도 쓰고 가벼워서 좋아하게 되었다.
그릇으로 말하자면 북미 사람들이 마치 두고온 산하를 그리워하듯이 영국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인지 식기류를 영국산 로얄 알버트 혹은 로얄 덜튼 제품을 선호하고 얼마전 까지도 '빌레로이 앤 보흐'라는 독일 그릇 브랜드가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품이 그릇계의 샤넬이라면 과장됐을까? 요즘 한국에서야 이름도 모르는 비싼 명품들이 많고 캐나다 시골에 사는 내가 아는 브랜드이면 벌써 한물간 제품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있다.
북미에서 살면서 여름에는 반바지, 겨울에는 후드티만 보면서 사는 나에게 명품, 즉 디자이너 브랜드는 사치품이라는가 필수품이라든가하는 개념조차도 없다.
그렇게 무개념이고 눈이 낮은 내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 오스트리아 '린쯔'라는 도시에서 '프라하'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터미날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으려고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일단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세면대와 수도꼭지가 뭔지 모르게 윤이 나고 반짝거리는 것이 보통 세면대와는 틀리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세면대치고는 깨끗하다 못해 우리집 세면대 보다도 훨씬 더 청결한 느낌이 들어서 돋보기로 보듯이 샅샅이 살펴보니 제품이름이 눈에 들어오는데 '빌레로이 앤 보흐'라는 깨알같은 글씨가 보였다. 세상에! 나는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그 유명하다는 식기가 버스 터미날의 공중화장실의 세면대로 변신되어 있다니.
그날, 나는 비로소 명품에 눈을 떴다. 역시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감탄하면서도 왜 사람들은 고가이면 고가품이라고 하지 하필 명품이란 말로써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명품으로 착각하게 할까 하는 비비 꼬인 마음이 들었다. 돈 많은 사람은 거기에 걸맞게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 알뜰하게 살면되고 돈이 없지 센스까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걸로 나의 명품에 대한 감상은 일회성으로 끝이 나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어떤 때는 비사회적인 존재가 될 소지가 있지만 북미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상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살아가는 것이 부럽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참을 것도 없고 억눌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심장병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까? 억지로 찾아낸다면 무조건 나이스한 태도, 아이들이 빵점을 맞아도 자랑스럽다, 아이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속이 부글부글하면서도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데도 화를 참으면서 겉으로는 웃다보니 심장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 본다.
나는 캐나다에 살면서 명품백을 들어도 관심이 없고 안 들어도 관심이 없는 세상에 사니까 아무런 신경을 쓸게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물건을 사면 자랑도 하고 싶고, 아니 자랑을 해야되고 새 옷을 사면 입고 나가고 싶은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갈 데도 없으니 오로지 청바지나 레깅스에 후드티를 주구장창 입으며 패션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생각해 본지 오래이다.
참, 오스트리아에 가면 지하철 화장실에서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곳도 있어서 음악의 나라에 온 인증이 확실한데 명품세면대도 적응이 안되고 클래식 음악이 흘러 나오는 화장실은 더욱 더 적응이 안되는 낯선 곳에서 잠시 쓸데없는 명품 생각을 해 보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