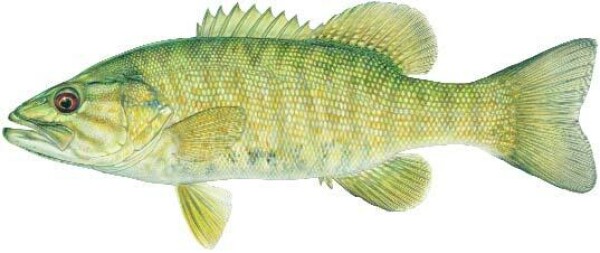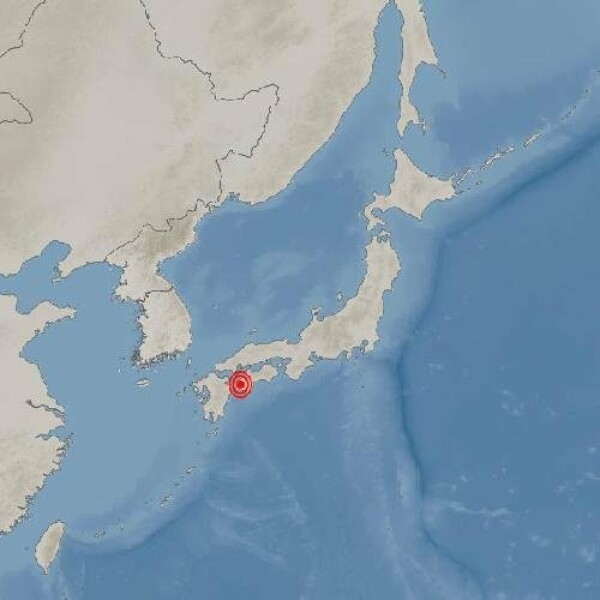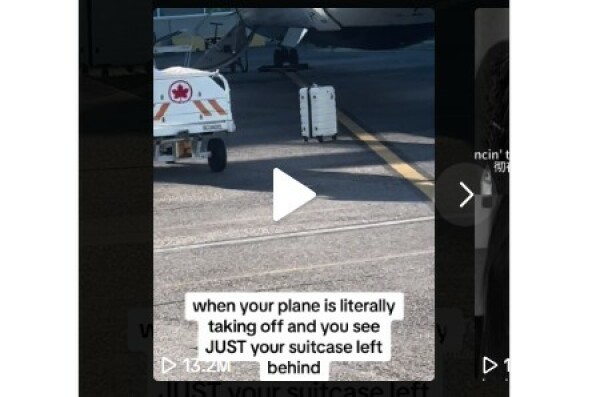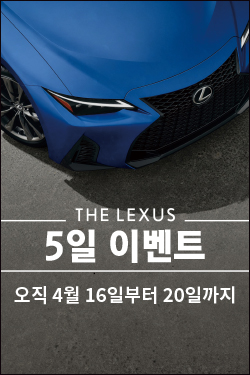문학 | [문학가 산책] 풍경, 그저 막막함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병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02 15:42 조회1,86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유병수/시인, 소설가
유병수/시인, 소설가
사라져간 모든 풍경들은 눈물겹다. 늘 바라보던 풍경이 어느날 갑자기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사라져 버림은 허무하기에 앞서 막막할 따름이다. 비단 그것이 풍경뿐만은 아니겠지만.
내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던 시절, 잠시 친구의 집에서 보낸 적이 있었다. 친구의 집은 꽤 높은 언덕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창문을 열면 꾸불꾸불한 언덕길 저편으로 앞산이 보이고 집 주변으로 마을 사람들이 가꾸어 놓은 작고 큰 텃밭들이 모여 있었다.
정거장으로 가서 그 집으로 가는 길은 대략 십오분 거리인데 아침 저녁으로 그 언덕길 풍경을 바라보며 내려가고 올라 오는 일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웠다. 언덕을 내려가서 하는 일이라야 사람들 만나고 전화 받고 쓴커피 마시고 많은 일거리에 치인 악다구니와 매케한 도시의 냄새와 소음 속에 휩싸여 고작 지치는 일 뿐이어서 하루에 이삼십분 정도 오르내리며 보는 작은 풀꽃들과 동네의 풍경들을 만끽하곤 했다.
봄이면 앞산에 여기 저기 수소폭탄처럼 터져 피어오르던 진달래꽃들, 여름에 손바닥 만한 그늘을 만들어 주던 피마자 잎사귀, 지붕 위에 그렁그렁 매달려 있는 호박들, 아무도 따는 사람이 없어서 사심없이 편한 감나무, 그리고 언덕빼기 정상에 위치해 있는 국민학교 담장길 양 옆으로 펼쳐져 있는 코스모스 길.
도심에서 약간 비켜 서 있는 얼마 멀지 않은 이 마을을 나는 사랑했고, 휴일이면 그 풍경들이 펼쳐진 길을 걸었다. 그 중에서 언덕길 담장 밑에 피어 있던 해바라기가 제일 눈에 띄곤했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던 해바라기가 어느 날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었다.
언덕배기를 다 올라와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오솔길 담장 밑, 그 집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가 키우는 큰딸처럼 그 해바라기는 할머니는 물론이겠지만 내게 큰 위안이 되어주곤 했다. 그 집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어 놓고 바라보면 해바라기와 그 주변에 손금처럼 이어지고 펼쳐진 텃밭들, 텃밭의 잎사귀들, 이곳이 묘지라면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저 세상을 잊어버려도 그리 심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다.
저 밖의 사람들 보다 이 언덕의 풍경들에 더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그 해 여름 나는 그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잃고 자연의 작고 깊은 소리를 얻었던 것 같다.
어느 날 정들었던 풍경들 후두둑 다 지고 스산한 바람 불던 저녁 언덕길, 불현듯 밀려 오는 언덕 저편 막막한 불빛처럼 생은 견디는 것. 해바라기 두툼한 씨앗처럼 기다리며 마음 속에 익히는 것. 그런 교훈 같은 깨달음이 다가와 풍경들이 모두 진 빈 텃밭을 오래 바라보곤 했었다. 또다시 다가오는 이국에서의 봄, 그 오랜 기억 속의 해바라기와 꽃잎사귀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저 막막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