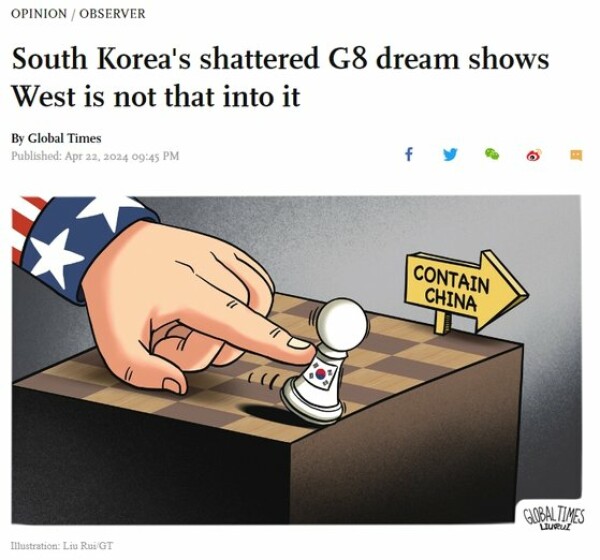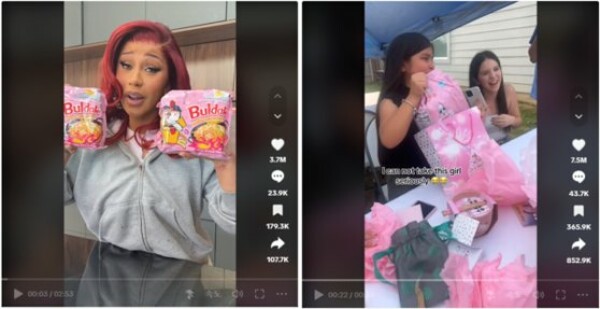문학 | [문예정원] 가슴 속으로 피는 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원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07 09:42 조회1,29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최 원 현 /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최 원 현 /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꽃 별
어둔 밤이 아녔다. 해는 없지만 분명 낮이었다. 하늘도 세상도 온통 회색인 낮에 대롱대롱 어른 주먹보다 큰 꽃 별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서 빛나고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고만고만한 거리를 두고 빛나는 꽃송이들, 어린 나는 이모의 등에서 몸을 빼며 손을 내밀어 그 빛나는 별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내가 팔을 뻗은 만큼 멀어져 가는 꽃송이, 빨갛고 노랗고 하얀 꽃송이가 바로 눈앞에서 별(星)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런데 어린 내 소견에도 그건 엄마가 내게 보낸 선물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욱 그것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꽃 별, 왜 엄만 내게 그런 안타까움의 선물을 보냈을까. 온 밤을 그렇게 꽃 별의 꿈속에서 헤맬 때가 여러 번이었다.
내게 엄마는 그렇게 늘 잡히지 않는 실체로만 나와 함께 했다. 헌데 하필 왜 꽃별이었을까. 그러고 보니 그 하나하나가 반짝일 때마다 각기 다른 엄마의 얼굴이 보이곤 했던 것 같기도 하다. 한 번도 확실한 모습으로는 기억되지 않는 엄마의 얼굴은 여전히 분명치 않게 엄마라는 믿음으로만 내 기억 속에 반짝이는 꽃 별이곤 했다.
검은 치마 하얀 저고리
어머니는 어떤 색을 좋아하셨을까. 내게 어머니의 기억은 딱 한 가지다.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 그게 흑백사진으로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 전부이기도 하다. 온 가족이 사진을 찍던 그 날 어머니의 치마가 무슨 색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유일하게 남은 사진에서 보여주는 어머니의 모습은 흰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다. 사진으로는 그렇게 보이나 청색이나 가지색이 아녔을까 싶기도 하다. 사진 속에서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색깔들은 어떤 것들일까. 어머니는 어떤 색을 좋아하셨을까. 그러나 내게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흰색과 검은 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그래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변하지도 않는 것일까.
하얀 고무신을 어머니에게 신겨드리면 하양 검정 하양의 대비가 되어 내 흐린 눈을 더욱 흐리게 할 것 같았다.
이맘쯤 이면 잊어지고 사그라지고 희미 해져 놓여 날 만도 하련만 채워질 수 없던 가슴 아니 그 가슴에 파묻혀 안겨보고 싶던 갈망이 지워질 수 없는 상흔으로 남아 시도 때도 없이 콕콕 아직도 가슴을 찌른다.
검은 것도 사랑이고 하얀 것도 사랑이고, 검은 것도 그립고 하얀 것도 그립고, 가져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뜨거운 물에도 녹지 않고 차가운 얼음 속에서도 얼지 않고 늘 그 모습으로만 남아 흰 저고리 검정 치마 사진 한 장의 그리움으로 세월의 그림자만 더욱 길게 늘이고 있다.
가슴 속으로 피는 꽃
억수로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어머니의 이장을 하던 날, 그 날 달려온 칠백여 리의 길은 내가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달린 가장 오래고 긴 길이었다. 차창에 흐르는 빗물은 오랫동안 참았던 어머니의 눈물 같았고 그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그 긴 그리움의 날을 지켜 왔다는 표현을 달리 해 볼 수도 없으리라. 그 런 때 어머니의 마음도 내 마음 같았을까. 그런데 쏟아지는 빗속에서 내 손에 들린 어머니의 무게는 어쩜 그리도 가벼웠을까. 한 줌 흙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잘 맞는 말이었다. 당신을 묘실에 내리고 일어서자 비가 더욱 세차게 내렸다. 당신과 나와의 인연 고리, 문득 어린 날 꿈속에서 애태우던 꽃별들이 지금 이 순간 비가 되어 흘러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꽃 별의 그리움이 비로 내리는 게 아니라 꽃 별이 머금고 있던 눈물이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성, 그래도 채워지잖는 가슴의 공허를 메꿔 볼 양으로 쏟아내 주는 것 같았다.
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듯 더 세게 줄기차게 쏟아졌다. 도저히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묘실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큰 비닐로 비를 막으며 일을 진행했다.
봉분을 세우고 떼(잔디)옷을 입혔다. 비석도 세웠다. 온 몸이 다 젖은 체 나는 그 빗속에서 숨길 필요도 없이 마음껏 울었다. 그건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눈물은 아니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안타까움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다. 사실 죽은 자에게 이런 묘가 무슨 도움이 되라먄 아무 소용도 없을 일임에도 어머니를 위해 한 가지라도 했다는 자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도 해 줄 수도 없다는 안타까움을 아주 조금이라도 내려놓고자 하는 참으로 얄팍한 내 위안의 작업이었다. 그렇게 이장(移葬)을 한 덕에 별로 어렵지 않게 어머니를 찾아뵐 수 있게 될 터였다.
이윽고 겨울도 가고 봄이 되었다. 봄 풀의 푸르름이 짙어 진 어느 날 산소를 찾으니 살아난 떼 옷 위로 할미꽃 두 송이가 묘비를 바라보며 피어 있었다. 아침 이른 시간이어서일까. 이슬을 머금고 살짝 고개를 숙인 체 함초롬히 피어 있는 꽃은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러고보니 피어 있는 꽃의 위치가 어머니의 가슴께다. 세상을 향하여 어머니의 가슴속에서 피어난 꽃이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주무셨 나보다. 문득 이장 전 칡넝쿨이 묘를 덮고 있던 게 생각나 죄송한 마음이 된다. 이제라도 자주 찾아 잘 보살펴 드리리라. 할미꽃을 손으로 만져본다. 보들보들한 감촉이 어머니의 젖 살을 만지는 느낌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을 내놓고 자식을 맞이하고 있는 듯 가늘게 떠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꽃은 여전히 내 가슴 속으로 피는 꽃일 터였다. 그리움은 옅어 지지도 바래지도 않는 가슴속으로 피는 한 송이 꽃이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