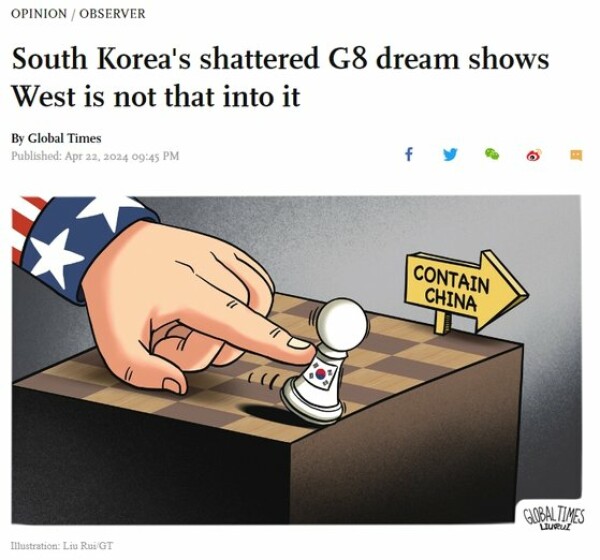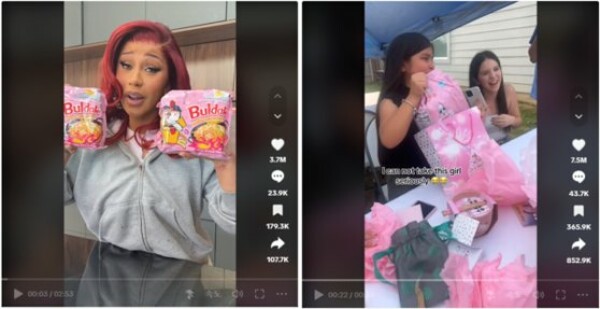문학 | [문예정원] 외딴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반숙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0-02 11:43 조회1,60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반숙자 /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반숙자 /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우체부
중부지방을 강타한 장마비로 하천 둑까지 황 톳 빛 물이 넘실거리던 때다.
산자락에 붙어 있는 우리 오두막으로 오는 길이 세 차례나 끊어졌다. 길은 두
갈래다. 마을 안까지 들어가 동산을 넘는 산길이 있고, 마을 초입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진 농로를 따라오다 곶 집을 지나 오르는 과수원길이 있다.
연일 내리던 비는 골짜기에서 쏟아져 내려 산길, 과수원길을 다 끊어
놓았는데 그때 한창 고추를 따던 농가들의 타격이 컸다. 경운기가 다닐 수 없어
고추짐을 일일이 지게로 져 날랐다. 날마다 포크 레인이 와서 복구작업을 해놓고
갔지만, 이틀이 멀다 하고 비에 끊어졌다. 실개천이던 도랑이 2미터 너비로
파였으니 물길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그 날도 비가 내렸다. 길이 차단되고 억수로 쏟아지는 비 속에 외딴집인 우리
집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인근의 밭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었다. 막 점심
수저를 놓던 순간, 누가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을러
대서 문을 꼭 닫고 있던 터 여서 으스스한 기분으로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나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관 앞에는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우체부가 서 있는데 그의 몰골이 진흙으로 개벽을 하고 있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헬멧 속에서 주름 가득 웃으면서 품 안에 품고 온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그는 따끈한 차 한 잔도 마다하고 길 없는 길로 다음 주인을 찾아
떠났다. 쓰다 달다 말 한 마디 없이……. 그러나 나는 마치 그가 자기 편지를
전해주고 간 듯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보 통 편지 한
장을 들고.
도둑 고양이
그 무렵이다. 연일 내리는 비를 피해 새끼 다섯 마리를 거느린 고양이 일가가
헛간에 들어왔다. 어스름 저녁 외딴집을 찾아 든 도둑 고양이의 심정을 알
만했다. 식구는 많고 훔쳐먹는 끼니려니 오죽 배가 고프랴. 도둑 고양이 주제에
새끼는 왜 그리 많이 낳아 달고 다니나.
놈들은 부엌 창과 마주 보는 헛간에 한 뭉텅이로 엉켜 있었다. 내가 뒷문을
열고 나가면 기겁을 하고 나뭇단 속으로 숨어버렸다. 빠르기가 비호 같았다.
저녁을 마치고 부엌 쓰레기를 버리려 가다 보니까 뼈만 앙상한 고양이가
쓰레기장을 뒤지다가 도망쳤다. 에미려니 싶다. 에미 심정이 측은해서 먹다 남은
음식을 한데 비벼 내놓았다.
새벽에 나가 보니 밥 그릇은 깨끗이 비어 있는데 고양이 네는 간데 온데 없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렇지, 하룻밤 비를 피해 자고 간 모양이다. 지하실로 감자를
가지러 내려가다 깜짝 놀랐다.
층계참에 큼직한 쥐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밥값을 한 모양이었다.
낮에는 없어졌다가 밤이면 하숙집 찾 듯 찾아오는 고양이 네는 하숙집 주인
얼굴을 익혔는지 전처럼 도망을 가지 않았다. 다만 내 쪽에서 밥이 남지 않은
날은 그것들 걱정이 되었다. 비도 그치고 날씨가 좋으니 마땅한 거처로 옮겨
주었으면 한 것은 밥 때문이 아니라 밤에 부딪치는 그들의 안광 때문이다. 소리
없이 빛나는 안광은 아주 섬뜩했다. 파란불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어렸을 적
도깨비불이 연상될 정도였다. 또 밤마다 내 집에서 벌어질 처절한 살육전이
싫었다. 이심전심이었던지 어머니는 고양이만 눈에 뜨이면 쫓는 시늉을 했다.
그러구러 한 철이 지났다.
이제 고양이 네는 도둑 고양이가 아니다. 나를 보면 도망은커녕 앞발을
모으고 고개를 나붓이 숙인 채 아는 체를 한다. 뱃속부터 도둑 고양이가 따로
있겠나.
밤손님
영문도 모르고 급하게 서두는 시골행에 실려 길을 떠났다. 남편은 태연한
얼굴로 운전을 하다가 마을 앞 새마을 다리에서 차를 멈추고 어떤 상황이든간에
놀라지 말라고 다짐을 두었다. 궁금해하는 나에게 밤손님이 다녀갔다는 전화가
왔는데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딴 산마루에 집을 지은 지 스무 해가 가까이 되었지만, 밤손님 들기란 처음
있는 일이다. 비워둔 집을 손질하고 서울에서 밀려난 집기들을 갖다 놓고
드나드는 게 3년이 되었다. 한두 개 아쉬운 것들을 나르다 보니 이제는 불편한
것이 없으나 보석이나 값나가는 집기들이 있을 리 없다. 무엇을 바라고
들어갔을까. 한 가지 짚이는 것은 내가 아끼는 화집이 있었다.
화집 걱정을 하니까 화집을 욕심 낼 손님이라면 그런 짓을 안 한다고 일축해
버렸다.
과연 집은 폭행을 당해 있었다. 현관부터 창문까지 물 샐 틈 없이 잠가 놓아서
손님들은 괭이를 가져 다가 베란다 문을 망가뜨렸다. 문설주를 우그려 떼고 안쪽
큰 유리를 박살냈다. 그런데 집 안은 정리된 그대로였고, 화집도 무사했다.
옷장의 옷, TV, 부엌의 전자제품이 제자리에 있다. 참 의아했다. 자가용 타고
드나드니 돈푼께나 있는 집으로 오판했던 것일까, 외딴집이니 하룻밤 쉬어가려
했던가.
나는 한 가지라도 빠질세라 품목을 확인하며 뛰는 가슴을 진정하다가 장롱
위로 시선이 갔다. 아가들이 먹다가 얹어 두고 간 과자봉지들이 있었는데 과자가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밥풀과자가. 웃음이 났다. 재미있는 손님도 있지,
기왕에 먹을 거면 피아노 위에 죽순주나 한 잔 마시고 가지. 아무려나 밤손님
치고는 고마운 손님이다.
우리가 있을 때 들어왔으면 놀라서 기절을 했을 텐데……. 수고에 비해
수확은 없었지만, 가난한 문사의 사는 모습을 보고 갔으니 느낌이야 있지
않을까. 그 뒤로도 문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 고독한 순례자의 마음 같이
외딴집은 이래저래 이야기가 많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