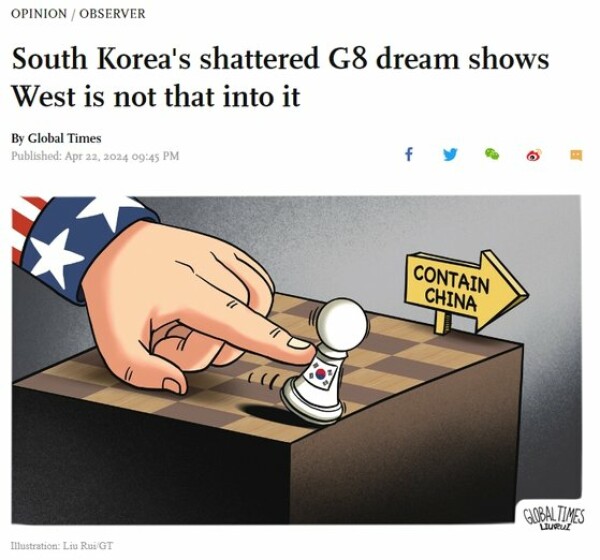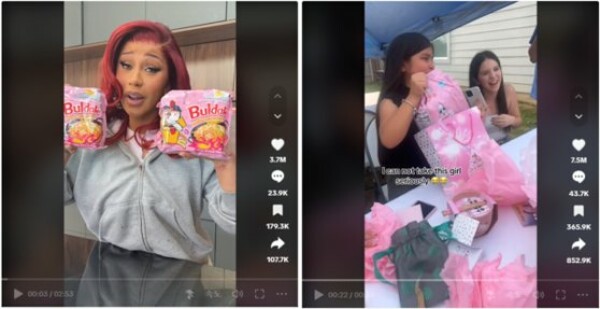문학 | [문학가 산책] 엄마의 설레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영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2-06 09:38 조회1,99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윤영인/화가(캐나다한인문학가협회 회원)
윤영인/화가(캐나다한인문학가협회 회원)
그 날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 때부터 시작되었기에 마루에 걸터앉아 햇볓을 쬐며 작은 화단의 꽃들에 앉은 잠자리를 보며 살금살금 다가가서 엄지와 중지로 날개를 잡고 파르르 떨리게 하며 놀까 하며 그것을 보고 있을때였다.
양쪽으로 되어있는 철대문 한쪽이 열리며 그때는 크게 보였던 커다란 박스가 사람보다 먼저 들어오며 엄마가 뒤따라 집안으로 오시면서 분주하게 ‘이곳에 놓으시라고’ 하시며 망설이시는 것이 보였다.
엄마가 오시니 반가워 하면서도 놓여진 박스를 빨리 풀어 보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드디어 그것은 그래도 작지 않은 오븐이었다. 지금의 전자렌지보다는 컸던 것 같다. 짙은 파란색과 녹색이 약간 있고 은색의 손잡이였는데 엄마는 대체 이런 신문물을 무얼 하시려고 집에 들여다 놓을까. 후에 쿠키를 그곳에 구워 주셔서 맞 있게 먹긴했고 여러가지 음식도 그곳에서 나왔던 것 같다. 또 어느 날은 큰 나무쟁반에 하얀 찰떡을 떡집에서 해오시면 안에 팥고물이 꽉차 있어서 한 입 베어물면 연속해서 서너 개는 금방 먹게 되었다.
그 다음날이면 약간 굳은 찰떡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구우면 겉은 바삭 속은 달콤한 팥알이 포근하게 씹히는 맛. 그맛이 그리워 빵집 떡집 등에 있는 찰떡을 사 먹어 봐도 그 맛이 아니어서 어떻게 그것을 먹어보나 하고 생각하다 내가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찰떡은 엄마의 재료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왕 찰떡이었다. 그시절 그래도 젊으셨으니 반쩍이는 신문물로 모양과 색이 다른 과자를 오븐에서 해주셨고 특별한 찰떡을 해 주신것 같다.
그 오븐을 사시던 날 살까 말까 고민하셨을테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을까. 이제야 조금 이해되는 엄마의 기분 두근거림을 느껴본다. 몇 날이 지난후 생소한 냄새에 음식을 가리키며 ‘이게 뭐야 색깔이’ 하고 코를 막고 말았다. 하지만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했는데도 먹어보니 맛은 괜찮은게 아닌가. 그것은 바로 카레였고 큰솥으로 하나 했는데도 나는 그 향긋하며 독특한 맛에 길들여져 몇그릇을 밥도 없이 먹은 적도 있다.
신문물과 바다 건너온 듣도 보지 못한 음식재료들, 다소 그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때쯤 향신료와 새로운 것들이 우리 엄마들의 마음을 훔치지않았나 싶다.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심에 지금도 카레를 보면 그 생각이 나지만 그때처럼 많이 먹게 되진 않는다.
또 다른 엄마의 설레임은 비취색 모시로 반팔인데 앞에는 똑딱이 단추 2 개로 되어있고 속이 비치는 재질이라 안에 티셔츠를 입고 그위에 모시 반팔을 입고 다녔다. 나름 유행도 있었지만 나는 엄마의 그 모습이 아름다워 나름대로 소화하며 입고다녔다.
한복의 버선 덧버신 등 작은 것들도 만드셨고 처음에는 책상 높이의 재봉틀을 후에는 작은 크기로 방바닥에 앉아서 하실 때 재봉틀 소리가 ‘작은 기차가 갑니다’ 라는 소리처럼 늘 정겹게 느낄 때가 많았다. 그러고 나면 예쁜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마음에 드는 것을 책상서랍에 넣고 보며 칙칙폭폭 소리가 언제 날지 기대하곤 했다. 엄마가 재봉틀에 앉으시면 나는 그 옆에서 뒹굴거리며 책도 보고 그림도 그렸다. 왜냐하면 엄마의 그 작은 설레임들이 나에게 느껴져 무엇을 해도 나는 신났었다.
그랬다. 엄마는 무엇인가 계속 하셨다. 많은 나이에도 어느날은 돋보기를 쓰시고 ‘용서’ 라는 책을 보시고 계셨고 집안에 작은 풀들로 물소리 나는 옹달샘도 만들어 작은 난들의 거리도 만드셨고 동양난의 꽃도 피우시며 작은 보이찻잔들과 다기그릇들이 엄마의 설레임을 계속 지속시켜 주었다.
이제는 엄마의 오븐이 사라진지 오래지만 옹달샘과 난초 귀여운 다기그릇들은 그냥 그집에 머물러 있다.
지난 봄 한국에 갔을 때 그 재봉틀은 아직도 케이스에 넣어져서 얌전히 방 한 귀퉁이에 심심한 듯 나를 바라보며 누군가 재봉틀 바늘귀에 실을 넣어주면 힘껏 소리내며 달릴 수 있다고 나에게 말 하는 듯했다.
엄마의 작은 도전 등을 보며 나도 난을 키우게 되었었고 소박한 다기그릇들의 언어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설레임 속에 사시다가 이제는 머지않아 산으로 바다로 흙으로 공기로 자연으로 가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때 기쁜 두근거림을 같이 가지고 가시면 그친구들과 그곳에서 ‘뿌웅’ 하는 기차의 기적소리를 듣고 계시면 좋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