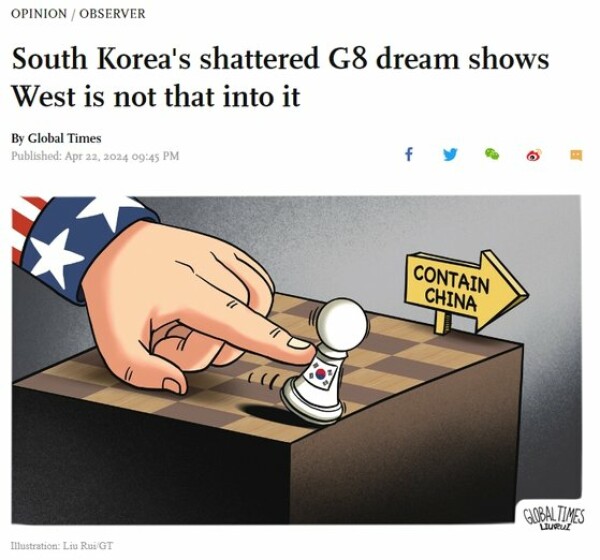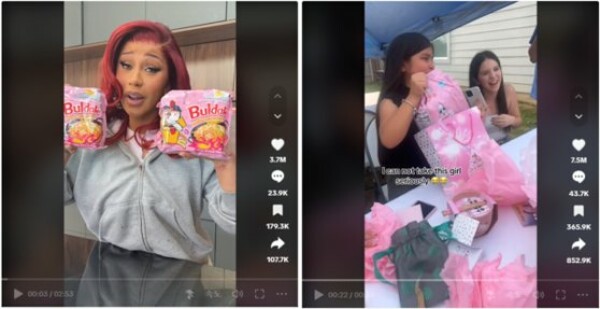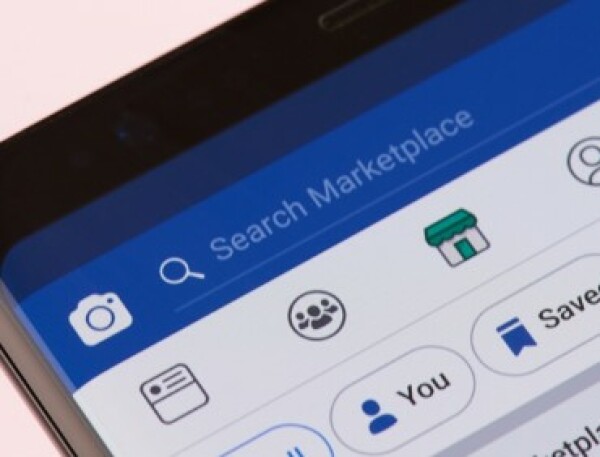문학 | [문학가 산책] 내 뜰 안에 축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영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15 07:42 조회1,02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윤영인/화가(캐나다한인문학가협회 회원)
여름에는 채소들을 뒷마당에 심으니 검은색과 흰색이 있는 큰 벌, 갈색의 벌들이 번갈아 와서는 꽃의 꿀에 앉는다.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 벌만 보면 피하기 바빴는데 마당에 온통 벌들이 오는지라 차츰 그 두려움도 조금 사라졌고 벌들 주위에서 잡초를 뽑아도 내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꽃 벌들은 꽃에서 꿀과 꽃가루를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나누고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들을 키우며 자연스러운 가루받이로 분주해서 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편해져 갈 때쯤이었다.
이 무렵부터 생명을 가진 것들과 자연스럽고 놀라운 만남이 나에게 찾아와 내가 캐나다에 살고 있으며 이곳이 자연의 나라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쪼그리고 앉았다가 허리를 펴려고 일어났지만 따뜻한 태양이 나를 이리 저리 걸으며 해를 바라보게 만들어 ‘오늘 잡초뽑기는 그만이다’하고 두 팔을 쭉 뻗었을 때 바람 없는 풋풋한 풀내음이 나의 손을 잡으며 안아 주는 듯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맡기고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막 떴을 때였다.
한여름 정오의 햇살은 내 눈을 착시 현상이라도 만들 듯 내 곁으로 세 쌍의 나비가 둘씩 짝을 지어 내 주위를 셀 수 없이 빙글빙글 돌더니 잔잔하게 옆에서 맴돌다 위로 올라가 파아란 하늘 속으로 들어간 듯했다. 좋아하면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두리번거리다 집으로 들어와 따뜻한 차를 양손으로 살며시 감싸쥐고는 나는 미련이 남았는지 뒷마당을 보며 나비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밖을 보고 있을 때 바로 내 눈높이의 유리문 밖에서 잠자리 이십여 마리가 넘는 듯 일렬로 줄을 맞춰 리듬을 타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예상치 못했 던 오케스트라의 움직임이어서 말도 안 나오고 소리를 내면 날아갈까 봐 그냥 조용히 보고 있었다. 음악도 없는데 리듬에 따라 흥겹게 움직이더니 잠자리떼들은 나풀거리며 함께 날아갔다. 줄을 맞춰 날아 가는 한 무리의 끝에서 나도 날개를 흔들며 그 리듬을 즐기고 있었다.
차는 다 식었지만 식은 차를 한 모금 넘기며 혹시나 또 오려나 창 너머 뒷 마당에 시선이 머물렀다. 오후에 귀가한 가족들에게 말했지만 보지 않았기에 이해가 안 가는 표정으로 듣는 듯 했다. 그래도 신기했던지 몇 가지 질문을 하길래 이때다 싶어 누구에겐가 말하고 싶었던 자연이 주는 감동을 그대로 자세하게 말해 주었다. 나도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가족들의 덤덤한 반응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한번은 애들 아빠가 평상시와는 다른 낮은 소리로 나를 부른다. 천국으로 간 옅은 갈색 토끼가 아주 곱게 우리집 앞 잔디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다. 캐나디언인 옆집 아이와 엄마가 보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나는 희고 부드러운 종이를 주며 세 번 조심스럽게 잘 싸라고 했다. 근처 공원 가는 길 조용한 곳에 묻어 주기 위해 함께 가서는 흰 장갑을 끼고 고운 흙으로 뿌려주며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는 간단한 묵상을 하고 왔다.
그 일을 잊고 지냈는데 얼마 후 집 앞 잔디에 내 손바닥 반 정도 되는 아기 토끼가 보였다. 토끼들은 예민하고 인기척이 있으면 숨거나 뛰는 것이 보통인데 조그 마한 토끼는 50센치 정도 거리에도 가만히 풀을 뜯고 있었다. 깜찍하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가면 가려니 하면서 움직여 봐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나는 토끼가 더 오래 풀밭에 머물기를 바라며 집으로 들어왔다.
하루에 두 번씩 아침과 해질 녘 즈음에 소리없이 와서는 오랫동안 머물다 가는 것이 잠시 일상이 되곤했다. 근 한 달이 넘는 동안 외출해서 돌아오면 소리없이 토끼의 안부를 챙기게 되었고 토끼가 와 있을 때면 가만히 지켜보다 작은 소리로 말을 걸어 보기도 했다.
이런저런 일들로 토끼에 대한 관심이 소홀할 무렵 몇 달이 지났을까. 처음으로 스카이트레인을 혼자 타고 다운타운에 다녀오는 길에 버스에서 내려 언덕을 올라 집 근처를 향해 왼쪽으로 돌아섰다. 그곳에는 제법 자랐지만 조금은 야윈 토끼가 어느 집 담장 옆에 웅크리고 있어 순간 주춤하고는 ‘반가워 토끼야’라고 부르며 바라보니 귀를 쫑긋 세우고 내쪽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10분 20분 한동안 서 있다보니 서로 떠날 생각이 없었다. 마침 애들 아빠가 보낸 카톡음이 울리길래 나와서 함께 토끼를 보자고 했다. 갈색보다 회색이 유난히 많이 있는 토끼는 애들 아빠가 올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우리는 토끼가 무언으로 말하는 것을 이해라도 하는 듯 눈을 쳐다보고 귀여운 움직임의 재롱도 즐기게 되었다. 해가 긴 여름이라도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고 버스로 멀리 다녀오니 눈도 감겨 ‘안녕’ 인사를 해 주고 먼저 자리를 뜨면서도 아쉬워 뒤돌아보았다. 그런데 그 토끼는 나를 배웅이라도 해주듯 내 쪽을 보며 앙증 맞게 서 있었다. ‘자연 속에서 지내는게 더 행복 할거야’라는 당부하는 말로 나를 위로하며 낮게 떠 있는 달을 보면서 집으로 향했다.
어느 맑은 날 아침에는 “공작이 왔네”라는 딸 아이의 말을 무심코 들으며 커튼을 걷으려고 부엌 쪽으로 가면서 ‘공작이 왔단 말이지’ 혼자 천천히 다시 되뇌었다. ‘와 이 상쾌한 아침에 우리집 마당에서 공작을 보게 되는건가’라고 크게 소리 치고 싶었지만 혹시나 내가 마음속으로라도 놀라면 그 우아한 공작들이 가 버릴까 봐 콩닥거리는 마음을 가만히 두고 너무나도 편안히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내심 너무 기뻐 정말 왔나 하면서도 그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왜 이제야 왔나 아니 지금 와 줘서 더 고맙고 반갑다는 생각을 했다. 가끔 뒷마당으로 나가는 유리문 앞에서 새와 곤충들 또는 작은 동물을 보기 위해 잠시 있었던 적은 있지만 오늘은 몸집이 커다란 두발을 가진 새 친구를 만나려고 큰 창 앞에 섰다.
두 마리의 친구는 내가 심어 놓은 식물들 사이를 다니다가 나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유리문 앞에 와 있었다. 친구들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 큰 유리문을 열어 놓으니 방충망 사이로 두 마리 중 조금 더 큰 친구가 나를 뚫어지게 보는데 생각보다 커서놀라고 단단한 방충망을 뚫고 들어 올 기세라서 난 뒷걸음치며 방충망 너머로 볼 수밖에 없었다. 자연에서 온 귀하고 화려한 친구들이라도 가까이에서 만나니 몸집이 크고 얇은 방충망을 사이에 놓고 나 혼자 보고 있자니 긴장도 되고 누군가 좀 더 내 옆에 오래 머물렀으면 좋았을텐데 하지만 딸도 바빴는지 한 번 흘려 보고는 남다른 애착 없이 무심하게 외출한 상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집 주변에서 자주 보아왔기에 나도 나가야 했지만 다행히 약속은 아니어서 ‘늦어도 할 수 없네’ 하며 내 눈에 그리고 사진에 담고 있었다.
움직임이 없이 서 있는 것이 뭔가 먹을 것을 주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잘 못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오갈 때 어젯밤 잡곡밥을 하기 위해 불려 놓은 콩이 남아 몇 개를 줬더니 이미 먹어 본 듯 잘 받아먹었다. 다른 한 친구는 밭에 심어 놓은 채소와 땅속에 있는 벌레를 찾아 먹는 재미에 빠졌는지 텃밭에서 고개도 안 들고 먹이를 골라내고 있었다. 이 텃밭에서는 누구라도 잘못 밟아 식물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나도 모르는 소프라노 음성이 나오곤 하는 곳인데 공작새가 이리저리 다니는 것은 아름다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큰친구는 내가 주는 콩의 맛 을 아는 듯 계속 달라고 하는 눈길을 보내 몇 알을 더 주고는 살짝 문 옆으로 몸을 숨겼다.
조금 후에 가려니 했지만 나의 아쉬움을 알았던지 삼십 여분이 지나고 높은 나무 담장 위에서 또 몇 분 동안 더 머물러 주었다. 두 마리의 공작은 서로에게 다음에 또 오자고 약속을 하는 듯 한참 뒤 높은 담장을 넘어 걸어가는 것을 본 후에야 나도 그들의 보금자리로 안전하게 가길 바라며 돌아섰다. 그 후 너무나 고맙게도 공작은 우리 뒷마당에 몇 번 더 와서 그들만의 고고한 자태를 실컷 뽐내면서 여유롭고 느린 걸음으로 유유자적 편안하게 서로 왔다갔다 재미나게 놀다가 갔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도 첫 만남과는 다르게 그들을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한때는 우리 집 주변에서 삼십여 마리가 넘는 공작새의 무리를 이웃집 지붕이나 길가에서 보았고 가로수 주변에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산책의 즐거움을 더 해줬는데 언젠가 부터는 드물게 보게되어 아쉽기도 했다. 때때로 공작새가 꼬리 날개를 펼치게 되면 아이들이 *‘얼음 땡’을 외칠 때와 마찬 가지로 나는 얼음처럼 그 자리에 멈추어 공작의 날개가 다시 접힐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순간은 마치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색들에 매료되어 숨이 한껏 멎는 느낌이었다.
캐나다에서 동물원이 아닌 우리집 작은마당에서 공작과 야생토끼도 만나고 가끔 만난 잠자리떼와 흔한 나비 친구를 만나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이다. 우연히 왔겠지만 나는 그들의 눈을 가까이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잠시나마 멈추었다 갈 수 있었기에 공작과 작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숨을 쉬는 생명의 보여지는 겉모습만 우리는 눈에 담고 그리지만, 그들은 자연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친구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내 친구들은 어디에선가 한때 내가 받았던 감동의 깜작 선물을 누구에겐가 전달하고 있을 듯하다. 지구의 한 모퉁이 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우리에게 잠시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랑스러운 친구들과 눈으로 마음으로 위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얼음 땡 : 아이들의 놀이에서 술래가 ‘얼음’ 하면 멈추고 ‘땡’ 하면 움직일 수 있는 놀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