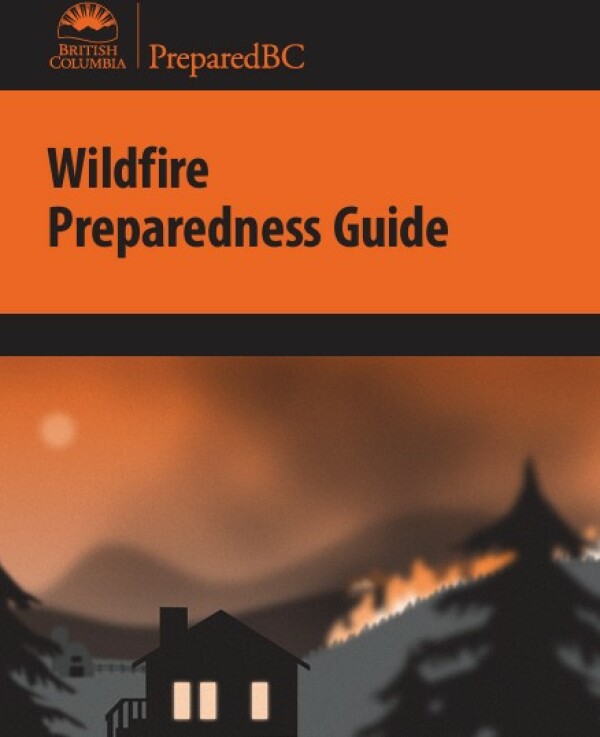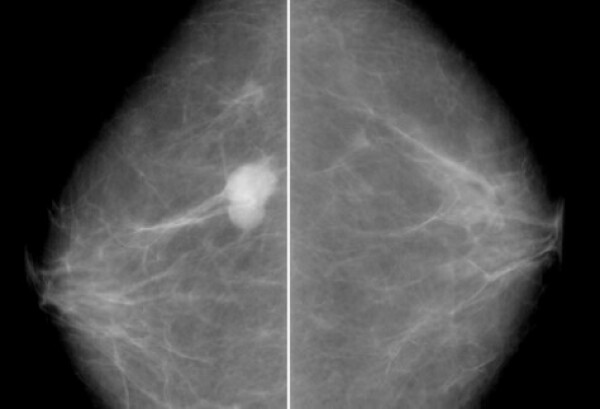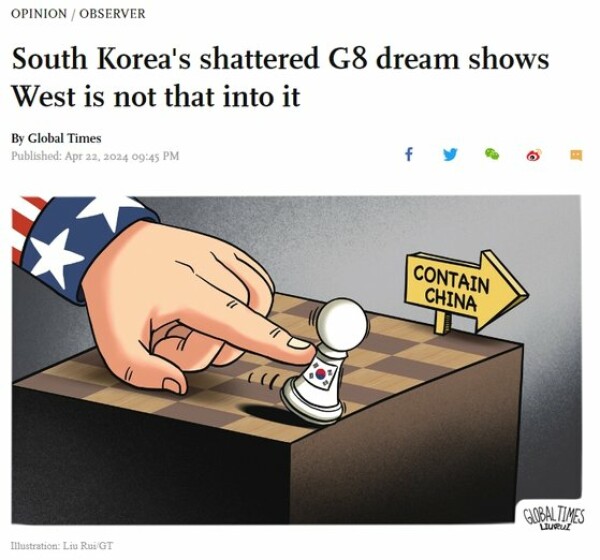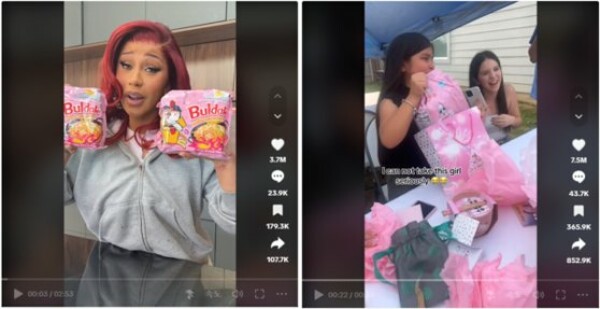문학 | (문예정원-문학) 반월호수 스케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John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1-21 08:56 조회88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수가 있다. 자동차를 몰고 가면 십여 분만에 닿을 수 있는 거리다. 반월호수, 가끔 그곳을 즐겨 찾는다.
아침저녁으로 사람들이 슬리퍼를 끌며 산책을 한다. 십여 년 전만 해도 호수 주위가 조금은 황량해 보였지만 지금은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나무데크와 산책로가 잘 다듬어져 있다. 고즈넉한 분위기. 호수 둘레에 심어진 주먹만 한 크기의 하얀 목수국이 꽃 울타리를 만들 때가 가장 절정에 이른다.
호수 맞은 편, 높은 철책 너머로 기차가 빠르게 지나간다. 비 오는 날이면 기차가 자갈을 밟으며 레일 위를 달리는 소리가 좋다. 빗물과 레일, 자갈이 달라붙는 듯한 소리가 적당히 버무려진 젖은 마찰음. 기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그 진동 여음이 호숫가에 남는다.
가끔 나타나는 노란색, 빨간색 ‘커피카’들이 호수의 풍경에 한몫을 한다. 장난감처럼 굴러가는 앙증맞은 이동 카페. 자동차 안의 바리스타가 커피머신에서 원두커피를 내린다. 커피 향이 호숫가에 퍼진다. 커피 알갱이를 잘게 빻아 내린 드립커피는 어쩌다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이자 행운이다. 포인트 종이에 스탬프가 늘어간다. 바로 내린 뜨거운 커피의 골판지 홀더를 두 손으로 쥐고 부드러운 우유거품을 먼저 맛본 다음, 커피와 함께 마지막으로 느끼는 바닐라 시럽의 맛. ‘카라멜 마키아또’의 달콤한 사치는 안개 낀 날에 꼭 즐겨야만 하는 호수의 필수 메뉴다.
호수를 한 바퀴 둘러보고 벤치에 앉는 시간. 산 그림자가 조용히 호수 가장자리 앞에 머물다 간다. 해동갑으로 상상나래를 펼치는 것도 오후의 산책이 즐거워지는 이유다.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떠올리며 설계를 한다. 우선 나지막한 산은 그냥 배경으로 둔다. 호수 가운데 편평한 바지선을 앉힌다. 건축공법은 잘 모르더라도 눈으로 짓는 집이니 무슨 상관이랴. 자연 경관을 맘껏 들이도록 기둥을 제외하고는 모든 벽은 유리로 만들 생각이다. 지붕 또한 유리로 하되 반구형 돔의 형태는 어떨까. 비가 내리는 날엔 빗방울이 다닥다닥 유리 벽에 달라붙어 시야를 흐릴 것이다. 서릿발이 그대로 눈꽃이 되는 겨울. 성에 낀 유리를 입김을 불어 긴 소매 깃으로 닦고, 동그랗게 번져가는 구멍에 눈을 대며 바깥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하게 볼지도 모른다. 낮에는 녹음이 진 산을 그대로 눈에 담고, 밤에는 천장에 별을 가득 들여놓아 북극성을 찾다가 그대로 잠이 들 수도 있겠다. 국자모양의 별이 뒤집어져 은하수 가루를 하얗게 쏟아 낼 무렵이면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나무수국이 담을 이룬 울타리에서 호수 가운데 떠 있는 집으로 건너오는 다리는 통나무로 엮어 뗏목처럼 띄워야 한다. 나무 하나하나를 엮어 출렁이는 다리 하나를 조금은 부실해 보이게 만든다. 방문객이 당도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취한 듯 흔들거리며 줄을 잡고 건너오게 하고 싶다. 잘 웃지 않고 너무 근엄한 표정을 짓는 사람은 가차 없이 물에 빠트리는 상상과 그 즐거움을 생각한다. 평소 유쾌한 사람은 더욱 유절쾌절하게 부러 다리를 흔들어가며 건너오다가 아차, 중심을 잃는 순간, 노르웨이 고등어가 담긴 비닐주머니를 실수처럼 던질지도 모른다. 그 집의 주인은 아주 익숙하게 그것을 받아 들고 프라이팬에 즉석요리를 할 것이다.
빨간 우체통도 하나 세웠으면 한다. 다리를 건너 편지를 가지러 갈 때마다 어어! 짧은 비명과 함께 두 팔이 엇갈린 채로 팔랑개비처럼 돈다. 겨우 중심을 잡고는 누가 보았을까 휘익 한 번 둘러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랩스커트 자락을 여미며 시치미를 뚝 뗄 것이다. 우체통 안을 확인하고 돌아올 때는 오리처럼 뒤뚱뒤뚱 어색하고 빠른 걸음으로 종종거릴지도 모른다. 스마트폰으로 카톡과 메일을 주고받는 시대일지라도 손으로 꾹 눌러 쓴 편지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아날로그 감성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것이다. 밤이 되면, 가끔 제 모습을 비추어보다가 나르시시즘에 빠진 달의 몰락도 지켜보는 즐거움. 달의 정령이 조용히 올라올 수 있게 줄사다리 하나쯤 걸쳐놓는 여유도 나쁘지 않겠다.
꿈이 무르익는 계절. 갈색으로 말라버린 목수국 울타리가 그대로 풍경이 되는 반월호수. 그 위에 지은 집 하나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일렁거린다. 입 꼬리가 가만히 올라간다. 누군가 너무 비현실적인 몽상이라고 비웃기라도 한다면, 엄지와 가운뎃손가락을 딱 부딪쳐 기차의 경적소리를 불러내고, 나는 짐짓 딴청을 하리라. 기차가 등 뒤로 환상을 깨우듯 숨가쁘게 달려간다. 아, 무산인가. 허공에서 분절되어 날아간 꿈. 아무렴 어떠랴! 꿈은 기차처럼 가고 또 올 테니까. 그 집은 나 혼자 마음속에서 짓고 볼 수 있으니 건축 자재비가 들지 않고 언제나 무제한이다. 유쾌한 상상만으로 가능한 가상의 집을 떠올리는 즐거움. 이제 그 집에 멋진 이름 하나 선사하고 싶다.
호수 한가운데 그림처럼 떠 있는 집, ‘레이크 하우스.’
바람이 분다. 호수 앞에 있는 빨간 지붕의 풍차가 눈에 들어온다. 잔디 위 민들레 홀씨를 형상화한 조각도 바람을 타는 것처럼 보인다. 홀씨가 날리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보이는 건 계절과 상관없이 바람을 타고 나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요일 오후, 늦더위를 피해 호숫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아이들. 애완견을 안고 서 있거나 가만히 호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좀처럼 자리를 뜰 줄을 모른다. 고개 숙인 가로등이 할미꽃처럼 졸고 있는, 정지된 화면 같은 느린 오후의 시간. 이렇게 호숫가에 앉아 있으면 ‘쇠라’의 그림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가만히 떠올리게 된다. 마치 그 그림 속의 어딘가 쯤, 시간을 잊고 그 속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최 영 애 /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