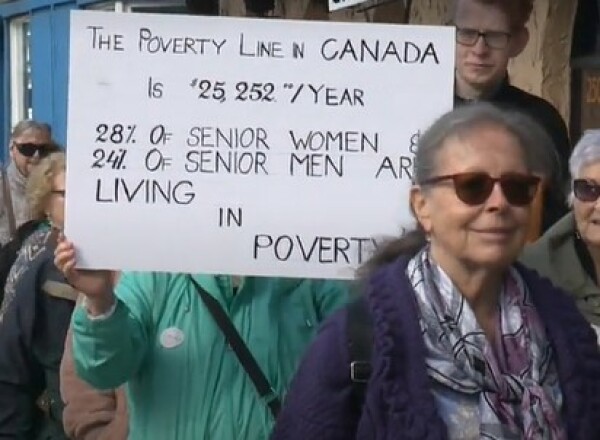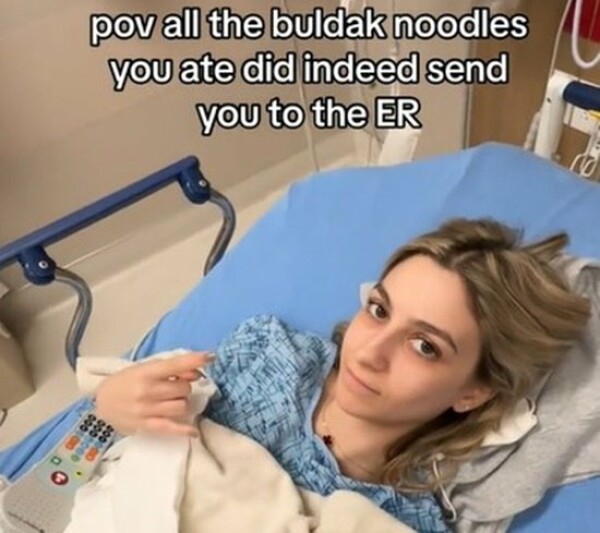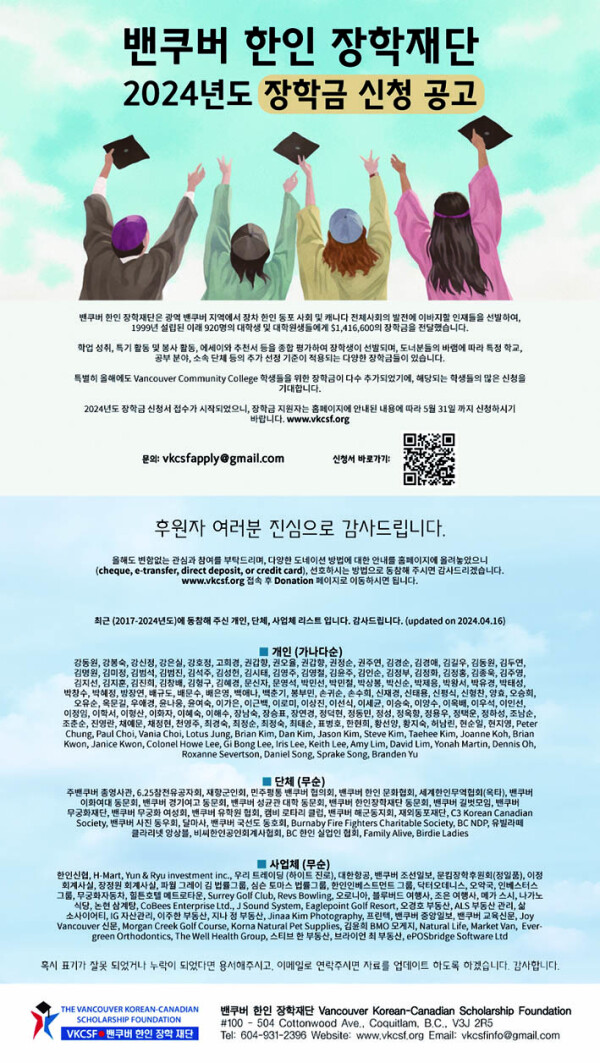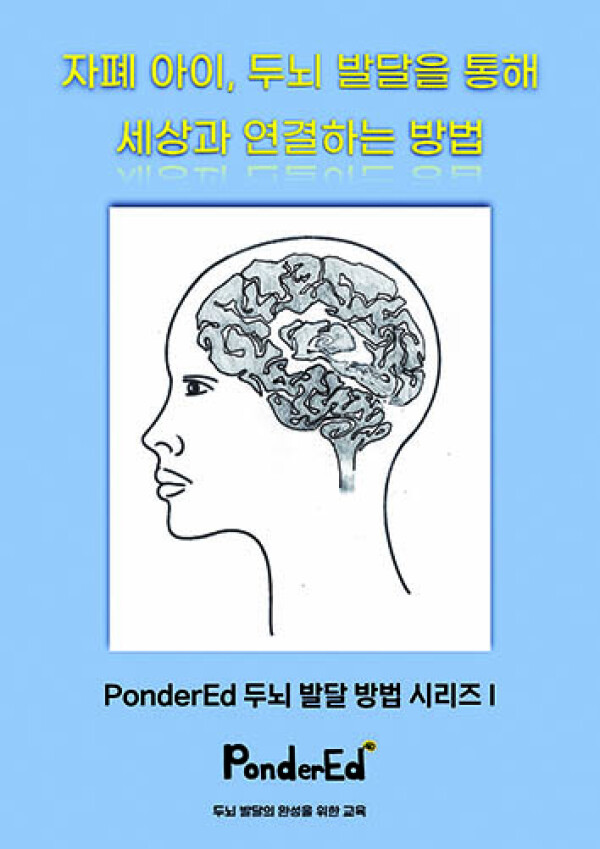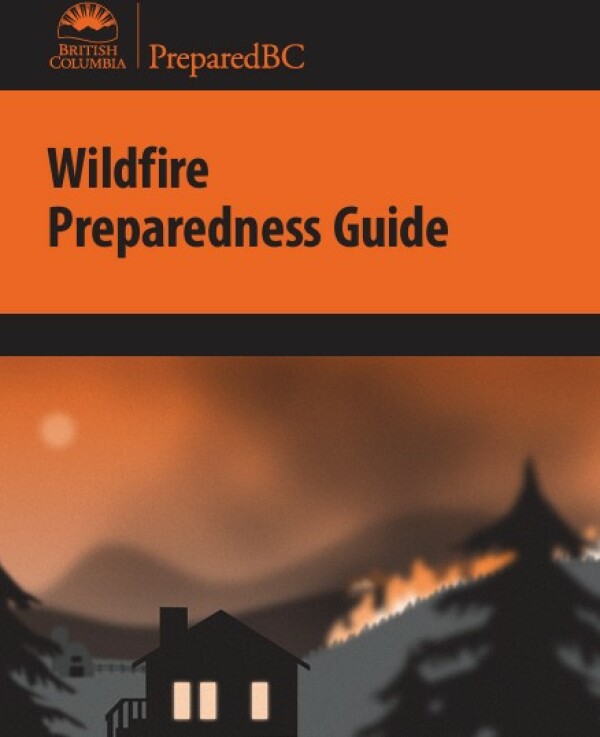맛 | 연 2조 손해에 폭발···日, 노쇼 손님에 음식값 다 물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1-28 09:31 조회1,38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노쇼 고객, 더 이상 못참겠다”
도쿄 긴자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사토 다쓰야(43)씨는 ‘노쇼(No Show)고객’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예약을 해놓고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 고객’은 많을 땐 한달에 최대 20건에 달한 적도 있다.
올해도 1인당 5500엔(약 5만5000원)짜리 코스를 주문한 18명 단체 손님이 모른 척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 예약 손님에게 전화를 하면 “앗, 깜빡했다”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손님도 부지기수였다.
일본에서 음식점 예약을 해놓고서 나타나지 않는 일명 ‘노쇼(No Show)’ 고객에 대해 음식값을 전부 물리는 강경책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푸드서비스협회 등 업계 차원에서 ‘노쇼 고객’에 대한 대응방침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각 음식점별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서도 혼자 끙끙대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업계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코스 요리를 주문해놓고 무단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도 ‘노쇼 고객’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약한 음식값 전액을 청구할 방침이다.
메뉴는 주문하지 않고 자리만 예약한 경우에도 평균 객단가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손님 입장에서도 ‘예약 취소’의 기준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엔 되도록 빨리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하라고 명시했다.
음식값을 물게 하는 방법으로 예약을 받을 때 손님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받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무단 캔슬’, ‘노쇼 고객’이 횡행하고 있는 배경으로 업계는 인터넷 예약이 쉬워진 점을 꼽았다. 쉽게 예약하는 만큼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노쇼'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는 풍조가 생겼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예약시간이 되어도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는 케이스는 전체 예약 건수의 약 1%로, 손해 금액은 연간 약 2000억엔(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음식점 측에서는 예약을 받은 이상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는데다 대량의 식재료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
협회가 마련한 지침에는 ‘악질 사례’도 소개됐다. 회사 거래처의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며 일식, 양식, 중식 3종류의 식당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예약해두고 당일 거래처의 취향에 맞춰 한 곳으로 가는 사례도 있었다.
도쿄시내 음식점 업계는 아예 “무단 캔슬 대책추진협의회”까지 만들었다. 예약을 받을 때 신용카드 번호를 등록하도록 하거나, 전날 예약 확인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서비스를 대행해줄 방침이다.
오츠카 료(大塚陵) 변호사는 산케이 신문에 “여행 등은 취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게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정착되어있다. 음식점의 무단 캔슬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중대함을 알고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도쿄 긴자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사토 다쓰야(43)씨는 ‘노쇼(No Show)고객’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예약을 해놓고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 고객’은 많을 땐 한달에 최대 20건에 달한 적도 있다.
올해도 1인당 5500엔(약 5만5000원)짜리 코스를 주문한 18명 단체 손님이 모른 척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 예약 손님에게 전화를 하면 “앗, 깜빡했다”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손님도 부지기수였다.
도쿄의 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줄 선 순서에 따라 칠판에 이름을 적으며 점심식사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중앙포토]
일본에서 음식점 예약을 해놓고서 나타나지 않는 일명 ‘노쇼(No Show)’ 고객에 대해 음식값을 전부 물리는 강경책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푸드서비스협회 등 업계 차원에서 ‘노쇼 고객’에 대한 대응방침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각 음식점별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서도 혼자 끙끙대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업계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코스 요리를 주문해놓고 무단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도 ‘노쇼 고객’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약한 음식값 전액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쿄 긴자의 번화가에 음식점들. 윤설영 특파원.
메뉴는 주문하지 않고 자리만 예약한 경우에도 평균 객단가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손님 입장에서도 ‘예약 취소’의 기준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엔 되도록 빨리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하라고 명시했다.
음식값을 물게 하는 방법으로 예약을 받을 때 손님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받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무단 캔슬’, ‘노쇼 고객’이 횡행하고 있는 배경으로 업계는 인터넷 예약이 쉬워진 점을 꼽았다. 쉽게 예약하는 만큼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노쇼'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는 풍조가 생겼다는 것이다.
도쿄 긴자의 번화가에 음식점들. 윤설영 특파원.
업계에 따르면 예약시간이 되어도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는 케이스는 전체 예약 건수의 약 1%로, 손해 금액은 연간 약 2000억엔(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음식점 측에서는 예약을 받은 이상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는데다 대량의 식재료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
협회가 마련한 지침에는 ‘악질 사례’도 소개됐다. 회사 거래처의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며 일식, 양식, 중식 3종류의 식당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예약해두고 당일 거래처의 취향에 맞춰 한 곳으로 가는 사례도 있었다.
도쿄시내 음식점 업계는 아예 “무단 캔슬 대책추진협의회”까지 만들었다. 예약을 받을 때 신용카드 번호를 등록하도록 하거나, 전날 예약 확인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서비스를 대행해줄 방침이다.
오츠카 료(大塚陵) 변호사는 산케이 신문에 “여행 등은 취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게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정착되어있다. 음식점의 무단 캔슬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중대함을 알고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