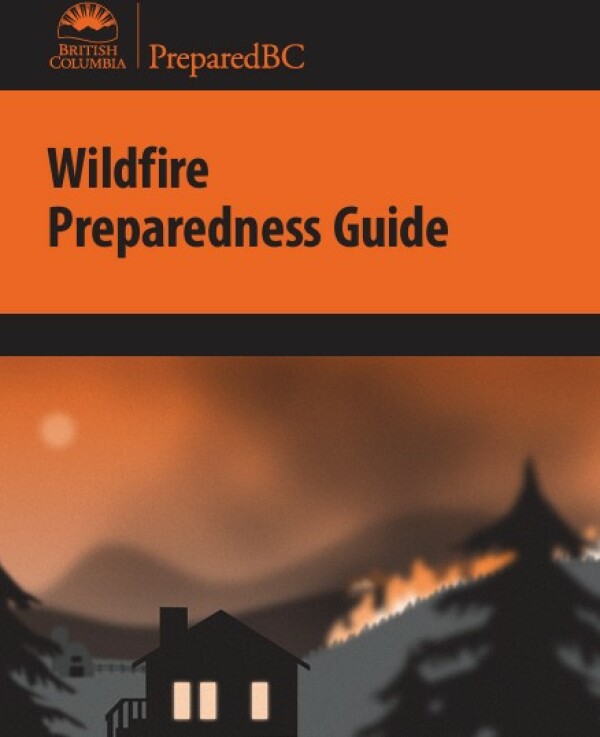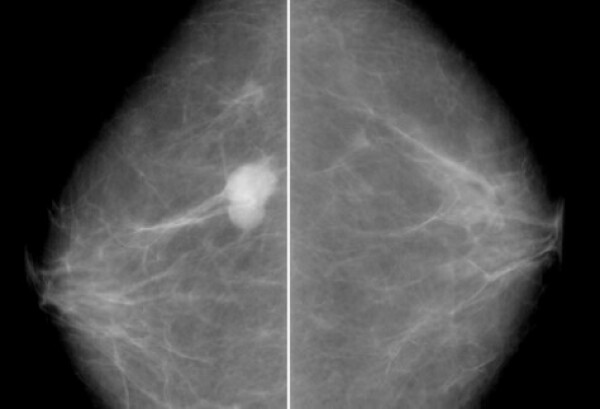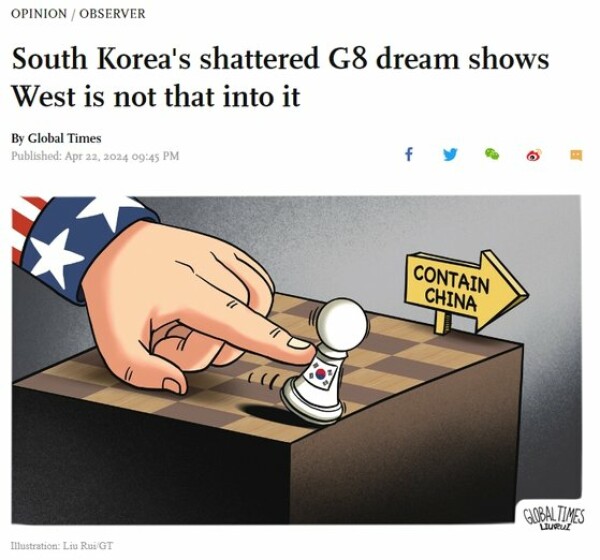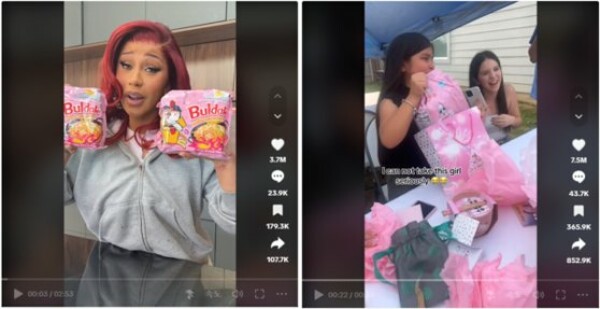문학 | [문예정원] 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원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2-19 16:23 조회1,79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최원현 /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열렸다 • 또 열렸다 • 그리고 닫혔다 • 또 닫혔다.
육중한 이중의 문이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아주 짧은 한 순간 멈췄다가 돌아간다. 숨을 멈춰본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느껴지는 세상의 움직임. 나도 다시 숨을 내쉰다.
여러 번을 왔던 곳이건만 오늘도 이곳엔 계절과 관계없이 두려움과 절망들이 오돌 오돌 떨며 서있다.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는 몸짓을 해대고는 있지만 느껴지는 차가운 눈길들로 인해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추위를 타는 것 같다. 적막, 고요, 바람조차 느껴지지 않는 무중력의 공간, 아주 미미한, 무언가 있다고 느껴지기만 할 정도의 기운들이 공간을 부유한다. 그 속에서 신의 힘으로 느껴지는 기운과 인간의 힘으로 느껴지는 기운이 서로 부둥키며 붉은 구멍 같은 통로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람들이 등을 보이고 떠나버린 자리, 검은 상복의 두 여자가 소리도 없이 닫혀버린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고 한 남자가 두 여자의 등을 밀며 그 자리를 벗어나자 하고 있다.
동갑내기가 세상을 떠났다. 2년여의 암 투병을 했다. 투병이라기 보단 2년 전에 이미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해버린 터였고 고통만이라도 없게 해달라고 한 시도 쉬지 않고 빌었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아내와 가족들도 그의 앞에 열려있는 문을 보았다. 그러나 빠끔히 열려있는 그 문을 함부로 닫거나 활짝 열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도 하지만 그곳까지는 누구의 손도 미치지가 않았다.
때가 되어 그가 들어갈 만큼 열려야 했고 그가 그곳까지 이를 수 있도록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줘야 했다. 그렇게 2년을 기다림 아닌 기다림으로 보낸 끝 에야 소리 없이 문이 열렸고 그의 몸만 남긴 채 영혼만 그 문을 통과해 나갔다.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떠나버린 빈 몸만 붙들고 경건한 의식에 들어갔다.
아주 정중하고 엄숙하게 영혼이 떠나버린 그의 몸을 한 줌 재로 만들어 줄 전권대사가 인사를 했다. 유족에게 인지 그가 맡아 해야 할 시신인지 가늠이 잘 되지 않는 방향으로 몸을 굽히고 인사를 한 후 뒤돌아 문을 향해 내 동갑내기가 든 마지막 집을 통째 밀었다. 그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육중한 문이 소리도 없이 닫혔다. 세상과의 차단, 아니 이 세상과는 다시 연결될 수 없는 넓은 강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가족들이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아니 그와 연결되어 있던 모든 관계가 끝이 났다는 통보였다.
친구가 들어간 문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얼마쯤 후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또 열리고 닫힐 거라는 생각을 하니 그건 그의 전용 문도 아니란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몰래 눈길이 옮겨져 버렸다. 그렇다면 산다는 것도 수없이 많은 문을 들고 나는 것들이지 않을까. 바라보이는 저 문만 들어가면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것 같고, 그 문만 통과하면 모든 고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대와 바람들도 문 때문에 갖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친구에게 저 문은 정말 다시 열 수도 열리지도 않을 마지막 문일까. 친구를 향해 열려있던 수많은 세상의 문들이 저 문 하나 닫았다고 다 닫혀버릴까.
얼마 전 방송에서 희귀직종 유망 직업을 소개하는데 사이버장의사란 게 있었다. 사람이 죽어도 남아있는 살아있을 때 세상과 연결하고 있던 수많은 고리나 줄들을 끊어주는 직업이라고 했다. 은행 관련에서부터 각종 사이버상의 카페며 블로그나 사진 등을 비롯하여 영상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퍼져 있는데 그걸 정리해 주는 것이라 했다. 그 또한 세상과 통하던 문이 아니었을까. 보이는 문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문도 있다는 사실에 그런 일도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다. 그렇고 보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린 문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수없이 문을 열고 또 연다. 나도 이 자리를 뜨면 또 몇 개의 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갈 거고 거기서 다시 차문을 열고 닫아야 집으로 갈 수 있다. 다시 차문을 열어야 나올 수 있고 집의 문을 열어야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집문 뿐인가. 방문도 열어야 한다. 책상도 연필통도 문이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수 없는 문 속에 갇혀 산다. 아니 문과 함께 산다. 축구나 핸드볼처럼 골문을 향해 공을 던져 넣는 경기도 있지만 삶의 문은 하나씩 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 문도 그렇다.
문은 사전에선 ‘내부와 외부를 드나들거나 물건을 넣었다 꺼냈다 하기 위하여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이거나 ‘어떤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나 경계의 입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있다. ‘축구나 핸드볼 따위의 경기에서 공을 넣도록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내 친구가 들어간 문은 그 중 어떤 문도 아니다.
통로나 경계의 입구도 아니다.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해 간 문, 그것도 아니다. 한 삶을 정리하고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또 다른 삶으로 옮겨간 것이다. 다만 그걸 겪어본 사람이 아무도 돌아온 적이 없기에 실체를 모르니 정작 실감도 안 나고 그 존재에조차 긴가 민가 할 뿐이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문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어떨 땐 내가 그 문이 되기도 한다. 아니 문이 열리는 것을 막는 방해물이거나 의도적으로 열리는 걸 저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열릴 문이 안 열리지도 않을 것이다.
문, 내 살아온 삶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을 열고 닫고 했겠지만 이제는 열린 문은 닫되 닫혀 있는 문은 열려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지금 에야 열려고 하는 문은 욕심일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열어놓은 문들도 잘 살펴보고 닫을 수 있다면 닫아야 할 것 같다. 문은 인연이고 관계로 통했지만 내 삶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흔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친구는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간 후 어찌 되었을까. 영혼 따로 육신 따로 분리되어 영혼은 하늘로 육신은 흙으로 각기 문을 열고 최종 목적지에 이르렀을까. 얼마 후 이 세상 내 생명의 기한이 다 되어 친구가 갔던 곳으로 내가 가게 되어 만나면 날 알아봐 줄까. 그러나 그가 떠난 문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가 떠난 후 사람들은 문에는 더 이상의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결국 문은 의식할 때만 느껴질 분이고 내가 열어야 할 때만 보이는 것인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문과 함께 산다.
추모공원의 자동문을 나선 우리는 집으로 가기 위해 또 자동차의 문을 열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