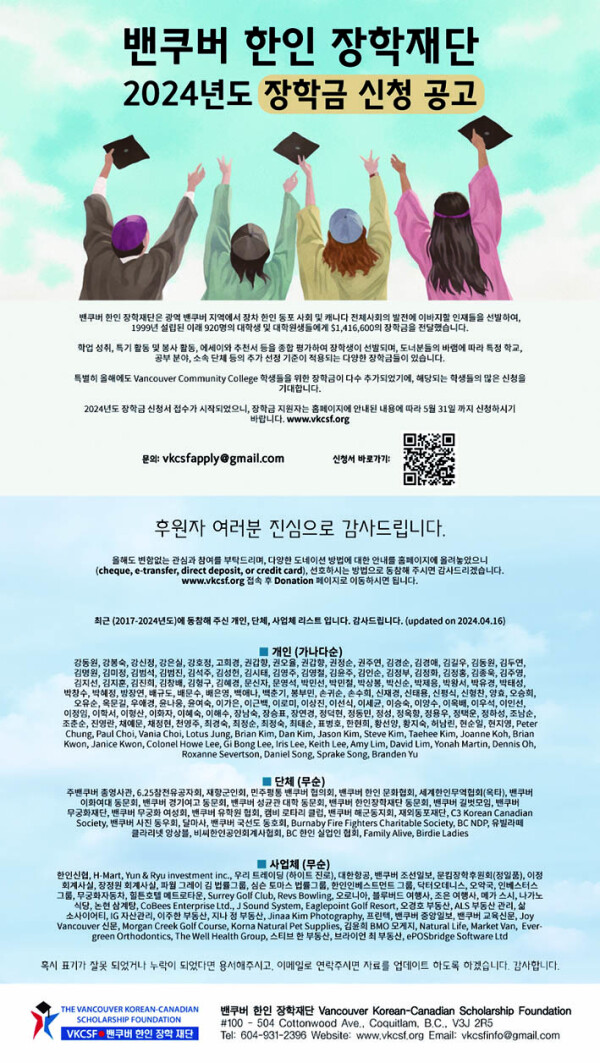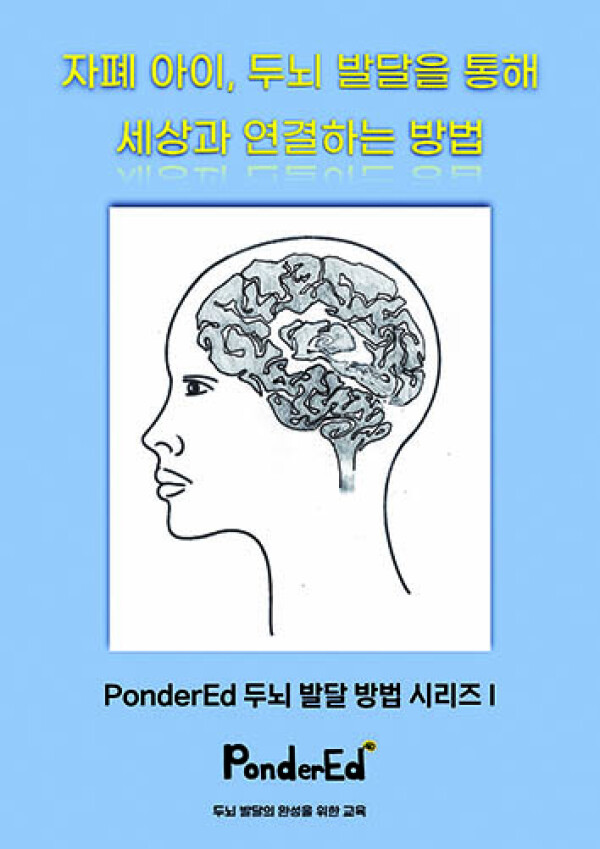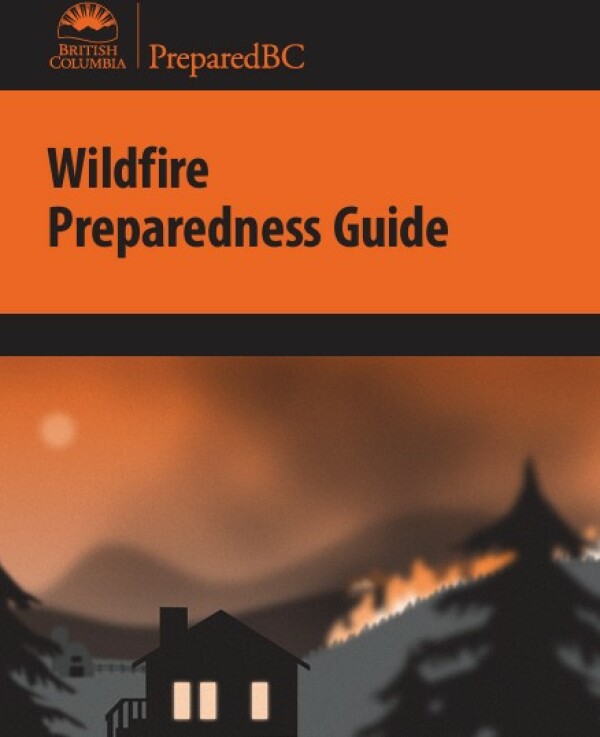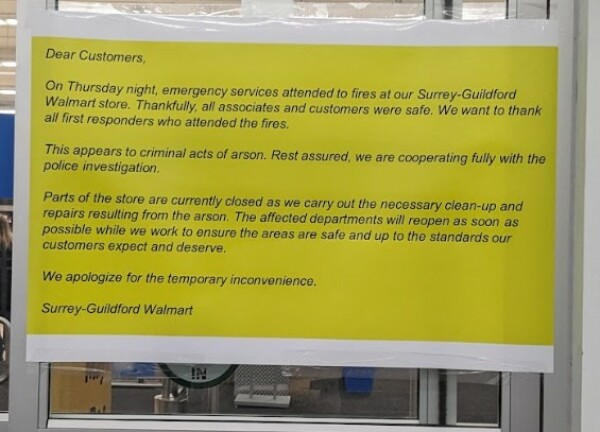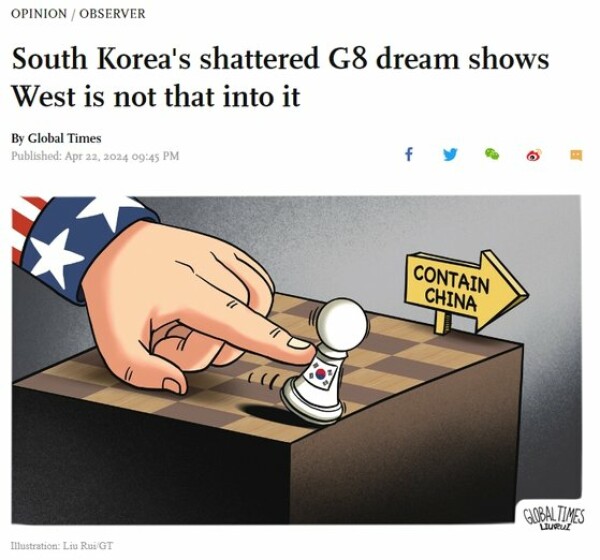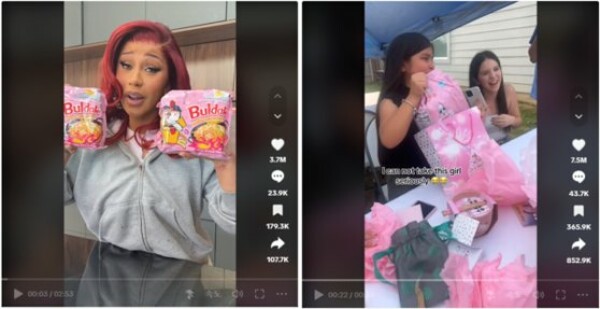문학 | [서쪽으로 난 창] 이화여대를 졸업하셨나요? (나는 Donna Runnalls입니다) (아홉번째이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지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6-24 08:10 조회1,85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박지향
박지향
내가 처음 그녀의 집을 찾아간 건 삼 년 전 가을이었다. 그녀는 베이지색 바지와 에메랄드 빛 얇은 스웨터위에 베이지색 니트 가디건을 바쳐 입고 있었다. 은발의 곱슬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겨 깔끔했다. 훤히 드러난 이마 밑으로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스웨터색깔에 비쳐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등은 휘었고 홀로 걷기엔 부담스러운 다리 근육으로 인해 워커의 도움없이 보행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정확하고 또렷한 발음은 물론, 티없이 맑고 깊은 눈동자는 늙고 병들어 스러져가는 노인이 아니었다. 소망을 하늘나라에 둔 순례자 혹은 득도한 선승의 눈빛이 저러하리라 생각했다.
리타이어먼트 홈 2층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들어서면 부엌과 거실이 있고 출입구 바로 옆에 작은 다용도실과 화장실, 그 옆에 아늑한 침실이 자리잡고 있다. 출입문과 마주보게 설계된 베란다는 안과 밖을 큰 통유리문으로 구분해 놓아 좁은 거실이지만 밝고 시원했다. 이십여권정도 꽂힌 작은 책장 하나와 철제 3단 서류 보관함 그리고 3인용 소파와 작은 식탁으로 정리된 깔끔하고 소박한 거실이었다. 꼭 필요한 것만 있는 집 자랑이나 허세가 될 장식품이나 유명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 기억하고 싶음 직한 학위나 졸업장 하나 걸려 있지 않았다. 청렴하고 고고한, 한 마리 백로 같은 그녀의 자태와 많이 닮아 있었다.
그런 소박한 거실벽에 걸린 그림 한점이 내 눈길을 끌었다. “비 온 뒤” 라는 타이틀이 붙은 작품으로 지금은 고인이 된 캐네디언 작가 로버트 젠에게 주문 제작한 60호 크기의 유화 작품이다. 자신의 어린시절 추억이 담겨있는 삼촌의 농장을 그린 것으로 군데 군데 크고 작은 물 웅덩이며 축축한 분위와 공기가 잘 표현된 수작이었다. 손가락으로 찌르면 금세 빗물이 후두둑 떨어져 내릴 것 같은 먹구름이 왼편 하늘에 나지막이 걸쳐 있는, 추수가 끝난 뒤 한가로운 농장 풍경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소유한 것 중 가장 값비싼 물건이다.
맥길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고 말년에 같은 대학에서 오랜 기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은퇴 후 고향인 밴쿠버로 돌아와 여동생이 살고 있는 리타이어먼트 홈에 입주했다. 1933년생이니 올해로 87세를 맞이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그녀의 이름은 도나 뤄널스 (Donna Runnalls )다.
6.25 전쟁 직후인 1956년부터 1959년까지 23세에 선교사로 들어간 뒤 3년동안 이화여대에서 영문학부 학생들을 지도했다. 대하 드라마 같은 할머니의 스토리는 반백 년도 훨씬 지난 일이건만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총천년색 필름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첫 에피소드로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황당했던 순간을 떠 올리며 한국에서의 잊지못할 추억을 맛깔 나게 꺼내 놓았다. 삼십여 명의 영문학부 학생들은 모두가 검정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로 차려 입고 있었다. 똑 같은 옷을 입은 것 까진 좋았다. 문제는 모두가 하나같이 똑 같이 생긴 얼굴이었다.
그러니 어떻게 가르치나 보다 어떻게 서른명의 학생들을 구별해야 하나 하는 것이 더 큰 고민이었다. 지금으로부터 64년 전, 한국 행 배를 타기전까지 동양인을 만나본 적도 없었던 그녀의 눈에 그렇게 비춰진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파란 눈의 캐네디언에겐 작은 눈과 코, 거기에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의 여학생들이 모두가 똑같아 보였을 것이다. 할머니는 당혹스러웠던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며 양손으로 무릎을 두드리고 목젖이 다 드러나도록 호탕하게 웃었다. 평소의 점잖고 근엄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자신의 이야기에 빠져든 그녀는 생기발랄한 이십 대 어린 여자로 되돌아가 있었다. 그날 밤, 한국인인 나 에게도 생소한 참혹했던 한국의 실상과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 풀어놓은 보따리속에서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교수이기 이전에 전도사 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었음도 무심코 꺼내는 에피소드 안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학비가 없어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배운다는 명분을 앞세워 학비를 지원해 주었다. 전후 시대상황이 말해주듯 그 시절 대한민국은 모든 생필품이 부족했다. 삼시 세끼 끼니를 걱정해 야하는 상황이다 보니 집집마다 하나쯤은 필요한 벽시계는 물론이요 손목시계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시계의 필요성을 느낀 그녀는 어떻게 든 시계를 구해 주어야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계선물을 위해 밀수꾼이 된 도나가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온 무용담을 들려줄 때는 옷소매까지 걷어 부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학을 이용해 홍콩을 다녀올 때의 일이었다. 여름인 데도 불구하고 밀수를 위해 소매가 긴 옷을 입었다. 양팔에는 손목시계를 찰 수 있는 만큼 많이 차고 세관을 통과했다. 나는 은근히 장난끼가 발동해서 그때 밀수에 성공하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를 했냐고 물었다. 그녀에겐 기억소환의 시간 같은 건 눈곱만큼도 필요치 않았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심중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크리스찬 다운 대답이 바로 돌아왔다. 그때만 해도 외국인, 그것도 백인 여자의 몸 수색은 거의 하지 않았던 때라 가능한 일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간 큰 밀수꾼이었는지, 밀수에 얼마나 큰 재능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너스레로 첫 만남의 어색함을 말끔히 씻어 주었다.
또 한번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상을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에 통역을 맡은 자신의 제자와 함께 방학을 이용해 부산에 있는 식기제작공장에 취직을 했다. 낮에는 그릇을 만들고 밤엔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가난하고 소외받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기를, 절망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찾아 내기를 기도했을 것이다.
최근에 내가 만난 외국인들 중 코리아와 케이 팝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부끄럽게도 평소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나에게 BTS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 사람도 이곳 리타이어먼트 홈 입주민중 한분이다. 지금이야 한국의 위상도 높아졌으며 먹거리 입을 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때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과 거지가 수두룩하던 때였다. 도나의 기억 속 한국은 폐허속에서 기아와 빈곤으로 허덕이던 희망이 보이지 않던 나라다.
뭐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물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로 얼굴과 온몸을 뒤덮은 상처를 한여름에도 긴 소매로 가린 채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그릇에 그림을 그리고 도장을 찍던 어린 아기 엄마의 얼굴이라고 했다. 퇴근후엔 지친 몸을 이끌고 젖 동냥을 다니던, 늘 말없던 그 여공의 아기에게 자신의 젖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결혼을 한적도 출산의 경험도 없었던 그녀에게서 젖이 나올 리가 없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더니 잠시 하던 말을 멈췄다.
그녀를 파송한 교단은 몇 년 더 한국에 머물러 주길 원했지만 학업을 끝내기 위해 캐나다로 돌아왔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선교활동에 관심이 높았던 그녀는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강단에 섰고 때로는 목숨을 건 선교활동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후회는 없다. 지금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은 독서를 하며 지낸다. 매일 오후2시가 되면 걸어서 이십여분 거리에 위치한 오래된 카페에 간다. 자신이 좋아하는 카페라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카페안의 사람들을 구경하다 돌아오는 것이 느린 일상속에서 갖는 작은 즐거움이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직접 운전해서 교회를 가는 것 외엔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 지금은 COVID 19으로 인해 그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주어진 현실에 잘 적응하고 계신다. 바램이 있다면 그 짧은 시간에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다는 한국, 세계속에 우뚝 선 한국 땅을 다시한번 밟아 보는 것이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는 일은 불가능한 꿈 인걸 나도 알고 그녀도 안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던 시절 내 조국의 헐벗은 땅에 하나님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썼던 아름다운 영혼의 그녀, 시애틀에서 배를 타고 23일만에 도착한 부산항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할머니에게 나는 뭐 라도 주고 싶었다. 며칠을 생각하다 다시 그녀를 방문했다. 60여년전 그녀의 제자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순간 할머니의 얼굴은 가을밤 달빛아래 피는 박꽃처럼 환하게 피어났다. 늦은 시각, 박꽃 같은 그녀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하늘에 낮게 걸린 초승달이 조용히 내 등을 떠다 밀었다.
PS: Dr. Donna Runnalls를 아시는 분은 중앙일보(info@joongang.ca)또는 (edit@joongang.ca)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움이 되어버린 제자들 중 단 한 분이라도 만 날수 있다면 그 분에겐 더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