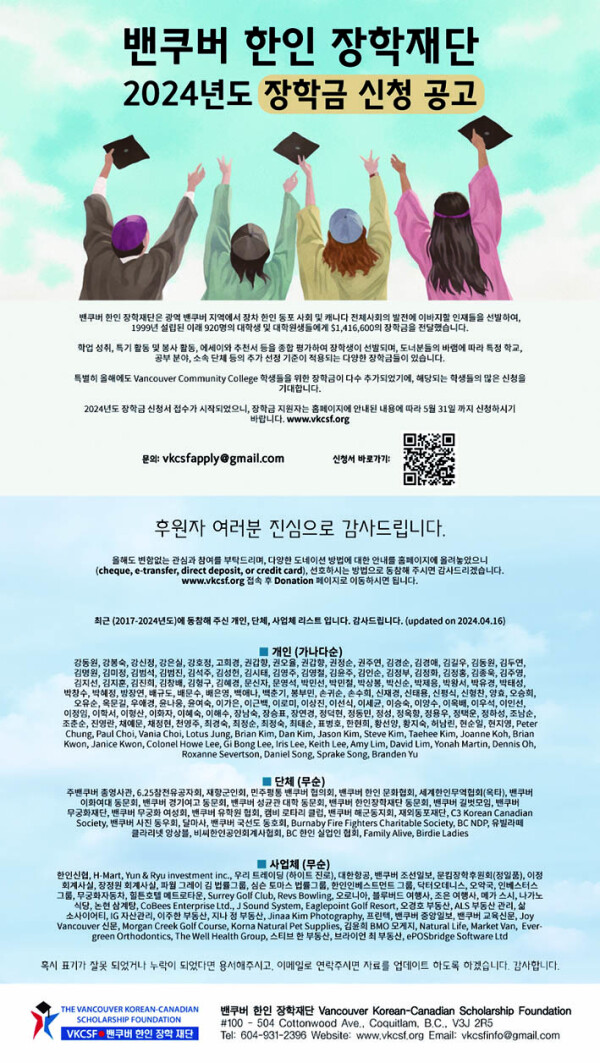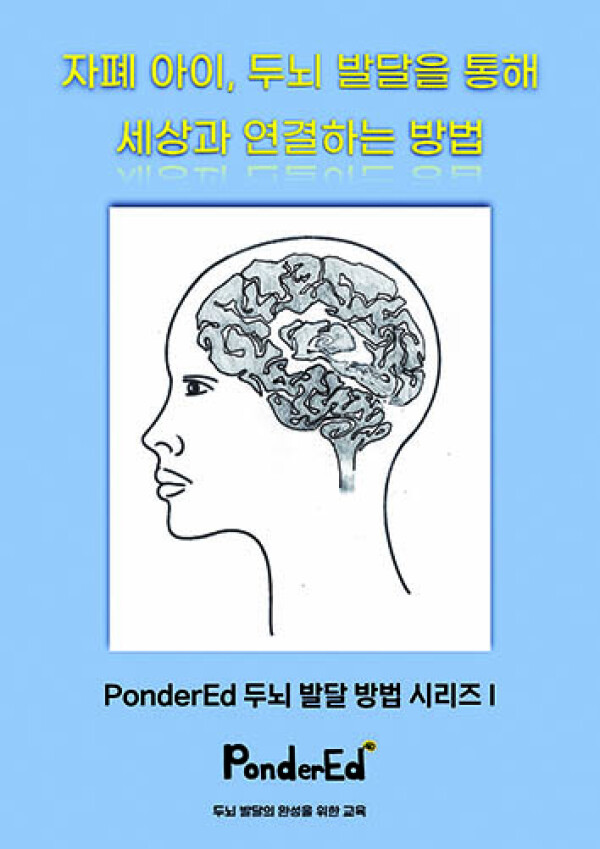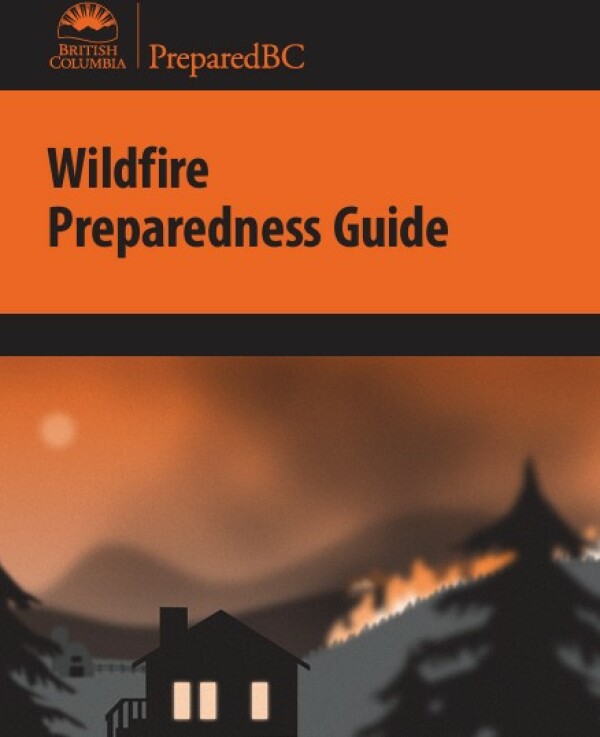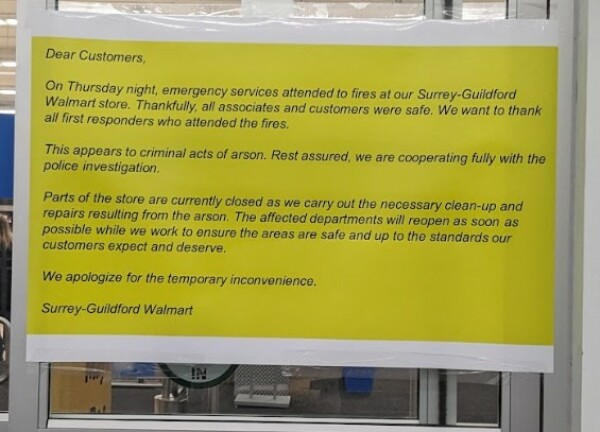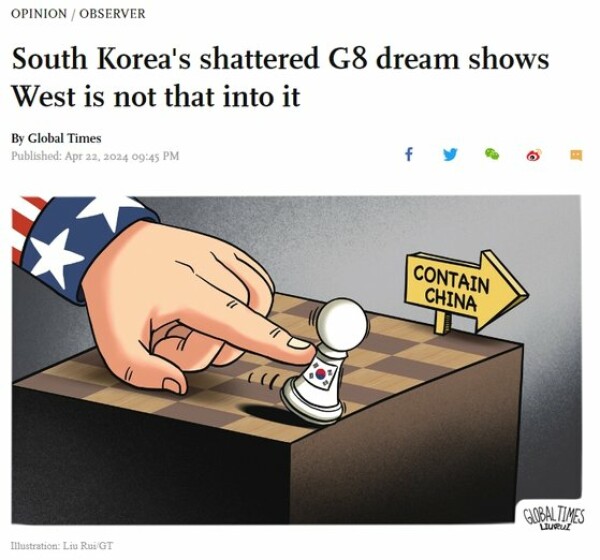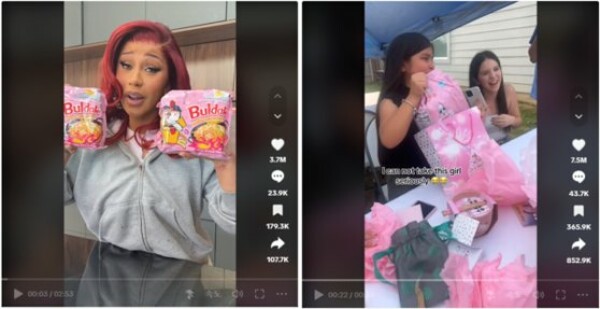문학 | [서쪽으로 난 창] 내게 남은 시간(스물한번째 이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지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2-07 16:25 조회1,275회 댓글2건관련링크
본문

박지향
비 내리는 새벽, 종소리를 들으며 눈을 뜬다. 보랏빛 종모양의 작은 꽃을 빗방울이 두드려 내는 소리다. 몇 해전 같이 작품 활동을 하던 이선옥 화백이 꽃향기가 좋다며 가져다주신 오동나무가 지난 봄 기다리던 꽃을 수백송이나 달아 놓은 것이다. 오동 꽃은 미니멀 라이프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넓어진 집안을 향기로운 소리로 채워 주었다. 바람이 드나드는 공간에 청아한 소리를 내는 종 하나만은 걸어 두고 싶었는데 그런 내 소망에 꽃이 핀 것이다.
내가 종소리를 소망하게 된 건 그리 멀지 않은 과거다. 이민의 레슨비를 톡톡이 치르고 있을 때 갱년기가 함께 찾아왔다. 짙은 안개속에 홀로선 듯한 그때 작은 딸 등에 업혀 유럽으로 날아갔다. 아무런 기대없이 도망치듯 떠났던 여행은 나에게 길을 일러주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 힘은 도시전체가 거대한 박물관 같던 파리에서 만난 여인 모나리자도, 화려함의 극치 베르사유 궁전도, 이탈리아의 맛난 음식과 웅장한 건축물도 아니었다. 미명의 새벽, 나를 깨우던 종소리였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 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하면서 울려 퍼지던 종소리는 내 깊은 상처와 고통을 만지는 님의 손길이요 숨결이었다.
그 종소리는 스위스 융프라우를 오르기 전 이틀을 묵었던 호텔 팩스몬타나에서 눈을 뜨던 새벽에 만났다. 호텔 앞쪽은 평화로운 알프의 전원이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뒤편은 녹음이 우거진 높다란 산봉우리가 마을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그 산 중턱에 자리한 하얀 회벽칠을 한 교회는 스무 명이나 들어갈까 싶은 아무런 장식도 없는 작고 소박한 건물이었다. 뾰족한 첨탑 끝에 십자가 하나만이 교회당이라 말할 뿐이었다. 서늘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뿜어져 나오던, 음계의 변화도 없이 댕 댕 울리던 종소리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닻을 내렸다.
종소리의 여운을 말하려면 이탈리아 출신 84세 로렌조 할아버지를 빼놓을 수 없다. 할아버지는 종지기 아들이었다. 소작농으로 어렵게 가계를 꾸려 나가던 로렌조의 아버지는 성당의 종지기를 자처해 40년 넘게 종을 치셨다. 우리 나라도 그러했지만 시계가 귀하던 옛날에는 이탈리아에서도 교회나 성당의 종소리가 시계를 대신하던 시절이었다.
로렌조 할아버지는 어려 서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과 양떼를 돌보았다. 아버지가 치는 새벽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 양떼를 몰고 산으로 들로 나갔고, 학교로 갔다.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양떼를 몰고 집으로 왔고 종소리에 맞춰 미사에 참석하기위해 서둘러 성당으로 달려갔다. 새벽부터 밤까지 종소리가 일러주는 대로 움직이는 단조로운 시골 생활이었지만 첫사랑 소녀를 만나는 기쁨으로 천국 같던 시절이었다. 그런 기쁨도 잠시, 온 세상이 그녀로 인해 빛나던 로렌조를 두고 소녀가 부잣집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서 천국의 날은 끝이 났다. 가난도 싫었고 자신의 이름 앞에 따라붙는 종지기 아들이란 수식어가 더 싫던 십대의 로렌조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큰 도시 피렌체로 달려 나갔다. 피렌체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수없이 떠돌며 방황한 끝에 정착한 곳이 바다건너 이곳 밴쿠버다.
돈이 되는 일이면 살인과 절도 외엔 다 했다. 할아버지 삶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고 금의환향해서 부모님 모시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다. 사랑 대신 돈을 선택한 그녀 앞에 돈으로 쌓은 성을 짓고 싶었지만 한달 한달이 버거웠던 젊은 로렌조는 성 쌓을 벽돌 한 장 굽지 못했다. 타고갈 금송아지가 없는 할아버지는 단 한번도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다. 늙으신 부모님은 돈자루가 없어도, 너덜거리는 신발을 신고라도 돌아와줄 아들을 위해 가장 고운 밀가루로 빵을 굽고 가장 멀리까지 날아가도록 종을 울리며 애타는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할아버지는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당신의 아픔을 나눠 가지겠다는 넉넉한 여자를 만나 자신을 꼭 닮은 아들 하나를 낳았다. 잘 생긴 이탈리안 의 피를 이어받은 덕에 깎아 만든 조각상 같은 아들과 푸근한 아내가 있는 이곳 밴쿠버가 제2의 고향이 되었다.
지난해 가을, 다녀가는 아들을 배웅하시던 할아버지와 마주쳤다. 허리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해진 할머니는 방에서 배웅을 하시고 할아버지는 언제나 주차장까지 따라 나와 배웅을 하신다. 아들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지 오래건만 사라져간 아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다. 조용히 다가가 할아버지 왼쪽 팔에 팔짱을 꼈다. 할아버지는 팔짱 낀 내 손을 다른 손으로 붙들고 잠시 걷자 하셨다. 쏟아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한과 사연이 많은 노인들은 흔들어 놓은 샴페인 병과 같다. 로렌조표 샴페인 병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 온 것을 직감한 나는 쏟아져 나올 샴페인을 받을 큼지막한 잔을 준비했다. 팔짱 낀 내 손을 잡은 할아버지의 손을 내 다른 손으로 붙잡고 84년 걸어오신 할아버지의 산책로에 발을 들여 놓았다.
할아버지는 첫사랑소녀, 부모님, 추억이 되어버린 고향의 종소리를 동화책 읽듯 조용조용 들려주셨다. 몇 달 사이 부쩍 야위어 지신 할아버지는 가난한 종지기 아들이 싫어서 떠나버린 종지기 아버지와 가난했지만 가족들을 배고프게 한적 없는 부지런한 어머니가 자꾸만 꿈으로 오신다고 하셨다. 저녁 6시가 되면 마지막 종을 치고 돌아오시던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 올리브유를 듬뿍 넣은 파스타와 통밀 빵을 굽던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십여 년 전 99세의 일기로 소천하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지가 있는 고향의 언덕이 “어제 본 듯 선명해” 하시던 할아버지의 눈빛이 가을 들녘에 누운 마른 풀처럼 처연했다.
할아버지의 산책로로 나를 초대하던 그날 저녁, 늙은 아버지가 된 로렌조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를 아들을 보내며 그 옛날 자신을 떠나보내던 아버지의 마음을 더듬고 계셨다. 마을에 아기가 태어날 때,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을 때도 로렌조의 아버지는 밧줄을 당겨 온 마을 구석 구석까지 종소리를 날려 보냈다. 그 경건하고 아름다운 일을 부끄러워했던 철부지의 참회가 뜻은 몰라도 내 가슴에 큼지막한 파문을 일으키고 마는 이태리어로 흘러나왔다. 심령으로부터 길어 올린 참회는 모국어가 아니고는 표현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통곡 같은 것이니….
몇 주 전이었다. 기온이 뚝 떨어진 새벽 “내게 남은 시간이 많은 줄 알았어” 하시던 할아버지가 산책길에 쓰러지신 뒤 병원으로 후송되어 가셨다. 사흘째 되던 날, 한 많은 이 생에 이별을 고하고 머나 먼 길을 떠나가셨다. 고단한 육신을 벗고 한 마리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 가신 것이다. 그렇게 육신을 떠나보낸 할아버지는 네모난 액자속에 앉아 미소를 짓고, 남은 시간이 많은 줄 아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꽃을 가져다 놓았다. 그 사람들 속에 나도 서 있었다.
댓글목록
한힘님의 댓글
한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박시인의 글을 읽으면 가슴에 절절하게 다가오는 울림이 있다.
그도 가슴이 울렸을 때 글을 쓰기 때문일 것이다.
서쪽으로 난 창문이 닫히지 말았으면 한다.
향포님의 댓글
향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묻어버리고 싶은 사연,
털어야하는 아픔까지 아낌없이 꺼내 주신 노인들의 귀한 마음과
백년이라는 세월의 두께가 주는 울림이겠지요.
긴 글 읽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