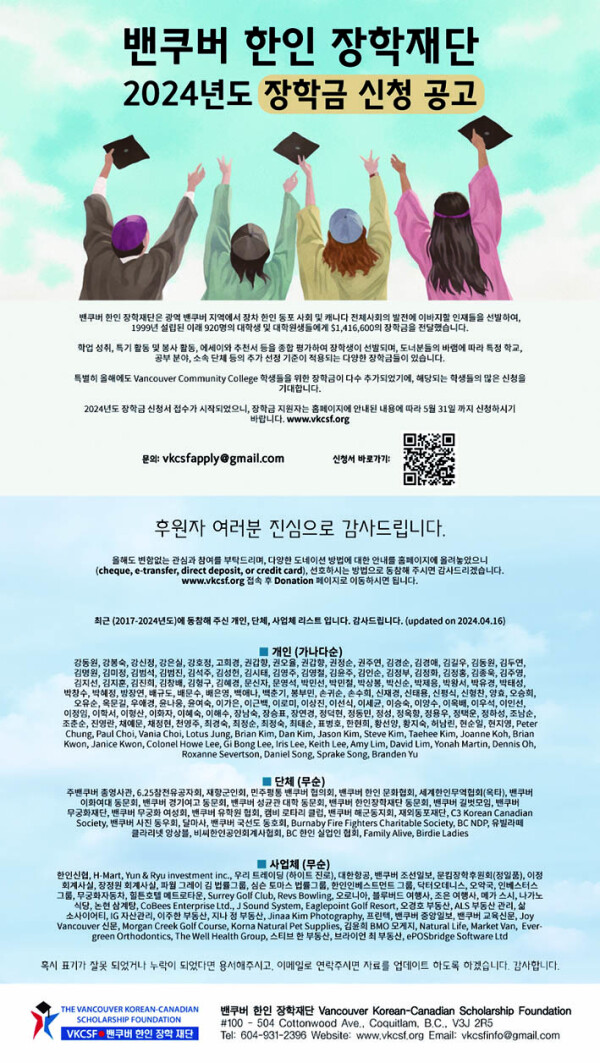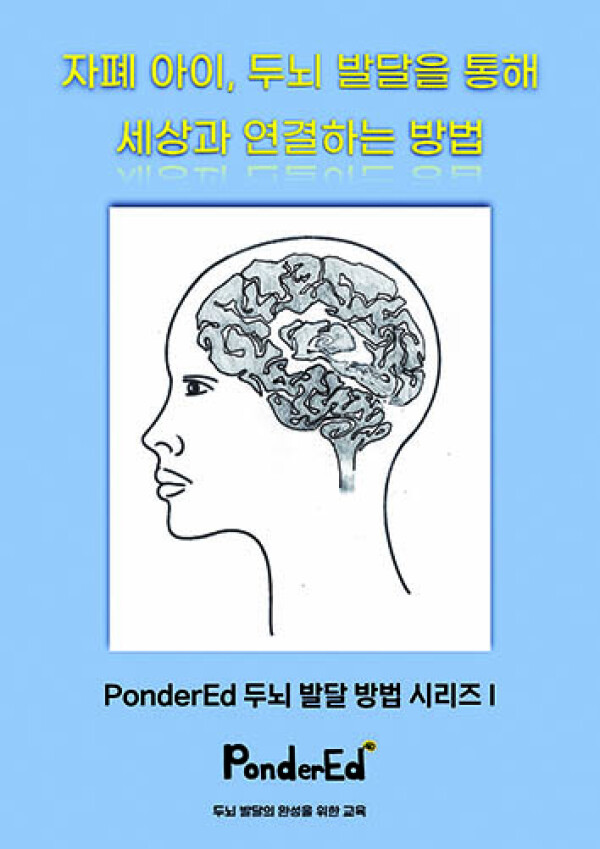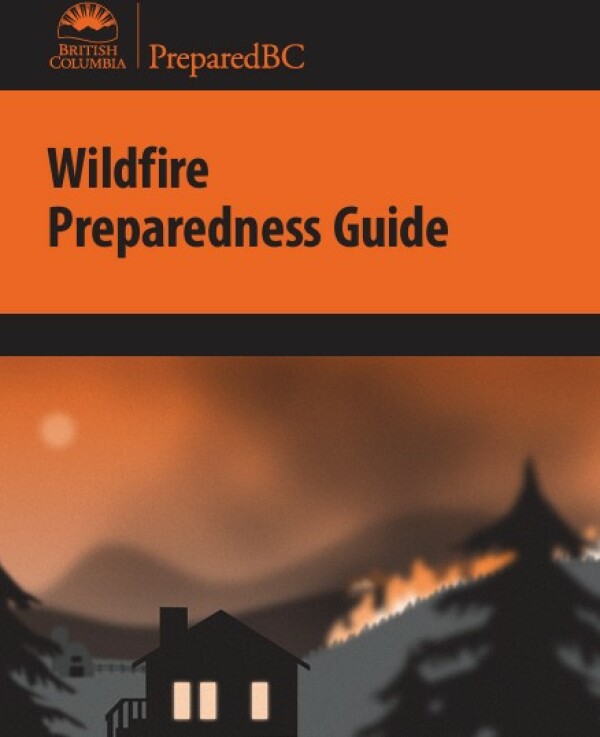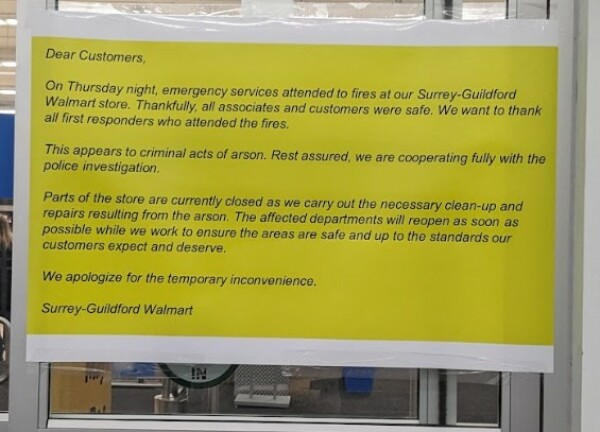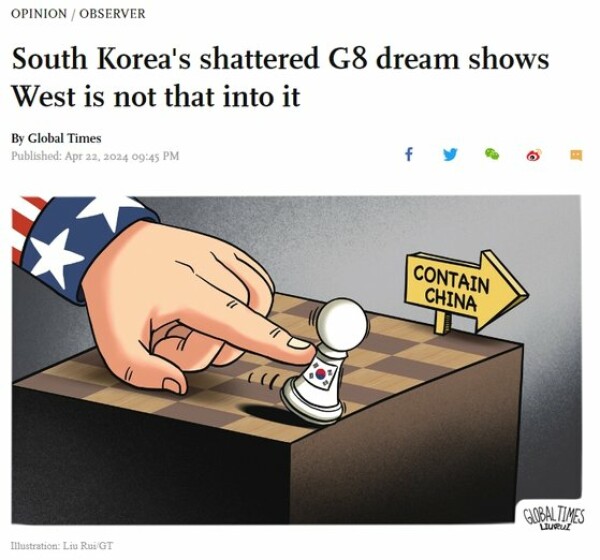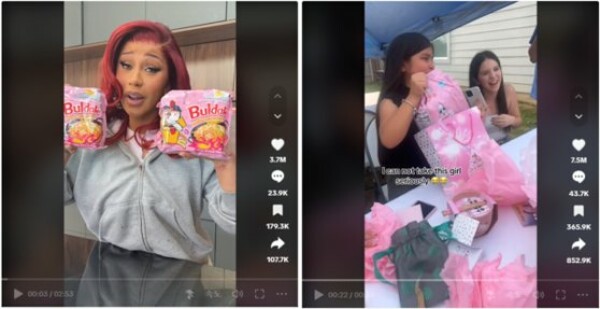문학 | [서쪽으로 난 창] 7년만의 외출 (스물다섯번째 이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지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05 09:23 조회2,49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박지향
공주님이 나타나셨다. 소매와 목부분을 레이스로 장식한 흰색 블라우스에 하늘색 긴 치마를 입은 공주님이 천천히 다이닝룸을 향해 걸어오셨다. 온 몸을 남편에게 의지한 공주님은 수많은 입주민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 속으로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한걸음 씩 옮겨 놓았다. 남편의 가슴에 기댄 머리와 손은 물론이요 초점 잃은 검은 눈동자까지 파르르 떨고 있었다. 7년만의 외출이니 그럴 만도 했다.
호칭만 공주인 공주님 부부는 7년전 이곳 리타이어먼트 홈에 입주하셨다. 남편이신 88세 존 할아버지가 수행원이자 집사요 비서가 되어 80세가 된 아내 엘사를 공주님처럼 받들고 사신다. 대인기피증이 심각한 할머니는 꼭 가야할 병원진료시만 빼고 음악회나 생일파티,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행사에 한 번도 참석을 하신 적이 없다. 식사도 방에서 할아버지가 가져다주신 걸로 해결하신다. 할아버지도 점심은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드시고 저녁은 친구분들과 다이닝룸에서 드신다. 시장보기 우편물 가져오기 할머니 식사 배달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두 분의 필요를 할아버지손으로 해결하신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공주 님이다.
맨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부부는 안보는 척 곁눈으로 지켜보는 수많은 시선속에서 저녁 식사를 시작하셨다. 하루 24시간을 아내의 손과 발로 사는 할아버지는 흥분된 얼굴로 가냘픈 할머니의 왼손을 꼭 붙들고 앉아 할머니의 식사를 도우셨다. 스프에 후추를 뿌려주고 홍차에 꿀을 넣고 저어 주셨다. 너무 오랜만에 사람들 속에 앉아 먹는 밥이 편할 리 없는 할머니 입가에 크림 스프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불안감에 수치심까지 느끼시는 지 할아버지 팔을 당기며 집으로 가자고 울먹이셨다. 흘러내린 스프를 닦아주며 까짓 스프 좀 묻어도 괜찮다고 다들 묻히고 흘리면서 먹는다며 다독이셨다. 아무런 각오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나들며 방문을 여는 일, 그 작은 일에 크나큰 용기가 필요했을 할머니의 외출은 메인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끝이 나고 말았다.
젊은 시절 엘사는 용감하고 씩씩한 가장이었다. 결혼 후 쉴 틈없이 돌아가던 할아버지의 카페가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대기업의 등살에 밀려 문을 닫고 빚까지 떠안게 되었을 때의 일이다. 할아버지는 야간 경비일을 시작하셨다. 밤잠을 포기하고 받아 든 월급은 아내와 네 명의 아들 그리고 장모까지 부양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가장이라는 무게에 짓눌린 탓일까?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도박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도박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술과 담배가 따라왔고 늘 잠이 부족했다. 할아버지는 신장과 간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밤낮없이 카지노에 드나들며 주머니와 건강은 물론 영혼까지 모두 털리고 말았다. “눈떠 보니 응급실이었 어” 하셨다.
가장의 바톤을 이어받은 엘사는 커다란 앞치마를 두르고 두 팔을 걷어 부쳤다. 닦아도 닦아도 끝없이 쌓이는 식당의 접시는 세 아이들의 밥이 되고 남편의 약값이 되었다. 닦고 또 닦아도 접시 닦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각종 세금에 쌓여가는 카드 빚은 할아버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까지 먹어 치우고 말았다.
다행히 마흔을 넘기면서 건강을 회복하신 할아버지는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셨고 평범함이 주는 눈물 나도록 행복한 삶을 되 찾으셨다. 세명의 아이들은 독립해서 나갔고 두 분이 오손도손 재미나게 살기만 하면 되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두 분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이 나는 이야기였으면 좋으련만 이번엔 할머니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면 평소에 하지 않던 욕설에 물건을 집어 던지며 쌓인 감정을 쏟아 놓으셨다. 아침이면 기억도 못하는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쌓이고 억눌린 감정을 해소할 틈이나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닐까?
캐네디언인줄 알았던 할머니 엘사는 알고 보니 페르시안이었다. 열 한 살이던 해에 여섯 살이던 여동생과 함께 엄마의 손을 잡고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자유와 행복을 찾아 도망쳐 나왔다. 1935년에 국호를 이란으로 지정하면서 우리가 이란이라고 부르는 페르시아는 주변 열강의 침략과 간섭에 국가도 국민도 만신창이가 된 고통과 슬픔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그녀가 기억하는 페르시아는 등뒤를 따라오던 군인들의 따발총 소리와 발자국소리, 멈추라고 소리치는 자와 도망치는 자들의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전부다. 다 부서져가는 난민선을 타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 도착한 캐나다는 그야말로 천국이었다. 군인들의 발소리나 총소리가 없는 평화의 땅, 천사들이 사는 나라였다.
사선을 넘어 천당 옆 구백 구십 구당이라는 밴쿠버에 도착했지만 가진 거라고는 입은 옷이 전부였던 엘사의 가족에겐 또다시 넘어야 할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언어의 장벽도 넘어야 했고 ‘백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도 넘어야했다.
엘사의 가족이 넘은 하얀 벽은 나도 넘었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벽을 넘기 위해 숨 고르기를 하고 있을 편견의 벽이고 차별의 벽이다.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 마이클 오어에게도 벽이 있었다. 흑인인 마이클은 어린시절을 약물 중독자였던 어머니와 헤어진 후 여러 가정을 떠돌며 하룻밤 비 피할 곳을 찾아야하는 암울한 시간을 보냈다. 그가 대학을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보기 드문 거대한 체구의 마이클도 백인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몇 줄 글 안에 담는다. “눈에 보이는 건 모두 하얀색이다 하얀 벽과 바닥 하얀 피부의 사람들, 모두가 하얀 벽이다.”라고 쓴 마이클의 글을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교사 보스웰은 다른 동료교사들의 멸시와 비아냥에 동조하지 않고 그에게 맞는 지도법을 제시하고 이끌어 줌으로써 참교육자의 윤리와 태도를 보여준다.
엘사에게도 그런 스승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존의 아버지 대니얼이었다. 대니얼은 난민이었던 엘사의 가족에게 자신의 지하실을 내어주고 영어를 가르치고 직업을 찾아주었다. 형제자매가 없던 존 또한 어린 엘사와 엘사의 동생을 친 동생처럼 챙기고 보살펴 주었다.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던 엘사와 존이 결혼을 하면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태어나고 자란 제나라 제 땅에서의 삶도 녹록치 않은 게 인생이다. 하물며 낯설고 물 선 타국에서의 삶이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건너야 할 강도 뛰어 넘어야할 벽도 많은 곳이 이민지의 삶이다. 이제는 끝났겠 거니 하는 순간 별책 부록처럼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종착역으로 가는 길 위에 올라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익숙해진 낯선 땅...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는 화려한 입담이나 극적인 장면, 스펙타클한 컴퓨터 그래픽 한 장 없이 잔잔하게 그려냈지만 오래도록 남는 감동과 큼지막한 질문을 던지는 수작이다. 많은 이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가족과 자신의 침대조차 가져 본적 없는 마이클에게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제공하면서 가족이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뻔한 스토리다. 그렇지만 ‘뻔한 헐리우드 영화’ 라 하지 않는 이유는 참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양심을 두드리게 하는 힘 때문일 것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하룻밤 잠자리가 필요했던 마이클의 인생만 바뀐 것이 아니라 리 앤과 그녀의 가족 또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가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영화다.
영화제목 “블라인드 사이드”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도 보지 못하는‘사각지대’를 말한다. 내가 운전대를 잡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곳이 바로 사각지대다. 요즘이야 첨단기술의 발달로 사각에 들어온 차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소리로 깜박이로 알려주는 센서 덕에 차선이나 방향을 바꿀 때 옆 차나 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가고자 하는 길을 갈수 있다. 이렇게 당연한 현대 기술력의 수혜를 생각하다가 센서가 돋아나기 시작한 내 가슴을 꾹꾹 눌러 보았다. ‘왼쪽을 보시오, 굶주린 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오, 부축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되 돌아 가시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죽어가는 개구리는 없는지...’
나는 사각의 성에 갇힌 공주 엘사, 아무도 돌아봐 준 적 없고 물어봐 준 적 없는 그녀 엘사의 고통을 가만 가만 더듬어 보았다. 내가 겪지 않은 총부리의 기억, 보이지 않는 하얀 벽을 넘어 본 적 없는 이들이 조롱 섞어 만든 수식어 공주님, 나는 얼른 ‘공주님’은 내려놓고 ‘친애하는 엘사에게’ 몇 줄 편지를 쓴다.
“모퉁이를 돌아온 바람이 순한 2월입니다. 연둣빛 꽃대를 한 뼘이나 밀어 올린 수선화 옆엔 겨우내 빛깔을 지켜낸 초록빛 담쟁이가 그 조그만 손을 뻗어 수직의 벽을 오르고 있네요. 서로의 손을 잡고 오르는 담쟁이를 바라보다가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는 도종환의 시를 읊조려 봅니다.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썼다는 시 “담쟁이” 여럿이 손잡고 천천히 오르다 보면 절망까지도 다 푸르게 덮을 수 있다 하기에 초록빛 담쟁이 잎 하나 동봉합니다. 당신의 손끝에도 푸르른 이파리가 돋아 나기를 기도하면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