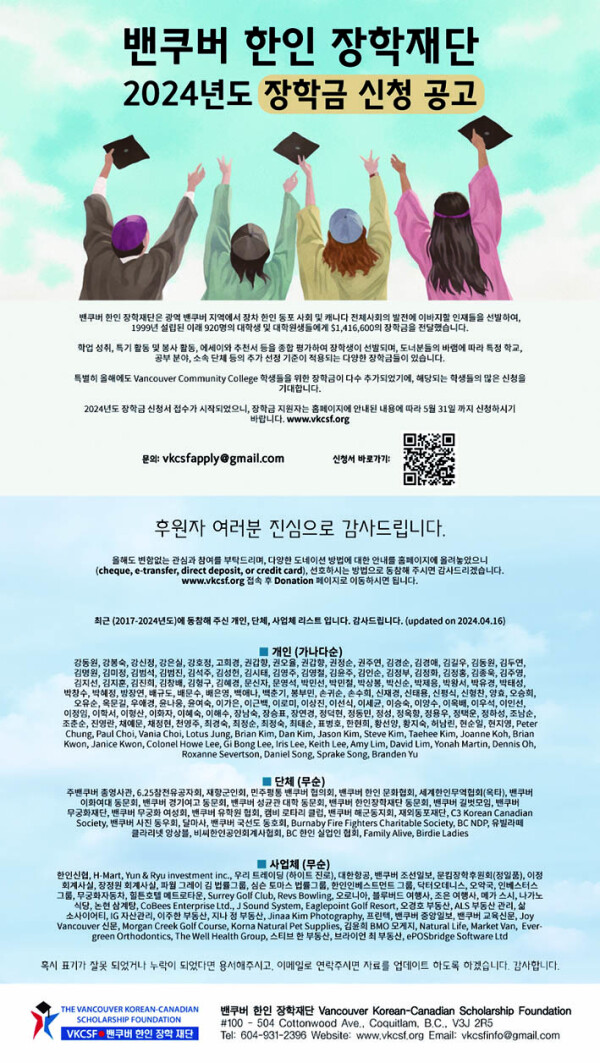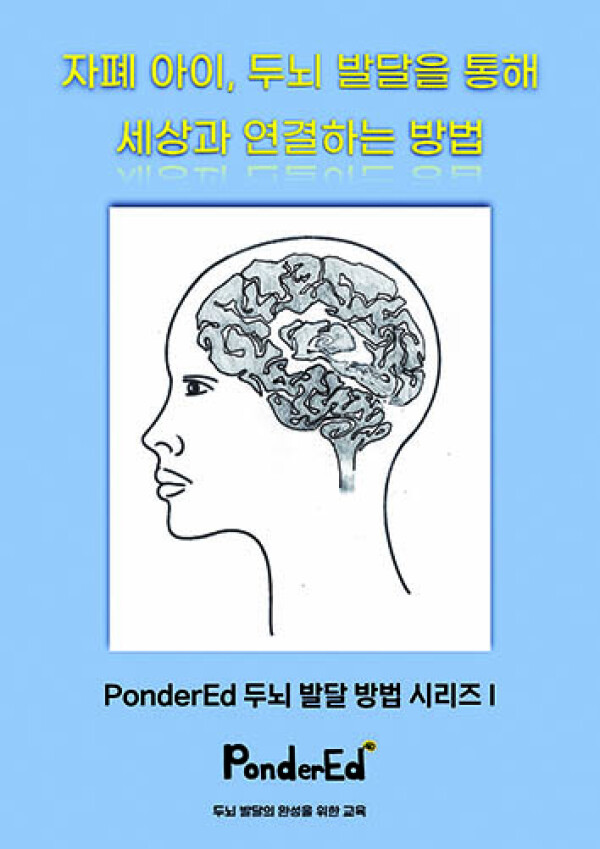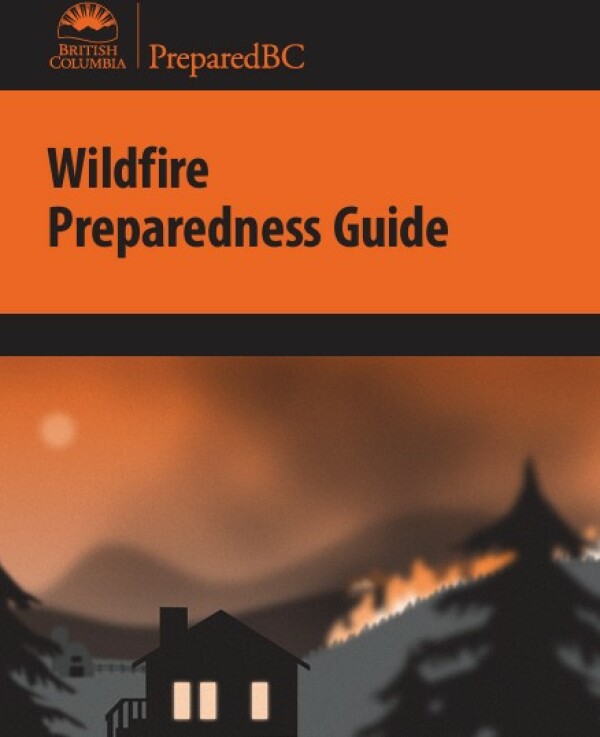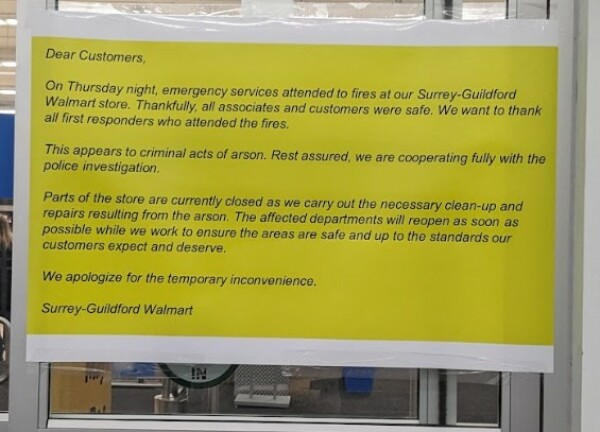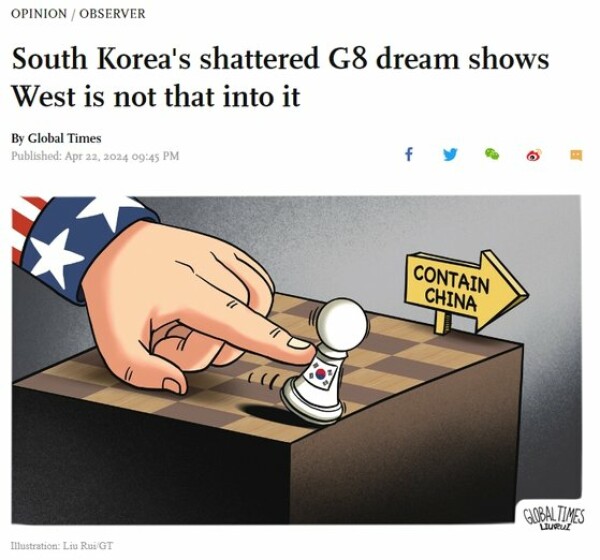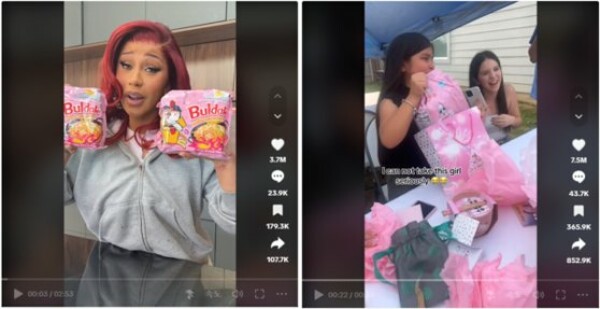문학 | [서쪽으로 난 창] 감자꽃 당신(스물여섯번째 이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지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18 09:52 조회1,361회 댓글2건관련링크
본문

박지향
지난해 오월, 휴식 시간이었다. 여느 때 같으면 남은 오후를 신나게 해줄 커피와 달콤한 쿠키를 집어 들었을 텐데 그날은 그 달달한 유혹을 뿌리치고 도서실로 달려갔다. 도서실 앞 테이블 위에 평소에는 없던 연보라 빛 앙증맞은 꽃이 유리컵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선가 본 듯한, 도대체 모르겠는 꽃, 다시가서 자세히 보니 색깔만 다를 뿐, 몇년 전 미 서부 아이다호 주에서 보았던 감자꽃과 모양이 똑 같았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감자 밭이던 그곳, 하늘에 가 닿은 지평선 끝까지 감자밭 밖에 안보이던 그곳에서 보았던 꽃, 색깔만 다를 뿐 다섯장의 꽃잎이 별모양으로 펼쳐진 중앙에 노란 수술이 도드라져 나온 것이 감자꽃이 분명했다.
이리보고 저리 보며 “도대체 누가 감자꽃을 가져다 꽂을 생각을 했지?” 하는데, 도서실에서 나오신 사이먼 할아버지께서 “오호라! 네가 꽃을 아는 구만” 하셨다. “감자 꽃이죠? 흰색은 본적이 있는데 보라색은 처음 봐요 참 예쁘네요” 했다. 할아버지는 코에 걸고 있던 돋보기와 성경책을 내려 놓으시며 “그렇지? 내 마누라가 좋아하던 꽃이야” 하시며 테이블 위에 떨어진 노오란 꽃가루를 손으로 쓱 닦아 내셨다.
할아버지의 아내 루시는 감자생산지로 유명한 미 서부 아이다호 주에서 감자 농장을 하던 대농의 딸이었다. 그녀는 18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었다. 부자에다 잘 생긴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년도 안 되 여러 명의 여자를 번갈아 가며 집으로 데려왔고 번갈아 가며 찾아온 여자들 틈에서 새우처럼 등이 터져가던 루시는 아버지를 떠나 솔트레이크 시티로 갔다. 웨이트리스를 하며 어렵게 살아가던 그때 미남에 성실한 사이먼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언제나 책을 끼고 살던 조용한 성격의 루시는 연애시절에도 그러했지만 결혼 후에도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 하는 봄 햇살처럼 너그러운 여자였다. 해도 해도 끝없는 일, 표시도 안 나고 재미도 성취감도 없는 일일때가 많은 집안 일도 언제나 신나고 즐겁게 했다. 남편이 직장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섯 아이들의 교육문제, 각종 세금 내는 일에 청소 빨래 잔디 깎는 일까지 집안 모든 일을 “불평 불만 없이 묵묵히 해내는 가족밖에 모르는 천사 같은 아내였어" 하셨다. “불평불만 없는 천사”라는 대목이 가시처럼 내 목구멍에 걸려 메모하던 펜을 잠시 내려 놓았다. 할아버지도 하시던 말씀을 멈추고 내려놓은 내 펜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배려하고 지지해 주던, 천사아내는 10여년전 감자꽃이 피기 시작한 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렸다. 아내가 떠나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일을 이어받아 감자농사를 시작하셨다. 루시는 아버지가 미워서 고향을 떠나왔지만 태어날 때부터 먹고 보고 자란 감자와 감자꽃을 좋아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하던 것처럼 감자꽃이 피면 꽃을 꺾어 집안 곳곳에 꽂아 두셨다. 그렇게 아내가 하던 대로 할아버지는 봄이 되면 아름드리 커다란 화분에 감자를 심으신다. 입주하실 때 가지고 오신 붉은색 커다란 테라코타 화분은 구석 구석 아내의 손때가 묻은 아내의 유품이다. 2월이면 감자를 심고 5,6월이 되어 감자꽃이 피면 꽃을 꺾어 식탁위에도 꽂고 침대 옆에도 꽂아 두신다. 해마다 봄이면 피어나는 아내를 닮은 감자꽃, 그 중 한송이를 도서실 앞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신 거였다.
오래도록 곁에 두고 할머니 보듯 보고싶을 꽃을 왜 꺾어 다 놓았을까 생각하다가 이유를 물었다. “감자꽃을 알아본 네가 그걸 모른 단 말이야? 감자가 굵어지려면 꽃을 따 줘야해” 하셨다. 감자알을 키우기 위해 꽃을 딴다는 말을 들으며 손마디가 툭툭 붉어져 나온 할아버지는 농부였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나의 확신이 확실히 빗나갔다는 건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보고 알았다. 젊은 사이먼이 흰색 반팔 티셔츠에 안전모를 눌러쓰고 여러가지 공구가 달려있는 넓적한 벨트를 허리에 차고 있었다. 한 손에는 커피잔을 다른 한쪽 손은 수줍게 미소 짓는 여인의 어깨를 감싸 안고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할아버지는 스무 살이던 69년전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오신 이민자였다. 무일푼으로 도착한 뉴욕에서 밤에는 수없이 많은 닭의 털을 뽑고 낮에는 공사장 인부로 일을 하셨지만 힘들게 일을 하고도 한달 한달이 버거웠다. 목수일이 보수가 좋다는 정보를 듣고 손재주가 좋았던 할아버지는 목수일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면서 실력이 늘고 재미가 있었다. 자신감이 생긴 할아버지는 같이 이민선에 올랐던 친구를 따라 스키 리조트 건설 붐이 일고 있던 유타 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가셨다. 도착하자 마자 와사치 산맥에 있는 스키 리조트 건설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목수일을 자신도 놀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은행잔고가 쌓여가는 기쁨에 힘든 줄도 모르고 톱질에 망치질을 하셨다.
1950년대와 60년대 유타 주는 관광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발전하던 시기였기에 일거리가 널려 있었다. 리조트 건설현장에 나가지 않는 날은 목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사업장으로 달려가 울타리를 세우고 지붕을 고치며 받은 돈이 월급보다 더 많던 달도 있었다. “하루도 안 쉬고 일하셨어요?” 하자 “세상에서 중독성이 제일 강한 게 뭔 줄 알아?” 하셨다. 속으로 “마약인가?” 하는데 내 속말이 끝나기도 전에 “돈! 돈보다 더 중독성 강한 놈은 없어” 하셨다. 가난때문에 아버지를 잃었고 가난때문에 조국을 떠나 오신 할아버지는 돈 버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장남이었던 할아버지는 수입의 절반을 고국으로 보내고 절반의 절반을 떼어 저축을 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숙식을 해결했다. 결핵을 앓으시던 아버지는 사이먼의 나이 13살에 약 한번 제대로 못 드시고 돌아가셨다. 혼자가 된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하고 닭을 키우며 동생 셋을 데리고 어려운 살림을 해 나가고 계셨기에 어머니께 돌아갈 날을 고대하며 부지런히 일하고 알뜰히 저축했다.
고된 일상이었지만 쌓여가는 은행 잔고를 바라보며 힘이 나던 1964년 봄, 고국에서 날아든 전보를 받은 사이먼은 서둘러 고향으로 달려갔다. 고향에 도착했을 땐 자신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은 나아졌지만 평소 기침을 달고 사시던 어머니는 폐렴으로 돌아가신 뒤였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미국으로 돌아온 사이먼은 자신의 품에서 수줍게 웃던 여인 루시와 결혼을 했다. 고국의 동생들도 모두다 자라 결혼을 해서 각자의 삶을 살았고 많지 않아도 벌어 놓은 돈도 있었고 벌이도 좋아 주말에 쉬어 가며 일을 해도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쉼없이 일을 했다. 루시는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검소하게 생활하고 알뜰히 저축하며 살았다. 유명 브랜드 옷이나 예쁜 구두 한 켤레 없어도 투정하지 않던 아내의 단 한가지 바램은 온가족이 다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는 것이었다. 심각한 돈 중독 이던 할아버지는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하며 아내의 바램을 먼 후일로 미루었다.
솜씨 좋고 정직하기로 소문난 목수이다 보니 할아버지께 일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일한 만큼 돈이 들어왔다. 할아버지에게 있어 시간은 곧 돈이었다.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 하루 두 끼는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그것도 운전을 하면서 먹었고 콜라 사는 것도 아까워서 수돗물을 받아 마시며 돈을 모았다. 유타에서 시애틀로 시애틀에서 밴쿠버로 돈을 쫓아다니는 동안 다섯명의 아이들은 모두 자라 독립해 나가고 꽃 같던 아내는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몇 년만 더 벌고 일을 그만둬 야지 “하고 있었는데 말없이 자신의 옆을 지키던 아내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렸다. 위암이었다. 그것도 stage 4, 말기라 했다. 두터워지는 은행잔고는 챙겨 보면서 타 들어가던 아내의 속앓이는 보지못한 할아버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울었다. 자신 속 어디에 그런 소리가 숨어있었는지 괴성을 지르며 짐승처럼 울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평소에 “하나님이 어딨어, 나를 구한 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야" 하시던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소리쳐 불렀다. 계시다면 증명해 보라고, 나에게 죄가 있다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 내 아내를 살려내라며 따지고 애원하고 울부짖어 기도했다.
돈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에서 아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나자 스프 한 그릇 제대로 못 드시던 할머니는 식사량이 늘고 조금씩 건강을 되찾으셨다. 매일같이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 쥬스를 만들고 요리를 했다. 아내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 틈틈이 암 관련 책을 보며 공부하고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반 의사가 되어있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간호와 사랑을 받으며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던 할머니는 4년을 더 살다가 65세에 호흡을 멈추셨다. 암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느라 병원과 집을 오가는 일이 살아있는 날의 전부였고 늘 병상에 누워지낸 세월이었지만 할머니는 “내 생애 가장 행복한 4년이었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품에서 눈을 감으셨다.
할머니가 돌아 가시자 미국 캐나다 칠레로 흩어져 살던 자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들었다. 온가족이 모여 여행을 떠나는 대신 어머니 가슴팍으로 꽃을 던지고 흙을 뿌리며 아버지를 원망했다. 병상에 누워서도 봄이면 감자를 심으시던 할머니는 알 감자 같은 아들넷과 딸 하나, 손자와 손녀까지 21명의 자손을 남기고 감자 꽃처럼 살다 가셨다.
할아버지는 부지런히 벌어 아이들 차도 사주고 손주가 생기면 손주들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싶었다. 아내와 단둘이 여행하며 아내가 좋아하던 아이스크림도 먹고 자신의 고국 네덜란드의 튤립도 고흐의 생가도 보여주고 싶었다. 살아온 이야기 살아갈 이야기를 나누며 보낼 행복한 노후를 꿈꾸었건만 아이들도 아내도 할아버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몰라도 너무 몰랐어" 하시는 할아버지와의 긴긴 대화를 끝내고 일어나려는 데 “넌 나처럼 살지 마" 하셨다. 그러고는 검지 손가락으로 당신의 주름진 얼굴을 가리키며 “금세 이렇게 되"하시며 알 감자 두 알을 손에 쥐어 주셨다. 할아버지는 가족여행은 물론 한 번도 아내와 단둘만의 여행을 가본적이 없으셨다. ‘나중에’ 쓸 돈을 모으느라 운전대를 잡고 햄버거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보내 버린 누리지도 못한 젊음과 사랑했던 아내와 자식 모두를 잃었다.
다행히 아내가 암선고를 받고 부터 같이 살게 된 속 깊은 막내딸은 아버지를 헤아리고 위로하며 6년을 함께 살았고 지금도 지척에 살고 있다.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딸은 아내가 떠난 다음해에 예쁘고 건강한 딸을 낳았다. 태어난 손녀의 이름은 아내의 이름을 따서 루시라 지었다. 할아버지는 매일처럼 할머니 묘지를 찾아가셨는데 3년 전까지 만해도 딸 집에 들러 손녀 루시를 데리고 가시곤 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없게 되신 후로는 세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버스를 타고 혼자 가신다.
오늘도 할아버지는 아내를 만나러 가실 텐데 뚝 떨어진 기온은 올라갈 줄 모르고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댄다. 년초에 한국은 계속되는 폭설과 한파로 빙판이 된 도로와 끊긴 버스로 퇴근길에 발이 묶인 시민들의 모습이 유튜브를 타고 줄줄이 올라왔었다. 기상청에선 폭설을 예고하고 주의를 당부했지만 설마 하는 사이 도로가 막히고 버스가 끊어져 버린 것이라 했다. 겨우내 따뜻했던 밴쿠버도 2월 중순으로 접어든 지금 다시 찾아온 겨울이 꺼내기 시작한 새싹도, 꽃봉오리를 내밀던 프리뮬라도 모두 꽁꽁 얼어 붙이고 말았다. 주말엔 눈까지 온다 하니 나도 더 늦기 전에 길을 나서야 겠다. 밤은 깊어 새벽이 밝아오지만 지금 출발하면 해 뜰 때쯤 엔 언니집에 도착할 것이다. 만약 폭설이라도 내리면 길은 끊어지고 말 터이니...
댓글목록
한힘님의 댓글
한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사연 없는 삶이 있으련만 노인들만 모여 있다보니 길고 긴 인생길 위에서 갖가지 사연들이 필자의 녹익은 필치로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 노인들의 이야기도 적게 될 날을 기대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잘 읽고 있습니다.
향포님의 댓글
향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 분들의 귀한 사연을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 주실 분이 계신다면
하얀 종이 위에 정갈하게 깎은 연필로 꼭꼭 눌러 써 보겠습니다.
오늘도 허접한 문장을 정성껏 읽어주시는 덕분에 또 한편의 글을 써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