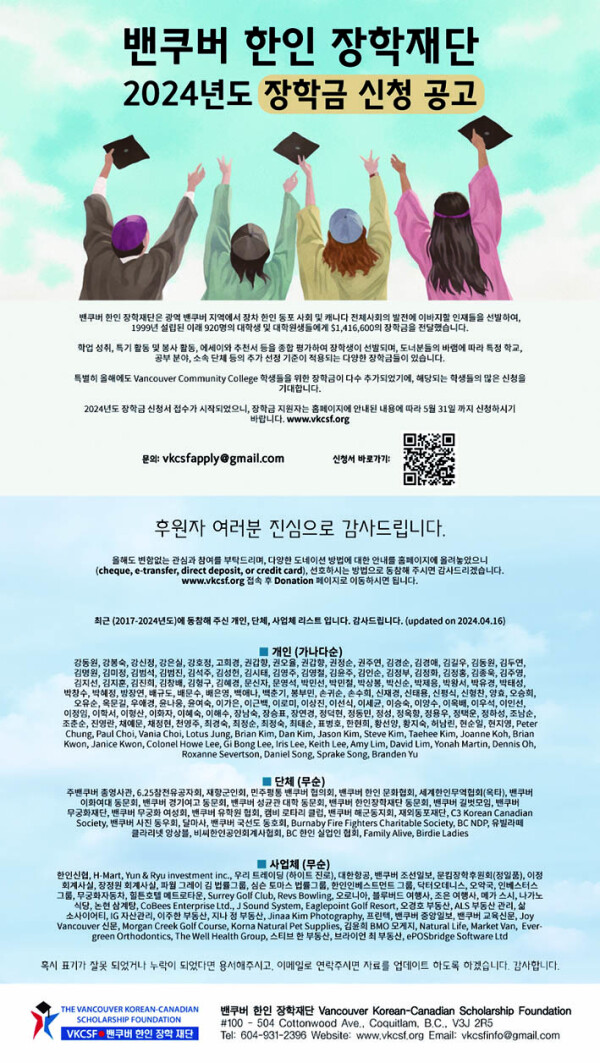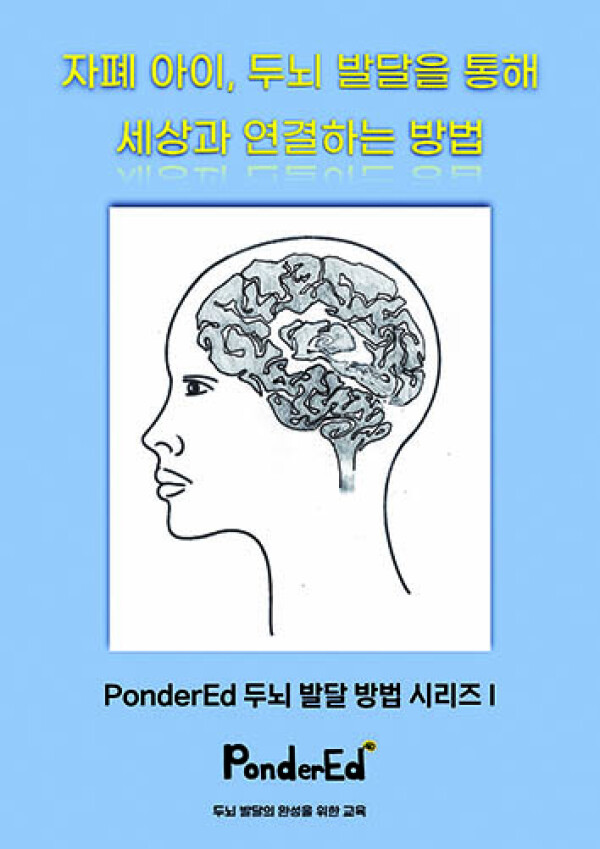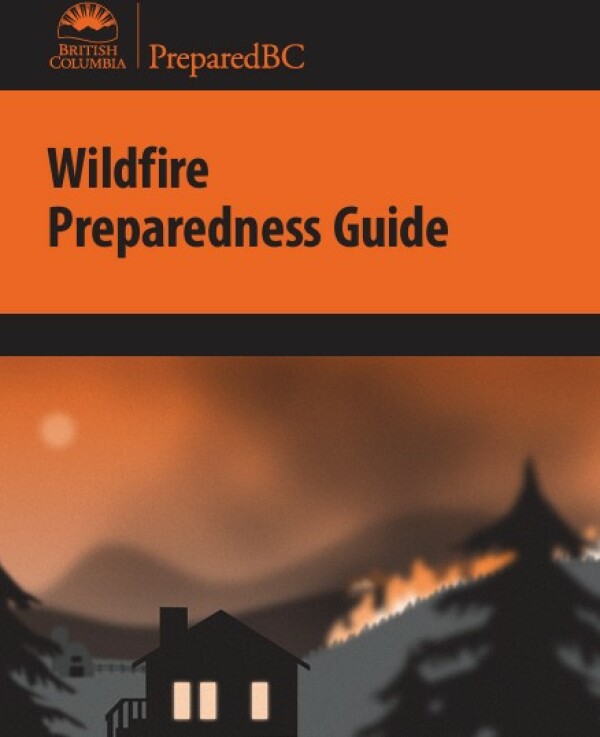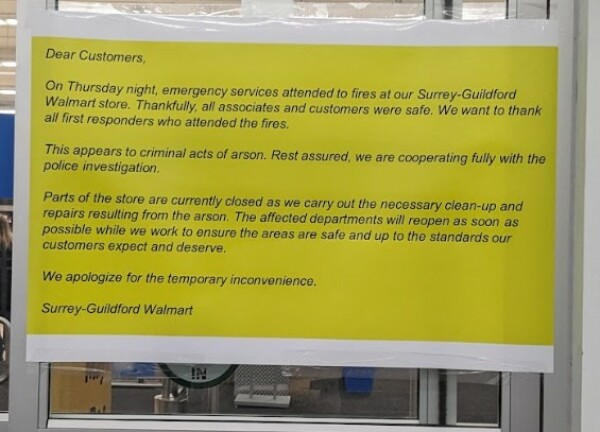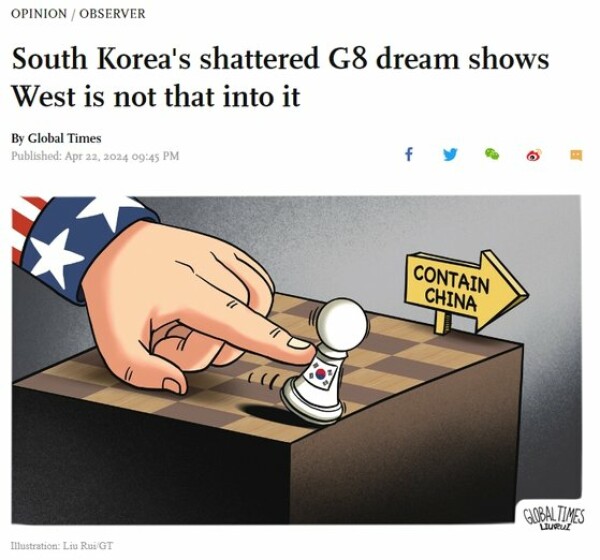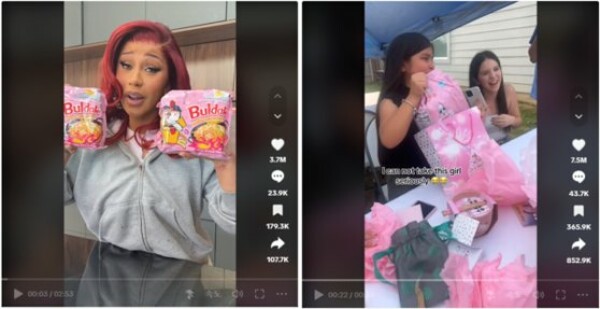문학 | [문학가 산책] 슬픔의 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숙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3-15 02:50 조회60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정숙인 (캐나다 한인문학가협회 회원)
마음에 드리운 먹구름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밖으로 뿜어내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탈이 나기 마련이다. 누구를 만나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간에 마음에 품은 알 수 없는 시커먼 덩어리를 밖으로 내던져 버려야 한다. 그래야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살아갈 수 있다. 며칠째 머물던 그 먹구름 아래로 이내 비가 쏟아져 내린다. 마음은 꺼이꺼이 흐느낄 것이고 오직 슬픔만을 먹고 자라는 그 속의 나무는 조금 더 자랄 것이다. 이제 조금씩 무성해지는 잎들로 인해 전혀 적셔질 것 같지 않은 나무 밑둥 언저리가 어느 새 눅눅해지며 젖어들려 하고 있다. 이렇게 나무가 자랄 때마다 슬픔과 회한이 교차하리라. 마치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밖의 청량감이 그리워 실내에 갇힌 텁텁한 공기속을 탈출하고져 창문을 열었을 때와 같다. 그 지긋하고도 둔한 통증에 짓눌러 많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헐떡이며 숨을 쉬고 있다는 안도감에 곧 젖어든다. 앞으로도 그 아픔은 계속될 것이고 어쩌면 호흡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더 자연스럽고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통증이 뻗쳐 오면 그 곳을 지그시 누르고 있을 뿐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 아픔을 참아내는 것도 살아있다는 신호이니 애써 미소를 지으며 숨을 고른다.
슬프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간절히 지키기 위하여 내가 나에게 보내오는 에스 오 에스 신호이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고 한숨 돌리고 가라고 마음이 토로하는 것이다. 충분히 이쯤에서 쉬었다 가라고 한다. 이러는 자신을 어리석다거나 나무라지 말고 더 이상 급하게 재촉해서 무리해서 이겨 보라고 등 떠밀지 않아야 한다. 여기까지 왔으니 충분히 조금만 기대어 쉴 수 있다 가기를 바라며 남은 힘을 쥐어짜서 토해내는 것이다. 자신을 향한 뜨겁고도 아련한 단말마이다.
그 빼곡히 자라난 들판의 나무들에 비가 내린다. 슬픔을 먹고 자라는 나무들에 쏴아하고 소리내어 비가 쏟아진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하늘에 닿게 우뚝 선 나무들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천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처럼 고요하기 짝이 없는 가운데 오로지 슬픔만을 먹고 자란 나무들이 뿜어내는 빗소리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늘까지 닿게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을 만들어 세우고 그 안으로 삽시간에 뿌연 수증기를 만들어 가득 채운 채 오로지 공중으로만 높이 솟구치며 오르고 춤을 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늘로 이무기처럼 올라가는 수중기의 그 아련함은 흡사 긴 장삼자락을 휘날리며 머리에 하얀 고깔을 쓴 여승의 춤사위와도 같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슬픔을 먹고 자라는 나무들이 한껏 비를 맞고 나서는 다시 움츠러 들기 시작한다. 괴이할 정도로 뻗어나가던 가지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듯 차분하게 뻗었던 가지를 공손하게 내리고 있다. 세상사에 맞물려 항거했던 마음이 세상에 의해 만들어진 법칙에 순응하며 꼬리를 내리고 얌전히 고개를 떨군다. 떨군 고개 아래로 남은 마지막 호흡이 뻗어 나온다.
자, 이제 다시 시작이야. 어떻게든 살아내야지. 마지막 내뱉은 호흡 한 자락이 공중을 선회하며 다가오다 으스러지듯 사라져버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