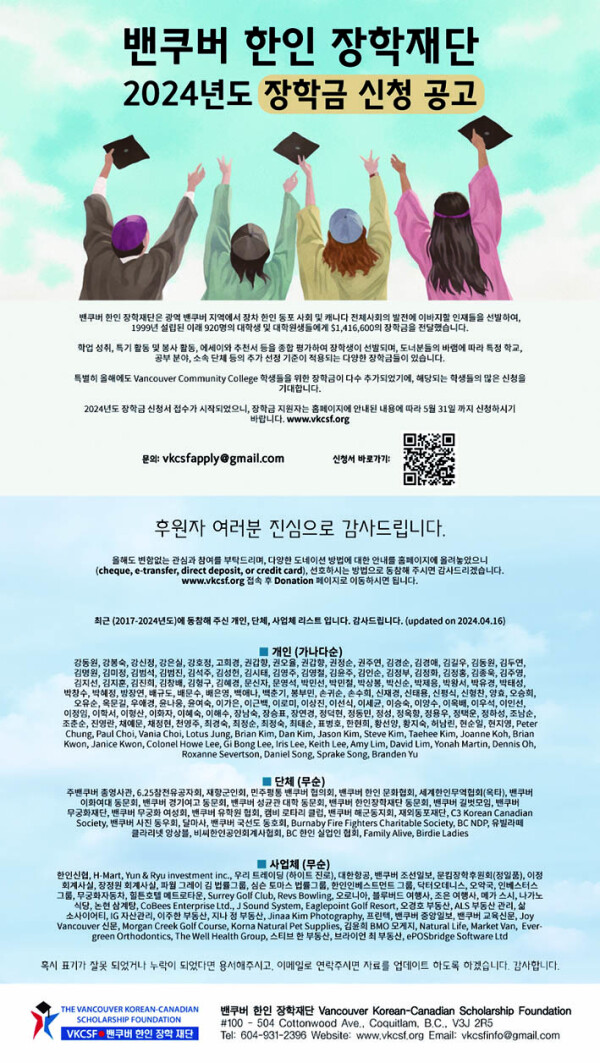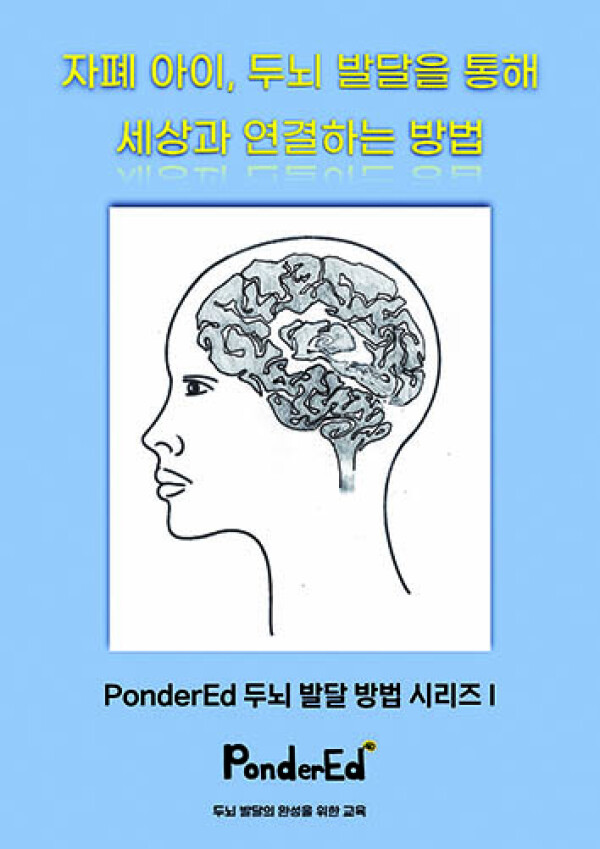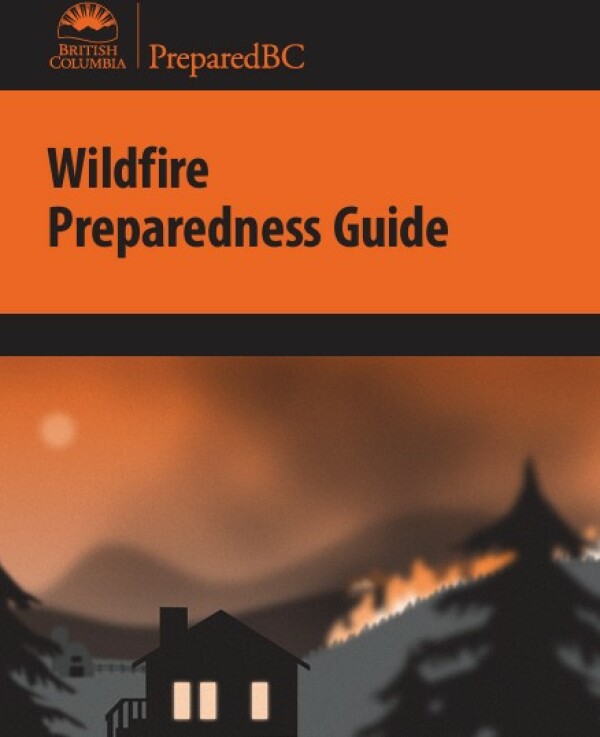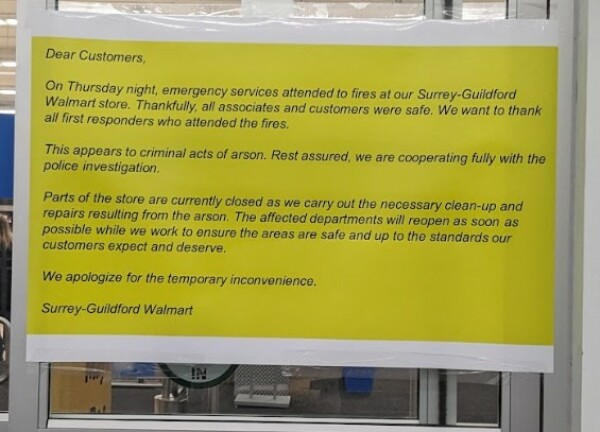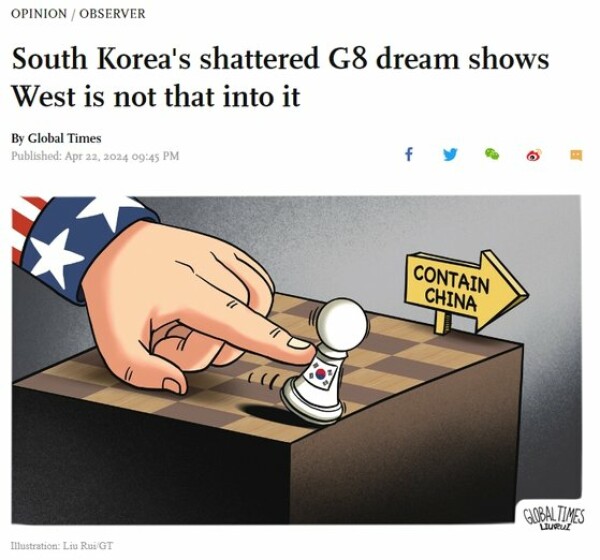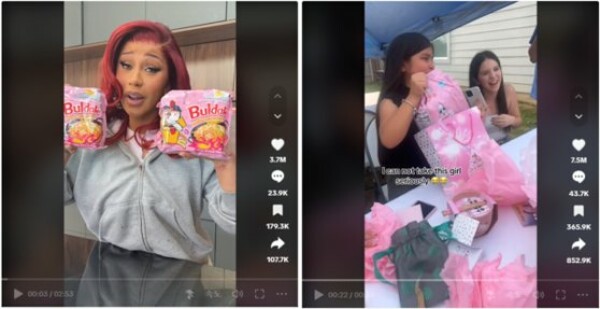문학 | [밴쿠버문학] 고들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효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3-15 02:52 조회63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정효봉
(사)한국문협 밴쿠버지부 회원
11월 늦가을인데도 햇볕은 따사로웠고 바람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이었다. 삼 년 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 댁에 갔다. 먼발치에 서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고, 어머니는 나를 보시자마자 손을 흔드시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셨다. “오메, 오느라 고생했다, 얼굴이 쌍클하네, 울 아들.” 하시며 주름진 손으로 내 뺨을 만지셨다. 어머니의 눈가에선 맑고 큰 눈물이 곧 굴러떨어질 것만 같았다. 나 역시 눈물을 보일까 봐 하늘을 쳐다보며 두 번 윙크했다. “얼른 들어가자, 배고프지? 아버지는 모임이 있어서 조금 늦으실 거다.” 어렸을 적부터 나는 어머니와 둘만이 식사하는 것을 좋아했다. 둘이 식사할 때면 어머니는 항상 곁에서 반찬을 골고루 집어주셨다.
손을 씻고 나오니 어머니는 밥과 반찬을 가지런히 놓으시며 내가 수저를 들기만 기다리고 계셨다. 식탁 위에는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돌산갓김치, 고들빼기김치 등 온갖 김치와 조기와 갈치구이, 꽃게탕, 갈비찜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올라와 있었다. 젓가락을 들어 반찬 하나를 집으려는데, 허리가 뚝 부러진 굴비 살점이 이미 어머니 손에 들려서 내 입을 향하고 있었다. ”아따, 꼬들빼기 먼저 먹고 먹을라요.” 통통한 굴비보다 맛있게 곰삭은 고들빼기가 내 눈에 먼저 들어왔다. 군침을 꿀꺽 삼키고 고들빼기를 뿌리째 들어 한입에 넣었다. 고들빼기의 쌉쌀함과 곰삭은 젓갈의 풍미가 입에 퍼졌다. 그런데, 한 입 깨물고 나니 뭔가 예전 어머니의 그 김치맛이 아니었다. 한 젓가락 더 크게 집어서 씹어보았다. 순간 나도 모르게 고개를 약간 저었다. 어머니의 김치 양념은 진덤진덤했다. 한 입 먹으면 그 양념이 입 안에 꽉 차고 묵직한 특유의 맛이 있었다. 학창 시절 자취할 때 어머니 김치로 만드는 김치찌개는 따로 양념을 더 할 필요 없이 김치를 담은 냄비에 물과 돼지고기만 넣으면 바로 칼칼하고 맛있는 찌개가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표 김치찌개는 자췻집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찌개 반찬이었다. 그런데 이 고들빼기 김치에서는 그때 그 김치 양념의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어째 그냐? 맛이 없냐? “ 어머니께서 눈치채시고 바로 물으셨다. “아니랑께요. 허벌나게 맛나요. 역시 우리 엄니구만.” 대충 너스레를 떨며 이 상황을 넘어가고 싶었다. 어머니는 얼른 돌산갓김치도 먹어보라고 권하셨다. 돌산갓김치를 큼지막하게 찢어서 입에 넣었다. 바로, 이 맛이야, 울 어머니의 김치맛이 바로 진덤진덤하게 느껴졌다. 묵직한 젓갈과 갖은양념의 조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갓김치를 볼이 터지도록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엄지를 번쩍 들어 보여주었다. 그릇 위로 산봉우리처럼 쌓인 밥을 양껏 퍼서 쉴 새 없이 입속으로 밀어 넣었다. 어머니께서 물을 내미시며 “천천히 묵어, 근디 살로 가겄다.” 흐뭇하게 말씀하셨다. “참말로 맛있어부요.”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생선 기름이 자르르 흘러내리는 어머니 손은 내 밥 숟가락 위에 생선 살을 올려놓으시느라고 분주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배부른 밥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는 봉지 커피를 예쁜 찻잔에 타서 내미시며 “아야, 꼬들빼기 맛이 좀 이상하디?” 하고 물으셨다. 나는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 드리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실까봐 생각과 다르게 대답했다. “아니라, 암시랑도 않던디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 내가 너를 모르냐? 울 아들 못 속이것구만. 아이고, 울 아들 입맛 하나는 귀신이여.” 하시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다.
어머니는 김치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셨다. 제철마다 나오는 싱싱한 야채로 여러가지 김치를 담아 김치냉장고에 칸칸이 채워 넣는 것이 어머니의 취미였고 즐거움이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늘 갖가지 김치가 가득 차 있어서 매 끼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었다. 몇 년 묵은 묵은지부터 굴이 듬뿍 버무려진 김장 김치, 쪽파와 함께 어우러진 돌산갓김치, 그리고 막 담근 겉절이에 아삭아삭 시원한 동치미까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할 때면 어머니는 김치를 쭉쭉 손으로 찢어 주시며 밥숟가락에 하나씩 척척 얹어 주셨다. 식구들이 울 어머니 김치가 최고로 맛있다고 말해줄 때마다 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시며 웃으셨다. 어머니는 제철 김치 재료가 나올 때마다 재래시장 여러 곳을 다니시며 마음에 드는 것들을 직접 골라 구입하셨다. 김치는 재료가 좋아야 양념을 버무렸을때 그 맛이 제대로 난다고 늘 말씀하시곤 하셨다.
어머니의 김치 담그는 모습에 익숙한 난 어릴 때부터 유달리 고들빼기를 좋아했었다. 또래 친구들은 고들빼기 특유의 쌉쌀한 맛을 싫어했다. 하지만 난 그 맛이 그렇게 좋았다. 어머니께서는 어린것이 고들빼기 맛을 잘 안다고 하시며 항상 내 밥상에는 손수 만드신 고들빼기가 끊이지 않게 하셨다. 며칠 전 전화 통화를 할 때 어머니는 맛있는 고들빼기김치를 담가 놓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었다. 그런데 얼마 전 단골 야채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늘 사시던 그 고들빼기를 구하실 수 없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물어물어 백화점 식품점에 납품한다는 유명한 반찬가게에서 만들어진 고들빼기김치를 사 오셨다. 아버지께 먼저 드셔보시라 하고 의견을 들어보니 그냥 맛있다고 하셔서, 어머니 역시 무심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었다. 하필이면 아들이 제일 먼저 맛본 고들빼기김치가 직접 담근 김치가 아니라니…. 실망하는 아들의 모습을 눈치채신 어머니는 심기가 좀 불편하셨다.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에게 직접 담근 고들빼기김치를 맛보여주지 못한 미안함에 마음이 무거우셨던 것이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는 행장을 꾸리고 계셨다. 친구들과 만나는 곗날이라 점심을 드시고 오신다고 하셨다. 나 역시 고향 친구들과 점심과 저녁 약속이 연거푸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리고 집을 나섰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소주잔을 마주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다 자정이 다 되어 집에 들어왔다. “인자 오냐?” 어머니 목소리에 깜짝 놀라 내가 말했다 “엄니 안잤소?” 어머니는 그 밤중에 고들빼기 김치를 담그고 계셨다. 당신이 원하는 꼬들배기를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시골장에 가서 맘에 드시는 고들빼기를 사 오신 것이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김치를 담그고 계셨던 것이었다. 김치를 다 버무리시고 김치통에 담기 전 “아나, 맛 좀 봐라.” 하시며 쓱쓱 버무린 김치에 깨를 잔뜩 묻혀 내 입에 쏙 넣어주셨다. 순간 예전 어머니 손맛, 그리고 그 특유의 향기가 고들빼기의 쌉쌀한 맛과 함께 내 코를 찡하게 만들었다. 그 맛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어서 잠시 눈을 감고 김치맛을 음미하고 있었다. “아따 겁나게 맛있소, 잉.” 하고 말하자마자 어머니께서 “밥 좀 묵을래? 좀만 먹어봐라.” 하시며 뜨거운 흰 쌀밥을 내오셨다. 늦은 밤 배가 불렀지만, 벌겋게 버무려진 고들빼기김치와 흰 쌀밥의 조화는 꿀맛이었다. “당분간 좀 익혔다가 먹어라, 오래 둬도 맛있응께 두고두고 먹어,잉.” 김치를 통에 담으시며 집에 다 가져가라는 말씀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함께 김치에 대한 어머니의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다. 결국 아들과 약속한 당신만의 고들빼기 김치를 만드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어머니 아버지 모두 역까지 나오시겠다고 우기셨다. 아버지의 양손에는 김치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차에 타기 전 어머니는 내 머리와 옷매무새를 고쳐주느라 여념이 없으셨다. 내가 처음 서울 객지로 떠날 때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 “ 엄니, 나 가요. 건강하시고, 도착하면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그래라, 잉.” 하시며 손을 흔드셨다. 서서히 멀어지는 두 분의 모습이 두 점으로 보이고, 안 보일 때까지 그저 차창 밖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고들빼기 김치통을 쳐다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고들빼기의 쌉쌀한 그 맛이 늦가을의 쓸쓸함으로 후욱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당분간 내 식탁에는 이 고들빼기김치 이외에 다른 반찬은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