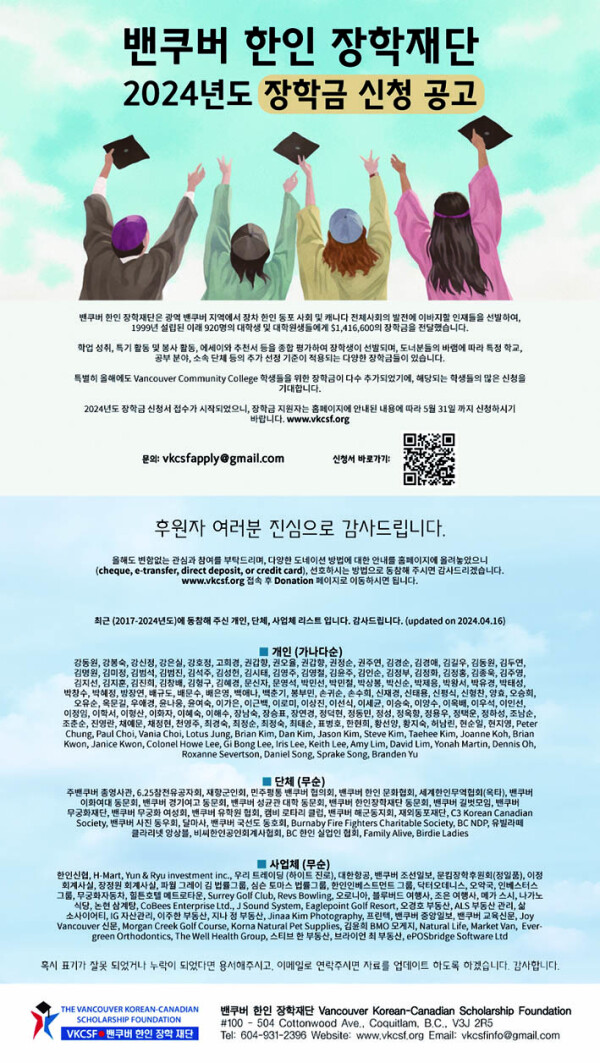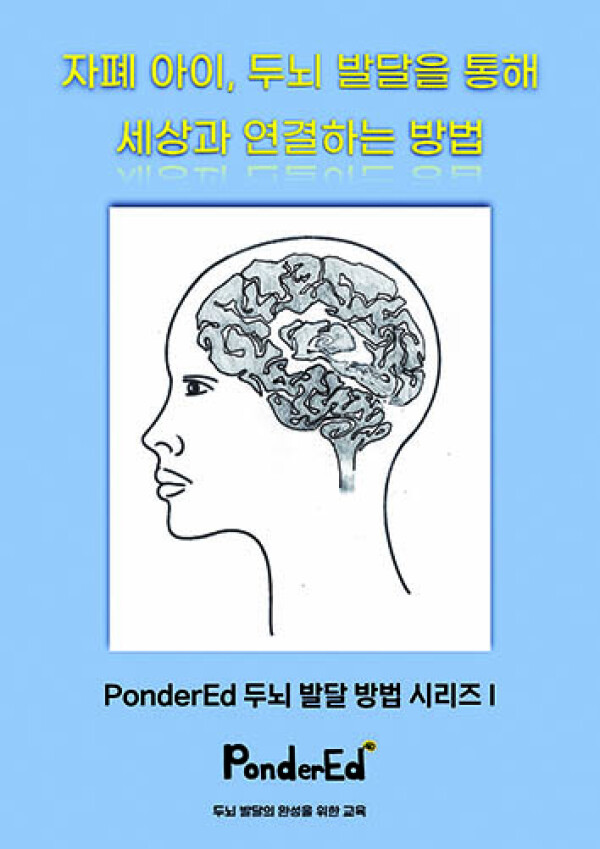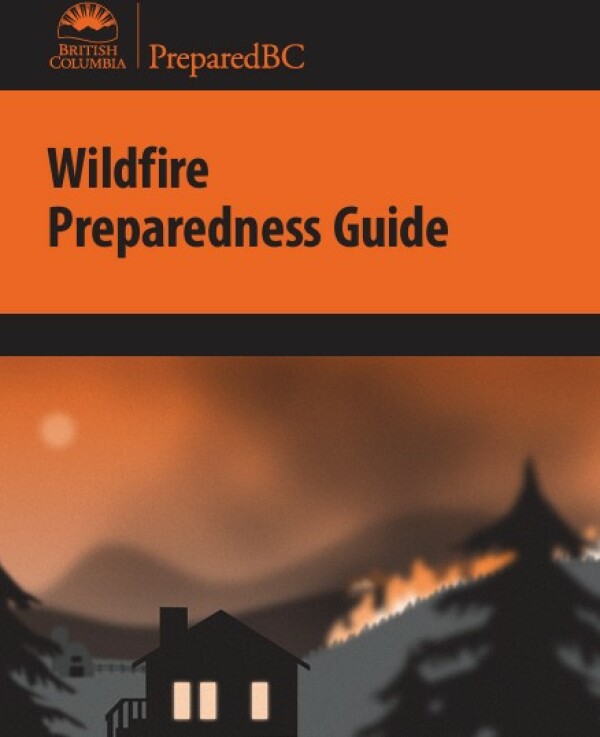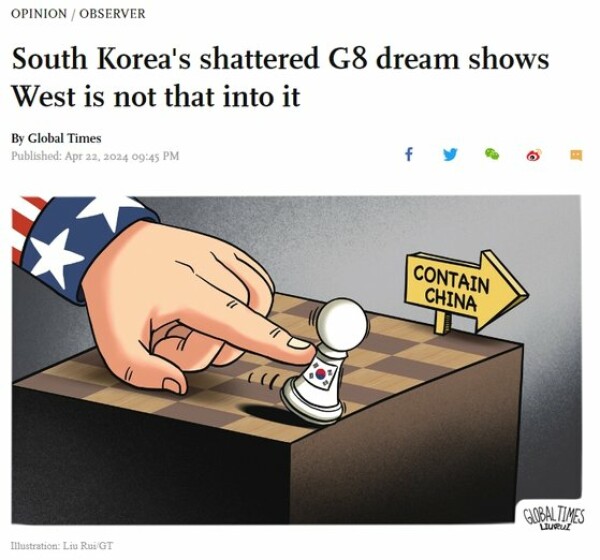문학 | [밴쿠버의 빨간 우체통] 가혹한 처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지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9-30 05:02 조회651회 댓글2건관련링크
본문

박지향
당신은 어쩌자고 "불 끄고 자자" 하셨는지요."불 끄고 잘 시간이야." 나는 그만 쿵 하고 떨어지는 내 심장 소리에 놀라 창문을 열었습니다. 동그랗게 눈을 뜨고 쏟아지는 시커먼 간장 국물을 등으로 받으며 하던 말, "잘 시간이야" 그 말이 그렇게 슬픈 말인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안도현 시인님!
당신이 담가 놓으신 간장게장을 맘 편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당신말고 몇이나 될는지요? 당신때문에 많은 이들이 먹지 못하는 그 아픈 게장을 당신께서는 맛나게 잘 드신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배신감에 울분을 토해가며 읽었지요. 몇 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밤잠을 설칩니다. 특별히 기억력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그 뭐더라..."를 달고 사는 제가 이리도 오래 기억하고 있다니 저는 분을 오래도록 품는 사람인가 봅니다. 분을 품은 이유는 그것도 기쁘게 품었던 이유는 "스며드는 것"을 읽고 게장과 작별했다는 사람들을 만나시고는 "걸려들었다"며 쾌재를 부르신다는 당신의 유머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음식이 간장게장이라 하시면서 말입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는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한 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라 쓰시고는 어찌 게장을 그리 맛나게 드실 수 있는지요? 눈물 한 방울 토핑 하지 않은 가장 게장을 눈물 없이는 먹지 못하는 내가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이 시를 읽고도 맘 편히 게장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밥값은 내가 쏜다."라고 말이지요.
코로나 팬데믹이 선포되기 전, 캐나다와 미국 사이 국경은 자유로웠습니다. 밴쿠버에서 시애틀까지 넉넉잡고 4시간이면 가는 길이라 자주 오고 갔었지요. 한 달에 두 번도 오고 가는 길이건만 언니는 동생이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시장을 봐다 음식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배추김치 물김치 총각김치 김치만 가지고도 밥 한 솥을 다 비울만큼 많은 종류의 김치를 담습니다. 갖가지 귀한 나물에 끼니마다 차려줄 음식 재료들이 봉지봉지 가득 찬 커다란 냉장고는 콩알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빼곡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기 전부터 두 개나 되는 대형 냉장고는 산소 부족으로 모두 기절 모드로 들어가 있곤 하지요.
추석을 며칠 앞둔 몇 해 전 가을이었나 봅니다. 내가 아직 일어나기도 한참 전인 새벽부터 언니는 바쁘게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텃밭에 기른 가을 상추, 치커리 미나리 깻잎, 갖은 쌈야채를 바구니 한가득 씻어 놓았습니다. 붉은팥을 드문드문 섞어 고슬고슬 지은 밥이 식탁 위에서 하얀 김을 뿜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들깨가루를 넣고 끓인 얼갈이 배춧국과 각종 김치, 고추장 양념을 발라 구운 더덕과 멸치 꽈리고추볶음, 된장과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 나물까지 차려진 식탁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버티고 서 있었지요.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미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밥상을 보고 가만있을 수 없는 나는 두 옥타브나 올린 감탄사로 폭죽을 터트렸습니다."우와, 나 오늘 죽어도 여한 없어,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음 나와 보라 그래"하며 언니를 와락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언니는 "이까짓 걸" 하더니 "한 가지 더" 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돌아온 언니는 미리 담가 잘 익힌 간장게장을 커다란 접시 가득 들고 와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울 막내 많이 먹고 건강해라" 하는데 숟가락을 들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언니의 정성도 감동이었지만 간장게장은 울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이었지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게장을 당신께서 쓰신 시를 읽고부터는 정말이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가 아니어도 게장 앞에선 목이 메는데 알들을 끌어안으며 느꼈을 어미의 공포와 외로움, 고통을 읽고 어찌 게장을 입에 넣을 수가 있겠는지요.
울 엄마는 간장게장 한 마리면 밥한 그릇을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순식간에 드셨습니다. 꽃게탕도 꽃게찜도 좋아하시지만 간장게장으로 삼시 세 끼를 차려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드시던 울 엄마는 이제 간장게장을 못 드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내시느라 이를 악물었던 탓일까요. 몇 개 남지 않은 당신의 치아 대신 틀니를 의지해야 하는 아흔이 넘으신 울 엄마는 맛있는 게 없습니다. 밥알보다 삼켜야 할 알약이 더 많은 병상생활은 짜고 단것 매운 것 기름진 것, 맛을 내는 어떤 음식도 먹어선 안된다는 가혹한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 맛있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쏟아지는 간장 국물의 폭격을 받으면서 알들을 끌어안던 꽃게처럼 울 엄마도 우리 육 남매를 쏟아지는 세상의 포탄으로부터 지켜 내시느라 이를 악 물어야 했습니다. 있는 힘껏 악다물고 지켜야 했던 엄마의 세월은 아름다운 자태며 목소리, 치아... 모든 것을 다 가져 가버렸습니다. 그 고우시던 엄마는 어디로 가고, 마른 고사리 같이 깡마른 노인만 남아 천년 같은 하루를 견디는 중입니다.
"어떻게 밥맛이 없을 수가 있냐"며 평생 입맛 한번 잃어본 적 없다는 언니도 그날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엄마가 젤 좋아하시는 건데" 때문이었지요. 단언컨대 울 엄마는 그 좋아하시던 게장을 단 한 번도 당신이 드시겠다고 사신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들 입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배고픔도 공포도 외로움까지도 홀로 껴안으며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하던 어미 게의 말이 몇 년째 내 속으로 스며드는 중입니다. '울 엄마도 이렇게 아팠겠구나', '울 엄마도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외로웠겠구나' 아버지 가시고 홀로 견딘 10년, 뼛속까지 스며든 외로움은 엄마가 되고 엄마는 외로움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걸어가신 길처럼, 군데군데 묻힌 지뢰밭같은 생을 건너며, 시나브로 스며들어가는 엄마의 세월을 따라 나도, 어미가 되어 갑니다.
댓글목록
한힘님의 댓글
한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월이 더해가며 간장계장 처럼 마뜩한 감칠 맛을 내는 글솜씨가 부럽습니다.
건필을 바랍니다.
박지향님의 댓글
박지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저, 등으로 쏟아지는 간장국물을 뒤집어쓰면서도 담담하게 알을 끌어안은 어미게처럼
담담하게 생을 끌어안을 따름입니다.
귀한 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