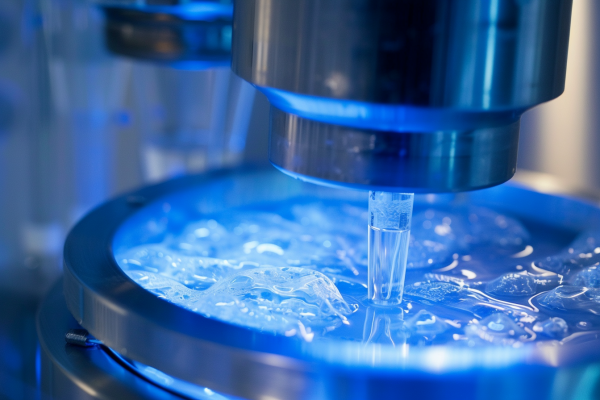문학 | [특별 기고] 톨스토이와 땅과 나(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15 12:30 조회34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엘리트로 대접받던 직장을 사직하고 미화 200 달러만 갖고 공부 하겠다고 떠난 세울이다. 그 혹독한 고난, 그리고 역경과 싸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무엇인가 내 놓을 것 하나 없는 생애다. 멀지 않아 한평 남짓한 땅에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 아닐까.
땅을 보았으니 땅에 대한 투자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내가 본 이땅은 산림 자원 뿐만아니라 10 여 만 평에는 건축용 자재로 필요한 그라벨(GRAVEL)이 몇 백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100 여만평에는 소먹이 사료 건초(HAY)를 재배하고 있으며 남은 땅에는 울창한 산림자원이 꽉 차있다. 산림자원은 채벌 후 원목으로, 그라벨(GRAVEL)은 채취하여 밴쿠버나 다른 도시에 건축용 원자재로 팔면 된다.
또 자작 나무는 유럽에서는 구하지 못하다고 하니 가구용으로 수출을 하면 좋을 듯 하다. 대한민국 조국의 가난한 사람들 50 여 가구를 초청해 이곳을 경영 한다면 이 황무지 같은 기름진 땅은 빛을 보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좁은 땅덩이인 조국의 현실을 본다면 이 200 여만평이 대한민국의 땅이 되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종착역은 "톨스토이" 같이 한평 남짓한 땅에 묻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모든 의욕과 욕망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부서지고 만다.
우리네 인생이 갈 길은 어디 일까. 사(死)의 찬미를 부르며 현해탄에 돈도 사랑도 명예도 다 싫다며 생을 마친 윤심덕이 떠 오른다. 한평 정도에 묻히는 육신인 것을 알면서 오늘도 어제도 허덕이고 있는 나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 질수 있을까. 허욕의 야심 때문에 죽어간 "바흠"의 생애와 자기의 생애를 참회하고 죽을 것을 예감하며 한평짜리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종말을 예언한 소설을 세상에 남기고 떠난 "톨스토이"의 생애를 한번쯤 재조명해 보고 싶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구하고 찾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욕망과 야심과 불만을 없에고 겸허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제하는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리라는 생각을 해 본다.
끝으로"레프 니골라예비치 "톨스토이"그의 생애는 그가 떠날 때까지 참회의 길을 걸으며 살아 왔기에 나의 심금을 울려준다. 그의 "인생론과 참회록"에서 전세계 인류를 향해 방사된 사랑과 헌신의 진리의 빛은 번민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무한 한 생존의 보람을 안겨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톨스토이"의 생애의 멋은 대문호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생애를 통해 반성하고 참회하고 사랑하고 또 반성하며 참회하며 인류를 사랑하면서 살아왔으며 항시 겸허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 왔기에 머리가 숙여진다.
절재된 삶을 영위하면서도 어느 누구를 탓하지도 원망치도 않으며 그의 일생을 마친 인격을 흠모 하지 않을 자 이세상에 있으랴. "톨스토이"의 명복을 빌고 있는 이 삼류 시인이 있슴은 "톨스토이"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며 결론을 맺는다. "톨스토이"는 1910년 10월 31일 가출하여 "야스타포프 역에 하차 역장의 집에서 서거했고 그의 나이는 82세 였다. 2014년 필자가 대문호의 생가를 찾았을 때 야스타포프 역이란 이름은 톨스토이 역으로 개명이 되어 있었다.
이유식 (시인, 민초해외문학상 운영위원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