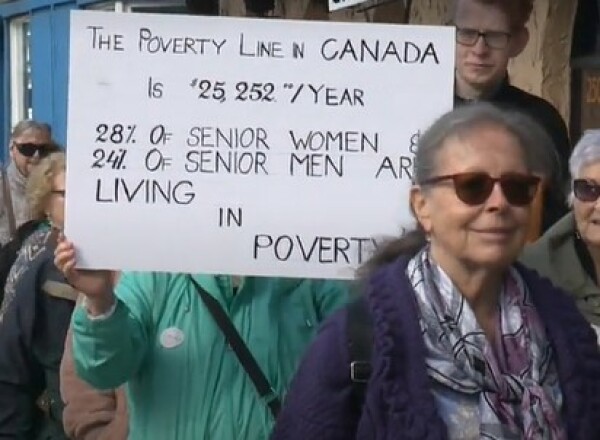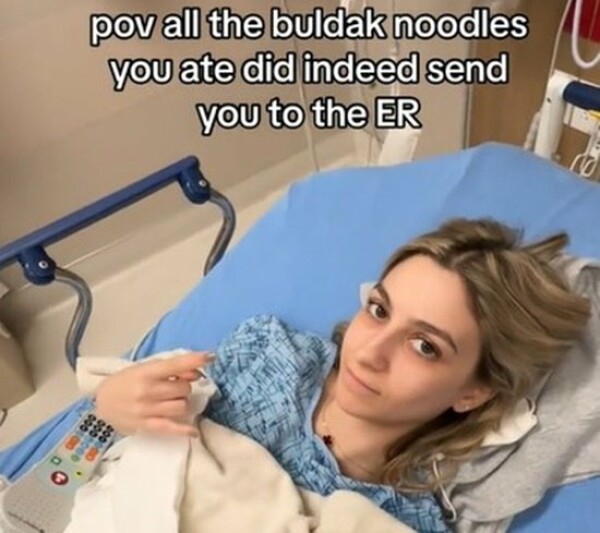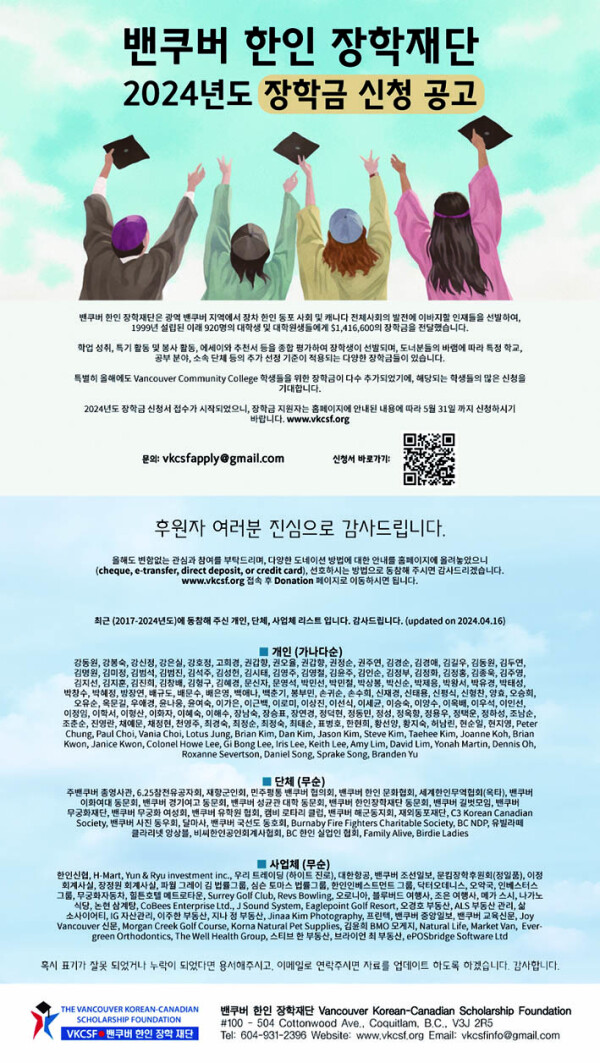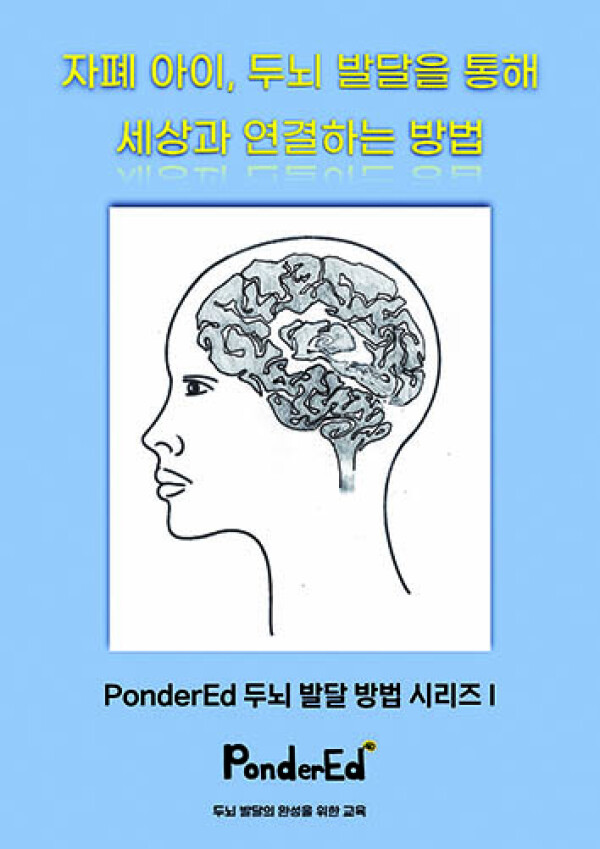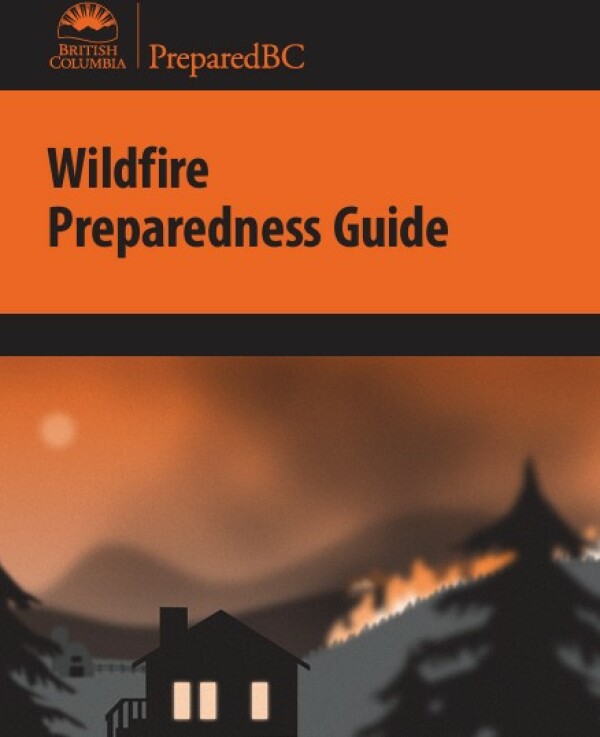문학 | (문예정원) 눈이 아름다운 여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종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7-10 08:29 조회57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종학 / 캐나다 한국문협 고문
책장을 정리하다가 ‘눈먼 자들의 도시’가 눈에 띄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주제 사라마구가 쓴 환상적 리얼리즘의 장편소설이다. 2000년도에 감명 깊게 읽었던 대작인데 다시 읽고 싶은 충동을 받아 책상에 내놓았다.
어느 날 오후 차를 운전하던 한 남자가 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증세가 일어난다. 이것이 암흑세계의 시작이다. 그를 집에 데려다 준 대리운전자도, 남편을 안과병원에 데리고 간 아내도, 병원의 환자들도, 그를 치료한 안과 의사도 모두 멀쩡한 눈이 멀어 버린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원인 불명의 시력 장애 현상이다. 이렇게 눈먼 자의 수는 무서운 기세로 늘어난다. 정부는 실명을 전염병으로 보고 방역 수단으로 이들을 한 곳에 격리 수용하고 군대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결국 속수무책, 오래지 않아 시민 전체가 눈이 멀어 완전 패닉상태에 빠진다.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교통이 마비된다. 화장실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자 오물과 배설물, 부패하는 시신과 쓰레기가 여기저기 버려지고, 내뿜는 악취로 뒤덮인 도시는 연옥 이상의 참혹한 모습이다. 설상가상으로 먹을 것을 찾아 폭도로 변한 눈먼 시민들의 아귀다툼은 금수의 경지까지 이른다.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오직 한 사람, 안과의사의 아내만이 눈이 멀지 않는다. 그녀는 눈먼 남편을 도우려고 눈먼 사람으로 가장하고 같이 수용소에 들어간다. 못할 짓이었다. 눈먼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완전히 비인간적인 모든 상황을 보게 된 자신이 오히려 원망스럽고 무서웠다. 차라리 같이 눈이 멀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따뜻한 인간 사회로 되돌려 놓겠다는 그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눈먼 자들 사이에서 연대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다. 인간애가 조금씩 회복되고 공존하는 법을 다시 깨닫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눈먼 자들이 시력을 되찾는다. 이렇게 소설은 끝난다.
이 소설은 인간 본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 사라마구의 문학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다. 저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경고를 던진다. 본문 중에 이런 글이 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응, 알고 싶어.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눈은 멀었지만 본다는 건가,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독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간절한 외침이 들리는 듯하다.
나는 이 소설에서 천사 같은 여운을 남긴 사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한 사람, 치과의사의 아내라는 여인에 관해 좀 더 관심 있게 추적해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이 소설을 재차 읽었다. 이 소설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정확히 설정하지 않았으며 작중 인물들의 이름도 따로 정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눈이 멀지 않은 안과의사의 아내를 그녀로 지칭한다. 눈뜬 봉사가 된 그녀는 연약한 여인 혼자서 인간성까지 상실한 눈먼 자들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다.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잘못되고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을 모르쇠하기란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인내력이 필요했다.
유일하게 시력을 소유한 그녀의 절대 특권에 가까운 위치를 생각해 보았다. 시력장애인 나라에서는 애꾸가 왕 노릇 한다지 않는가. 그녀는 신과 같은 여왕으로 옹립되어 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시없는 조건을 가졌다.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혹사하고 축적하고 향락을 즐긴들 감히 막고 나설 자가 없다. 그야말로 만인 천하 유아독존이다. 가리고 자시고 할 눈들이 있어야 야웅~ 이라도 하지. 하긴 완벽한 시력에다 발달한 인지(人智)까지 제대로 갖춘 세상에서도 이런 기막힌 독선이 비일비재하거늘 그녀가 무슨 짓을 하든 시빗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눈먼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로 한다. 먼저 이들에게 서로가 의지하고 아끼고 고통을 나누는 상조의식의 회복을 권한다. 인도의 성자 바바 하리의 예화를 앞세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한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걷는 까닭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정상인을 위한 배려이다. 이렇듯 남을 위한 진정한 배려와 나눔을 가르치려 했다. 그러나 마이동풍이다. 평상시에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든 삶을 살다가 눈이 멀어 남의 존재가 아예 보이지 않는 막판에 이른 이들의 심보나 작태가 오죽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들에게 인격을 일깨우고 공동의식을 불러일으키자니 쉬운 일이 아니다. 미친 짓이나 다름없다. 그녀는 실망과 좌절과 피로에 자주 휘말린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시 다잡기를 수없이 되풀이한다.
릴케의 명상시 <두이노의 비가>는 인간으로서 자랑할 게 있느냐고 묻는 천사에게 이렇게 답한다. “나는 타자를 통해서만 존립이 가능하다. ‘나’가 아니라 ‘나는 너’이거나 혹은 ‘나는 너를 통해서만 나’인 것이 또 하나의 인간 조건이다.”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나 보지 않을 때 모든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눈에 콩깍지가 씐 사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사람도 있다. ‘안중에 없는 인간’ 이란 말을 자주 듣는 세상에 우리는 산다. 책을 덮고 나니 문득 창 넘어 짙푸르게 생동하는 녹음을 보면서 이들의 정다운 대화도 아울러 듣고 싶어진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