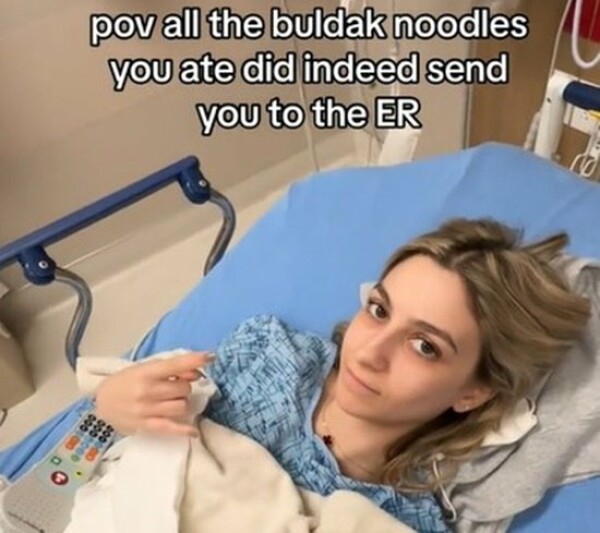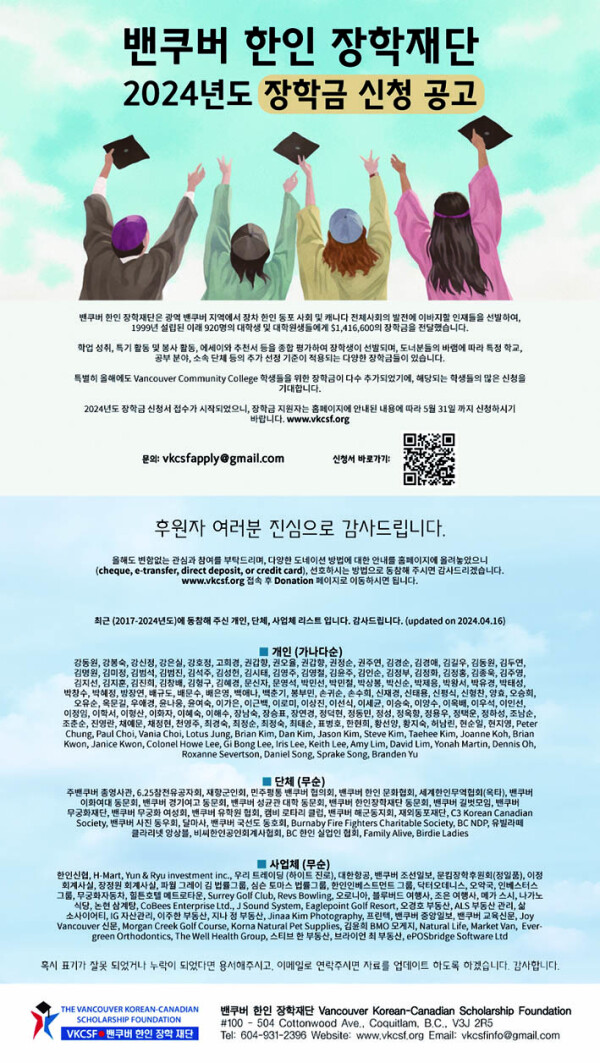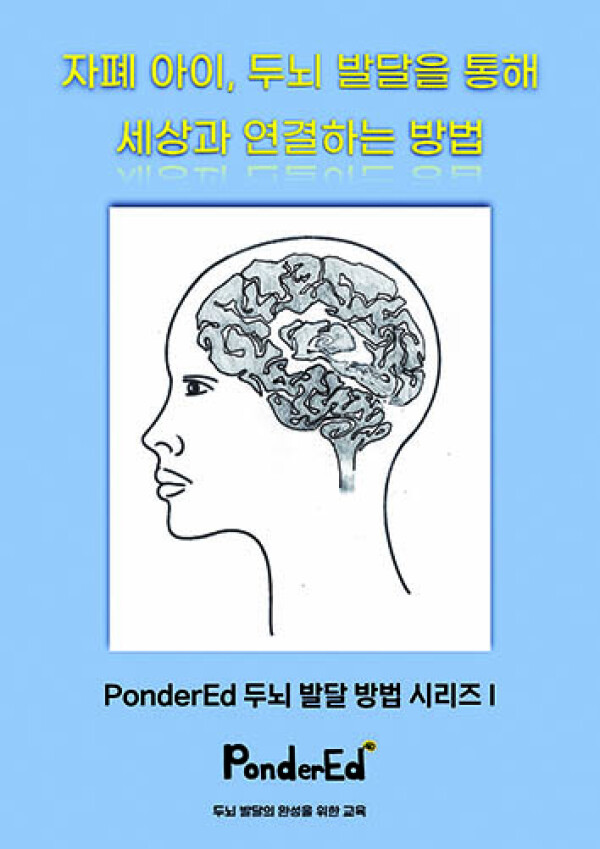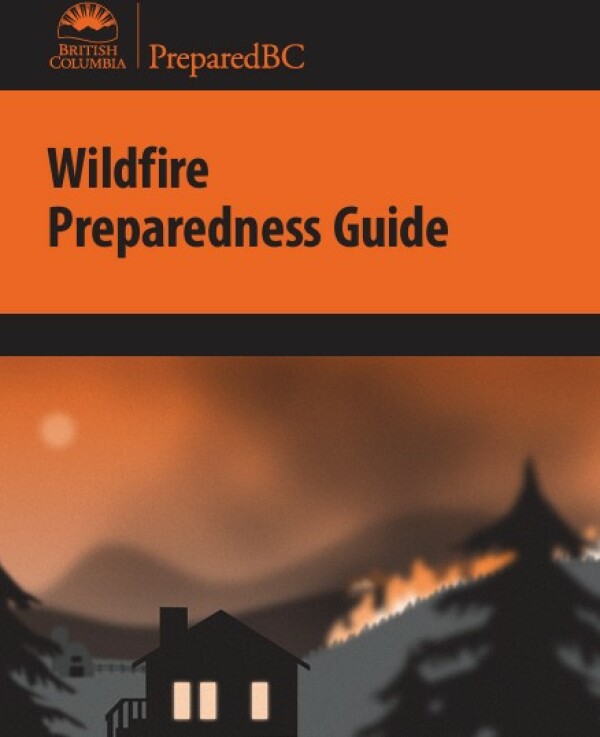문학 | [문예정원] 낙조와 폐선이 있는 풍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08 11:39 조회4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여름 낙조를 보고 있다.
작은 포구의 서편 하늘엔 저녁놀이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며 조용히 불씨를 사른다. 길옆에는 아직 실눈을 뜨지 못한 코스모스 행렬 속에 간혹 철이 없는 꽃들이 샛눈을 뜨고 살랑거릴 뿐, 감빛 스카프처럼 물들어 가는 하늘에도, 몽근 모래의 일상을 간직한 땅에도 아직 어두운 기운은 없다.
낡은 폐선 한 척이 보인다. 배는 긴 항해로 고단했던 삶의 신음을 토해내는 걸까. 심연 속에 가둔 많은 날들. 이른 시간에 맞추어 출항 준비를 하고, 굽이치던 물살을 헤치며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가던 순간들과 깃발을 펄럭이며 오는 만선을 기다리던 바다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순항을 빌던 가족들과 무심한 눈빛을 나누던 익숙한 교감. 이별은 제가끔 감수해야 할 몫으로 남긴 채 삼켜버렸을 말 한 마디, 깊은 시름은 어두운 밤을 지새우고 샛별처럼 조용히 빛났으리라.
모두 떠난 뒤에 남은 숭숭한 마음들은 어디로 깃들었을까.
낙조는 뜨거운 사념을 바다 속에 담그려는 얼굴을 하고 느리게 포구의 언덕을 내려간다. 차츰 하늘엔 불덩이 같은 해가 곧 바다로 잠겨들 것만 같다.
예정된 극한 소멸. 풍그렁, 체리처럼 몸을 담그는 순간 바다는 커다란 셰이커가 된다. 바람이 믹스되는 순간 파도는 바텐더가 되어 영혼의 춤을 춘다.‘물은 자연의 동력’이라 했던가. 열정의 시간들이 섞이어 또 하나의 시간이 내장된다. 단소(丹霄) 아래로 불과 물의 시간이 흐른다. 뜨겁게 분출하던 석양이 바다에 수몰된 양 보이지만, 기실 냉각의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농홍한 빛의 아우라만 남긴 채, 석양이 마술사의 매직글라스처럼 낯빛을 바꾸는 사이, 숨 가빴던 모양을 지켜보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포구의 한 프레임 속에 들어온 마임의 눈빛을 주고받던 연인들도 하나 둘 자리를 옮겨간다. 텅 빈 객석처럼 드러나는 파라솔 밑으로 시간의 그림자가 서서히 점령해온다.
바닥이 드러난 개펄 위로 물이 기어가듯이 폐선 아래로 흐른다. 가끔 출렁이던 잔물결이 굵은 밧줄에 묶여 있는 폐선을 슬쩍 건드리고는 달아난다. 오랜 날을 바람에 흔들려 이골이 난 얼굴을 하고 있는 배. 흘러간 세월처럼 낡은 밧줄은 아무렇게나 엉클어져 있다.
서로의 발목을 얽고 있는 매듭이 영원히 풀 수 없는 것처럼 난감해 보인다. 바람이 일렁인다. 폐선에는 아직 이름표를 지우지 못한 녹슨 푯말이 한 줄 이력처럼 남아있다.
이제 갈 수 없는 먼 나라의 국경처럼 아득할 지라도 폐선은 지난 날을 꿈처럼 간직하리라. 오랜 기간을 사유하는 존재로 사뭇 깊어진 이론가의 표정처럼 진지하기만 하다.
무위의 시간 속에 한 독일 병정의 녹슨 철모처럼 누운 폐선에 어느 철학자의 코기토(Cogito ergo sum)가 방백으로 깃든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한낮의 뜨거운 여휘(餘暉)로 머물던 시간의 기억도, 차가운 은빛 날 비린내 나던 시간의 냄새도 한 순간의 존재처럼 머물 것이다.
낙조와 폐선도 끝이 아닌 삶이 지나는 길의 한 과정이며, 또 다른 날의 주연에게 자리를 내주고 빛나는 조연으로 남는 것. 내일이란 드라마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소품, 미장센으로 남을지라도 지금 그 순간, 존재의 근원으로 남는 것.
잿빛 얼굴을 드리운 하늘과 바다의 침묵에 낮게 가라앉는 모래알들이 조가비 안으로 숨어든다. 시간의 주름살처럼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선이 어둠의 경계를 긋는다.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던 오늘이 내일이면 또 어제로 기록될 것이다. 무시무종(無始無終), 그 시간들이 또 다른 내일에게 임무를 교대하는 것처럼.
실 연기처럼 사위어가는 생의 여백처럼 남은 시간, 나의 자리도 구도를 잡는다. 낙조와 폐선이 있는 사이, 낮과 밤이 교차하는 사이, 그 저녁의 시간에 앉아 새로운 시간의 존재로 또 다른 빛으로 삶의 명암과 채도를 채워 간다.
밤이 깊어 가고, 서쪽하늘에 개밥바라기별이 침묵의 시간을 딛고 제 빛 발하듯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낼 때면 포구도 하나의 정물이 된다.
최영애 /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