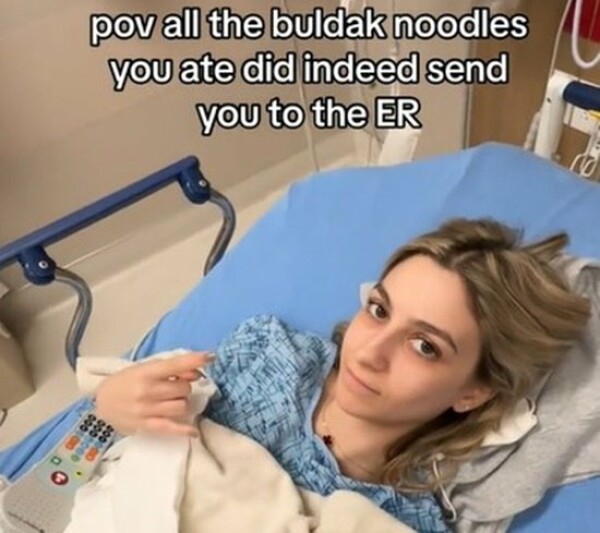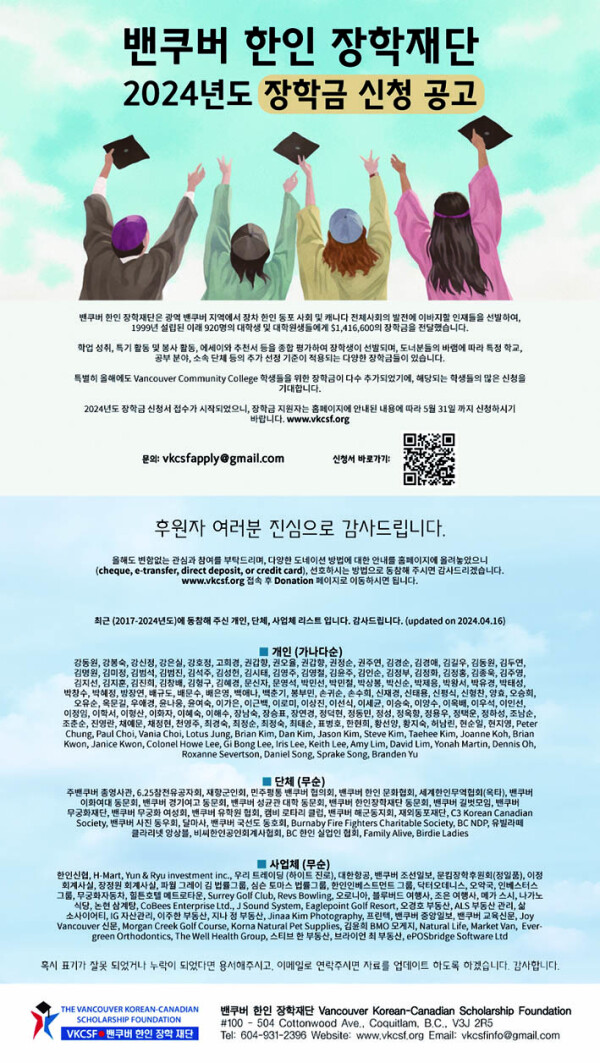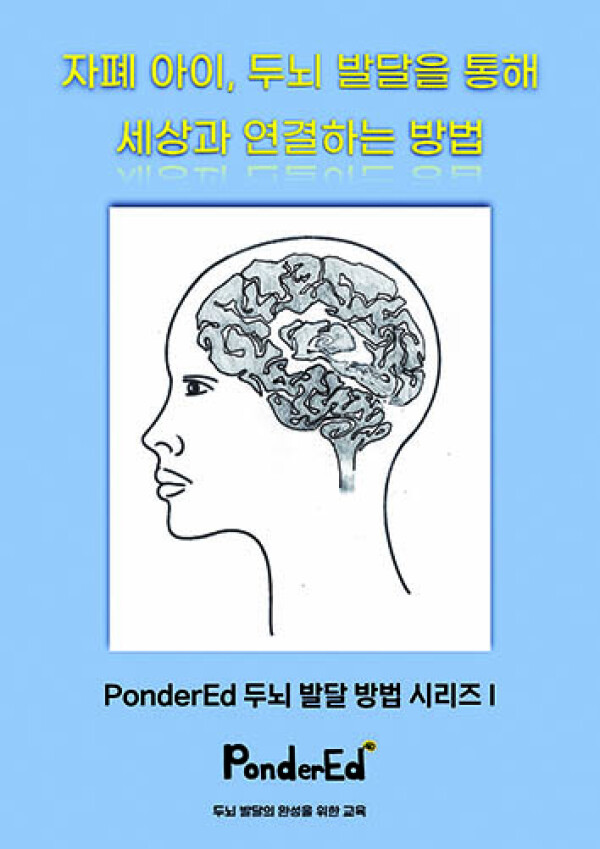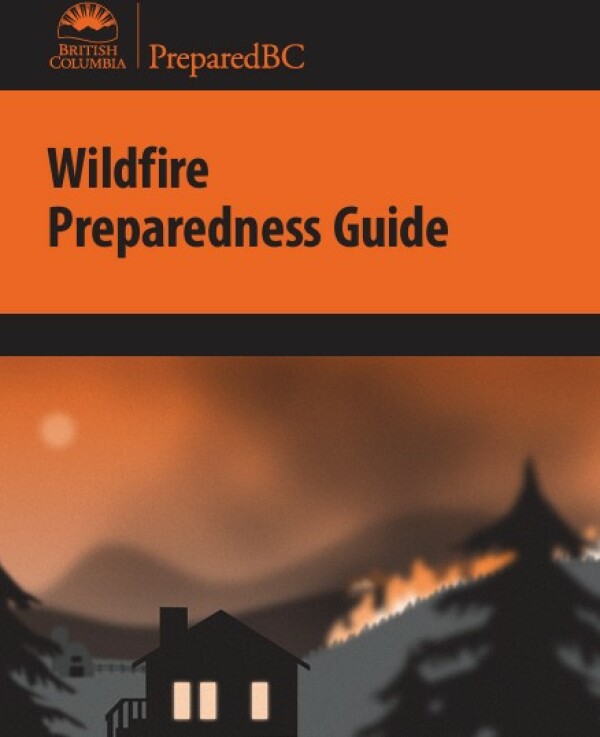문학 | [문예정원] 냉잇국 戀歌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25 11:24 조회40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고향 추억에 깃든 아련한 어머님 향기, 내 몸 깊숙한 곳에 남아 있어
지난 3월 초에 미국 LA에 갔을 때였다. 딸들을 따라서 우리 부부는 코리안 타운에 있는 한인 마트에 들렸다.
진열된 물건들의 양과 종류가 갈 적마다 엄청나게 늘어난다. 조국의 발전상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듯해서 여간 흐뭇한 게 아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세가 붙은 물건들은 물론 새롭게 고안되고 개발한 상품들이 고객의 눈길을 현란케 했다. 역시 상품은 그 나라의 발전 척도를 가늠케 한다는 말이 실감 났다.
진열된 물건에 현혹되어 상품 진열대를 기웃거리다가 채소 판매대로 간 나는 갑자기 “야- 여기 냉이가 있구나!”라고 환성을 질렀다. 분명히 겨자과 2년생 초인 냉이었다. 바퀴 모양으로 퍼진 잎줄기에다 거친 톱니 같은 잎에는 털이 많이 나 있는 것으로 보아 냉이가 틀림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봄나물의 여왕 냉이’라고 크게 써 붙인 상품명이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었다.
나는 큰 봉지에다 정신 없이 냉이를 집어 담았다. 벌써 혀끝에 냉잇국 내음이 묻어나는 착각에 빠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뒤늦게 내 거동을 본 아내는 냉차게 제동을 걸었다.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냉이라 야생냉이와는 다르다고 한다. 그 독특한 향내를 기대할 수 없을 터이니 돈 내버리고 실망할 게 뭐 있느냐는 것이다.
“수년 만에 냉잇국을 먹는다는 게 중요하지 않소. 사람은 기분에 살고 죽는 동물인데 야생이든, 하우스에서 자랐든 가려 뭘 하겠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한 번 먹어봅시다.” 이런 너스레가 결국 먹혀 들어갔다. 냉동 포장 냉이도 사다 먹은 터에 파란 물이 떨어지듯 싱싱한 걸 보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함을 아내라고 모를 리 없다.
내가 사는 캐나다 북서부 내륙은 한랭하고 건조해서 냉이가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런데다가 한국 나들이를 할 적마다 이상하게도 냉잇국 철을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제대로 생긴 냉잇국을 먹어본 기억이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냉이를 사기로 양해한 아내는 재빠르게 냉잇국 끓이는 데 필요한 물건들도 챙겼다.
생 콩가루와 모시조개 등 한인 마트는 무슨 음식을 만들든 필요한 물건들을 대령해 놓고 있었다. 외국에서 한국 재래 장을 제대로 볼 수 있다니 참 살기 좋은 세상임을 새삼 실감케 했다.
몸이 흔들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떴다. 어린 외손녀가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깜박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바로 이때였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심상치 않았다.
번뜩 스치는 게 있었다. 냉이를 끓이는 토장 냄새가 분명했다. 늙으면 후각이 발달한다더니 그런 실력이 발휘된 듯했다. 나는 외손녀의 손을 잡고 빠른 동작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식탁에는 이미 저녁상이 다 차려져 있었다.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냉잇국을 먹게 되었다는 즐거움이 입맛을 다시게 했다. 식탁에 앉자 이내 냉잇국 사발이 다가왔다. 특별히 그릇이 큰 것으로 보아 아내가 나에게 소원성취의 선심을 잔뜩 쓴 것 같은데 표정은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다문 입술이 코를 잔뜩 축여 올린 모색이 어딘가 비아냥 거리는 느낌이 들게 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냉잇국을 숟갈 가득 입안으로 흘려 넣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멈칫했다가 아직도 서서 나를 내려다보는 아내를 일별하고는 과장되게 목청을 높였다.
“어허, 시원하다. 냉잇국이 이렇게 시원한 줄을 미처 몰랐구먼.” 그제야 아내도 마지못한 얼굴을 하고 식탁에 앉아 냉잇국을 끼적거린다. 사실은 아니었다. 간절히 고대했던 그런 냉잇국이 아니었다. 오히려 배춧국만도 못했다. 역시 하우스 냉이는 경중미인(鏡中美人)이었다.
겉모양만 멀쩡하지 냉이의 특유한 맛이나 향내는 조금도 간직하지 못했다. 야생 냉이와는 완연히 다르다고 일깨웠던 아내를 보기가 민망해서 우정 시원하다, 맛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입안은 반란을 일으킨 지 이미 오래였다.
늙으면 추억할 일만 남는다든가? 냉잇국 맛은 아련해졌어도 영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그리움이 더해 가는 것이다. 구수하고 시원하면서도 향긋함이 스며든 감칠맛은 기본이고 총체적으로 시골냄새가 물씬 묻어나 혀와 코를 자극하는 데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만다. 흙벽 냄새라고나 할까, 흙벽에 매달린 메주 뜨는 냄새 같기도 하고 얼핏 송진 냄새가 섞인 듯도 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른 봄 날씨에 부는 바람과 엄동을 견디느라 땅 깊숙이 박혔던 냉이 뿌리의 흙내가 묘하게 찰떡궁합을 이루어서 그 특유의 맛과 내음을 내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땅의 정기를 물질화한 것이 바로 내이라고 말하겠는가.
나는 여러 형제에다가 어머니의 젖이 시원치 않아서 젖배를 곯은 편이다. 우유나 분유가 흔치 않을 때라 암죽을 많이 먹고 자랐다. 그래서 물이나 국물을 별반 마시지 않는 편이라 수분 섭취가 부실하다. 물론 물이나 국에 밥을 말아먹지도 않는다.
밥상에 국이 오르면 숟갈이 아니라 젓가락으로 국을 서너 번 휘휘 젓다가 국그릇 채 입에 대고 차 마시듯 서너 모금 넘기는 게 고작이다. 그러나 냉잇국만은 예외였다. 냉잇국이 밥상에 오르면 밥은 절반도 먹지 않았는데도 한 그릇 뚝딱 해치운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냉잇국을 자주 끓이셨다.
시골 초등학교 때의 일이 생각난다.
내가 냉잇국하고 아침을 먹고 등교했을 때는 별반 느끼지 못하지만, 냉잇국을 먹지 않았을 때는 냉잇국을 먹고 온 아이들을 용케 찾아낼 수 있다. 서로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냉잇국 냄새가 민감하게 코끝에 매달린다. “너 냉잇국 먹었구나? 맛있었지?” 묻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빙긋이 웃음을 흘린다.
전철이나 버스 안은 물론 어디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치즈 냄새에 시달리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엉뚱하게 냉잇국 냄새가 간절해진다. 고국산천을 떠나 캐나다에 살면서 냉잇국의 맛을 잊지 못해 연정(戀情)을 품는 것은 고향이 그립다는 표현의 일단이다.
언제나 삼삼한 고향 내음에다 어머니에게서만 나는 냄새까지 곱빼기로 뭉뚱그려져 풍기는 바로 그 못 잊을 냄새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 같다.
灘川 이종학 / 캐나다 한국문협 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