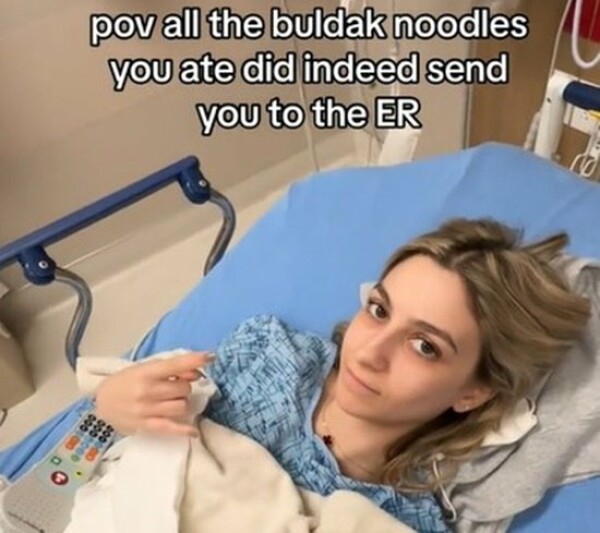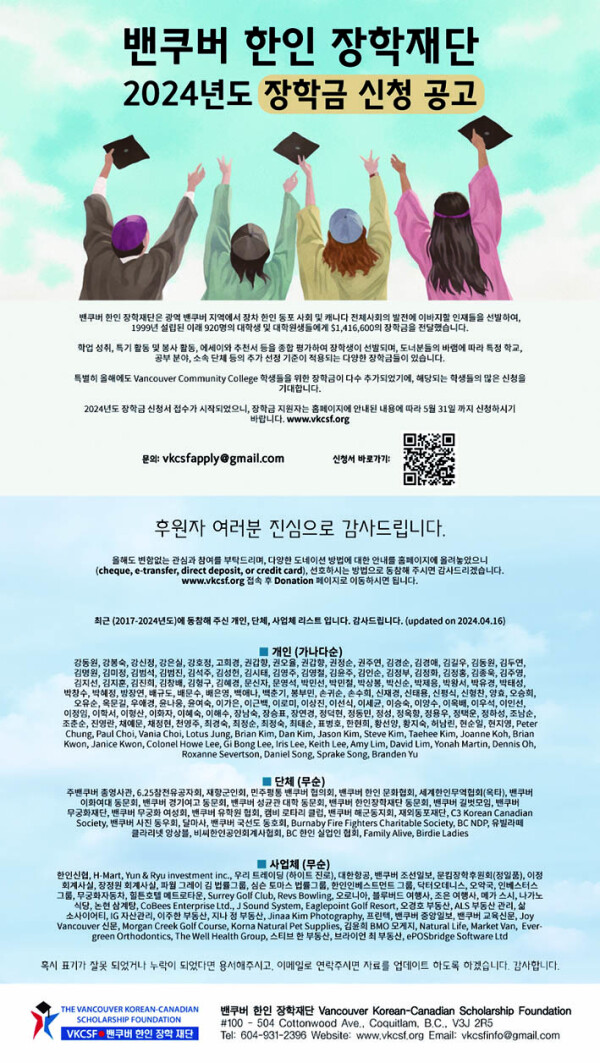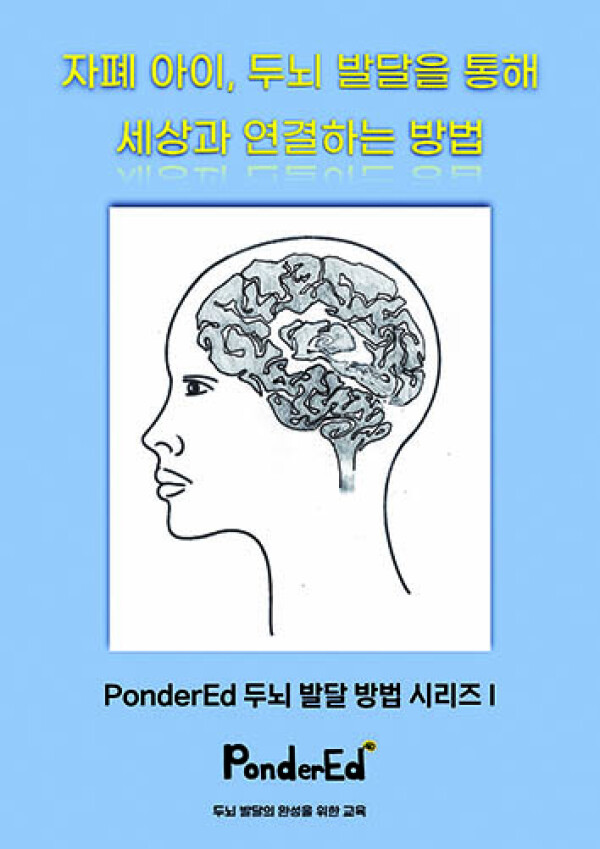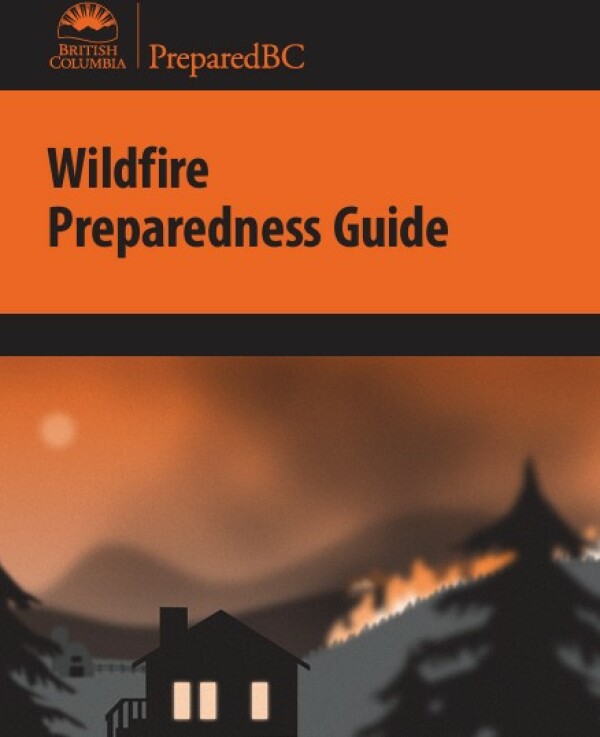문학 | [문예정원] 사계절(四季節) 여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anonymo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03 10:07 조회43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나는 울안 끝자락 담장 가까이 서 있는 오렌지 나무에 다가가서 오렌지를 따려고 목을 잔뜩 쳐들었다. 순간 마침 불어오는 바람결에 풍기는 꽃 향기에 동작을 멈추고 말았다. 웬 연꽃 향기?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내음, 분명 연꽃에서 나는 향기였다. 주택가 한복판에 연꽃이 피어나다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담장 너머 옆집을 넘겨다봤다. 아하~ 목련화였다. 우아하면서도 순결한 자 목련화가 가지마다 풍성한 하얀 속살을 드러낸 모습을 한껏 자랑하고 있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고혹 속으로 빠져드는 유혹을 지닌 독특한 자태다. 하긴 길가의 라일락들이 순백의 꽃을 피워 놓고 살랑살랑 손짓하는 꽃 잔치를 보았으니 봄의 여왕 목련화가 잠잠할 리 없다. 이미 이곳의 봄은 이렇게 무르익고 있었다.
2월 초순, 지금 우리 부부는 미국 LA 딸이 사는 집에 다니러 와 있다. 매일 한 40분 산책하고 소위 맥 다방(맥도널)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오렌지 서너 개를 따서 목을 축이는 게 습관처럼 되어 버렸다. 꽤 큰 오렌지 나무에는 올해에도 수를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은 오렌지가 다달다달 열렸다. 다른 집들은 관상용으로 그대로 놔두고 본다지만, 나무에 매달린 오렌지 맛을 한 번 본 뒤로는 입이 궁금해서 눈요기로 멍청히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곳의 가정에 심어 놓은 오렌지 나무는 변종인 레이블이라고 한다. 두 손으로 감싸도 남을 만큼 크고 새콤달콤한 신선한 육즙이 어찌나 많은지 서너 쪽만 먹어도 해갈이 될 정도다. 오렌지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에서 살았고 푸릇한 것을 수확해 후숙한 오렌지밖에 먹어보지 못한 나로서는 나무에서 직접 따서 먹는 맛과 기분이란 상상을 초월한다.
나는 오늘도 예외 없이 산책하고 와서 오렌지를 따려고 했다. 쉽게 손에 닿는 가지에 매달렸던 열매는 이미 동이 나버린 터라 이제는 고개를 잔뜩 쳐들고 한 손을 있는 대로 뻗어야 한다. 그러다가 목련 꽃의 향기와 자태에 이끌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나는 묘한 처지에 놓인 실루엣이 되고 말았다. 손은 가을 열매를 탐닉하고 눈은 봄의 꽃과 향기에 매료되었으니 이런 행운이 어디 또 있겠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나는 반바지에 남방셔츠를 입고 있다. 섭씨 2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를 겪는 옷차림이다. 가을과 봄과 여름의 세 계절을 한꺼번에 마음껏 석권하는 홍복을 누리고 있다. 문득 계절 감각이 혼란스러워지는 동화적인 감성에 휘둘리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애써 소망했거나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제 며칠 뒤에 우리가 사는 캐나다 북서부 북극권에 속한 에드몬톤으로 돌아가면 섭씨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한겨울 눈 속에서 살아야 한다. 결국 춘하추동을 거의 동시에 사는, 사계절을 주름잡는다고나 할까. 최고의 축지법으로 단번에 1년을 섭렵하고 지나가는 흐뭇한 느낌이다.
어제는 타임머신을 타고 70년 대 젊은이들의 해방구였던 추억의 쎄시봉 음악감상실에 다녀왔다. 비록 한 편의 영화(감독 김현석)였지만, 젊은이들의 문화가 꽃피던 시절의 노래와 감격에 흠뻑 젖을 수 있었다. 통기타 1세대의 노래가 아직도 잊히지 않고 아주 조금씩 기어 나온다. 사이키 조명 아래서 맥주를 마시며 듣던 샹송과 칸소네, 그리고 포크 송들, 젊은 가슴을 열광케 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다. 송창식의 ‘우리는’이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우리는/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우리는 우리는/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우리는 우리는 연인…….” 그 밖에도 ‘하얀 손수건’, ‘키보이스’, ‘트리퍼스’ 등 쎄시봉 3인방을 비롯한 당시 통기타 가수들이 부르던 노래는 얼마든지 있다. 비록 스크린 속이지만, 젊은이들의 영혼을 흔들며 열광케 했던 수많은 빅히트 송이 감미롭고 애잔하게 마음 밭을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 부부도 은연중에 통기타의 선율에 실려 추억의 열차를 타고 흐느적거렸다.
오늘 아침에도 예외 없이 서너 개의 오렌지를 땄다. 옆집의 흐드러지게 핀 목련화가 잘 바라보이는 장소를 골라 의자를 갖다 놓고 우리 부부는 앉았다. 그리고 눈과 코는 목련화에 두고 감칠맛 나는 오렌지를 먹으면서 쎄시봉 음악감상실의 그때 그 노래를 조용히 흥얼거린다. 아직도 영화선상의 감회가 진행 중인 셈이다. 우리는 계절을 마음대로 아우르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50년을 안마당처럼 넘나드는 행운의 방석에 편한 자세로 앉아 있다. 이게 어디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즐거움이겠는가. 마음속 무구한 행복이 세상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로 팍팍하게 느껴지는 삶을 봄눈처럼 녹여 준다. 갑자기 안분 지족(安分知足)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고 만족을 안다는 말이다. 자기 분수에 맞게 무리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편안히 지낸다는 뜻이다.
나는 아내에게 넌지시 묻는다. “우리 내일 뭐 할 일이 있소?” 아내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만히 흔든다. 방해 받고 싶지 않다는 눈치가 빤히 보인다.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어디디선가 콩알만 한 벌새 두 마리가 날아와 마당 풀장의 물을 스치며 아주 앙증맞은 물살을 만들고는 사라진다.
灘川 이종학 / 캐나다 한국문협 고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9-28 17:12:20 LIFE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